요즘은 여러가지로 싱숭생숭하고 마음도 많이 상했고 덕분에 몸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피부는 누렇게 뜨고 눈에서는 총기가 사라지고... 뭐 이런 좋지 않은 시기가 비연에게 도래했음을 궁시렁궁시렁. 회사 생활 하면서 (도대체 몇 년이나 회사 생활을 한 거냐... 쩝) 여러 회사를 다녀보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기분나쁘고 허무하고 그런 상황으로 애써 '즐겁게 버티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지만, 나아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역시나 회사에 정이 떨어지는 건, 사람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번 (개떡같은) 프로젝트 추진에 이어서 줄줄이 사탕 꾸러미 소세지로 나온 결과물은, 배신과 상실의 시대. (뭔가 멋져보이는 제목이지만 실상은 참담)
덕분에 모든 약속을 자제하고 지난 주 집에서 칩거를 했는데 - 아 회사는 다녔다 - 그래서 주말엔 드러누워 책 보기에 전념. 근데 근질근질... 함을 못이겨 오늘은 나와서 다음주까지 쫘악.. 약속을 잡아버렸다. 주말에도 전부. 미쳤나봐. 정신적 육체적 피로로 허덕거리면서도 이 짓이다. 으이그.
암튼 주말엔 책을 읽었다. 토요일은 좀 바빴고.. 일요일 온종일... 읽으려고 했는데 동생네가 와서 잠시 놀다가 논 김에 좀 자고... 우쩄든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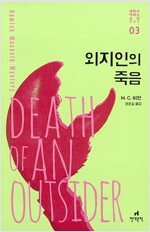
비턴의 "~죽음" 시리즈 번역되어 나온 건 다 읽었다. 세 권. 올해 내로 세 권 더 나온다니 기대가 크다. 갈수록 이야기가 쫀득쫀득 해지고 캐릭터들의 성격이 또렷해지고 있다. 주인공인 맥베스 순경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캐릭터로서 (ㅎㅎ) 그럼에도 왠지 모를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예리한 면이 남다르고 사소한 것에서 이야기의 맥락을 짚어가며, 사람들과의 관계에 능수능란하지만, 의외로 텅빈 구석도 있고 유혹에도 약한 구석이 있는... (이번 3권에서 결국 유혹에 굴복...) 물론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한 속물적 행위들도 그냥 그대로 하고 있고 말이다. <외지인의 죽음>은 좀 끔찍한 설정이기는 해서, 바닷가재들이 시체를 먹어치웠다... 그러니 그 바닷가재를 먹은 자들은 일종의 식인종... 이라는 연상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한동안 가재요리는 먹지 못할 느낌이다. (물론 비싸서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건 해결이 좀 급작스러운 면만 제외하면 시노선이라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의 멕베스 순경의 (일탈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나머지 세 권도 얼른 나와랏. 이돌람바~

난 이걸 읽기 전까지는 이 책이 이런 내용일 줄 몰랐다. 그냥 시바타 신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책이겠거니, 책에 대한 사랑과 서점을 운영하는 자의 재미와 근심 등이 담겨 있겠거니 했었다.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 이 책은 '서점경영'에 대한 이야기였고 시바타 신 만의 독특한(!) 방법에 대한 구술이었던 것 같다. 서점을 경영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단지 책을 좋아하고 그 책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한다는 낭만적인 감상만으로는 안 되며,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책임져야 하고 수익도 내야 하며 반품 등을 통해 서점의 매출도 보전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바타 신이라는 사람은 독보적인 존재이며, 진보초 지역 더 나아가 일본 전역의 서점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구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밑줄 쫙쫙 친 것들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다. 이제까지 서점경영에 대해 가졌던 약간의 분홍빛 꿈 따위는 스윽 밀어버리는 내용이라...
책만 봤다고 했는데, 2권 정도 봤다니. <팅커스>도 거의 다 읽어 가긴 하는데, 이게 영 진도가 안 나간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나 할까. 그래도 내용이 나쁘지 않아서 끝까지 읽어야 해 라고 고집부리며 쥐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사람이 싫어지면 두 가지가 싫어진다고 한다. 밥먹는 모습이 싫어지고, 더 지나치면 목소리가 듣기 싫어진다고. 내가 회사에서 정말 싫어하는 자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뭔가 못 견디겠다는 느낌이 스물스물하여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어버린다.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