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의 여름이다. 햇빛에 눈이 부시고 두 겹 껴입은 옷이 부담스러운 날이다. 세상에. 봄이 사라졌다. 날 좋다고 기분 좋아 나왔지만 땀까지 삐질삐질 나니 (옷이 두꺼웠던 것일지도) 왠지 봄이 없어졌다는 게 서글퍼진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사계절이라고 배웠는데, 얼마 안 지나 아열대라고, 계절은 두 개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날이 멀지 않은 듯 싶다. 올해는 이렇게 봄 없이 찌기 시작하는 걸 보면 여름이 꽤나 곤혹스럽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마저 생긴다.
그러나 난 회사다. 배도 고프고 창문 밖 환한 햇살 보며 일하는 것도 힘들다. 자료도 슬슬 마무리 다 하긴 했는데 이게 내일 임원 보고 때 먹힐 지는 고민이다. 하다보니 내가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 그걸 메이크업해야지 추진하던 과제가 될텐데... 내일 이게 설득이 안되면 과제가 축소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덕분에 매일 꿈에서 회의다. 되니 안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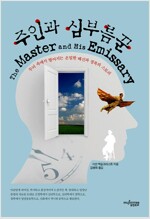
어제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다. 무려 7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선택한 나는 도대체 4월 내내 이걸 읽겠다는 뜻일까. 하지만, 꽤나 흥미가 생기는 주제라서 사두고 그냥 묵혀두기엔 아까왔다. 좌뇌와 우뇌의 이야기. 영원한 두 반구의 이야기. 이제 시작이라 뭐라 말하긴 힘들지만.
역사책을 읽어야지 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건 정말 두렵다. 도대체 이렇게 일이 많은 와중에 집중해서 역사라는 걸 읽고 이해할 여력이 될까 라는 사전적인 불안감이다. 덕분에 집에는 의무감 혹은 흥미감으로 사둔 역사책들이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고 있다. 저걸 언제 읽나 라는 생각만 하면 한숨이 폭폭 난다.
책을 의무로 읽기는 싫지만 말이다.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해지고 그래서 책을 오래 볼 수 없는 날이 올까봐 괜히 초조해지는 것 같다. 지금 다 봐둬야 하는데 라는 괜한 성마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쓰잘데기없는 걱정으로 현재를 그르치기도 하는 사람. 그냥 뭐든 좀 편하게 하면 안되겠냐, 비연.
2.
어젠 피나 바우쉬의 'Full Moon' 이라는 무용극을 LG 아트센터에서 보았다. 오. 피나 바우쉬에 대한 흥미가 급격 높아졌다. 별 기대없이, 무용이니 졸지 않을까 하며 갔으나 보는 내내 몰입했다. 그냥 사는 이야기를 몸으로 묘사하는 건데, 왜 그렇게 가슴이 저릿저릿해지는 건지. 이런 걸 예술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냥 저냥 표현하는 것 같지만, 담고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라.



일단, 피나 바우쉬라는 사람에 대한 책을 읽고 싶다. 그녀에 대한 영화도 보고 싶고 그 OST도 듣고 싶다. 이런 대단한 무용극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런 감흥을... 이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뛴다. 관습과 통념을 뛰어넘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녀는 하나의 세상을 창조해낸거다. 담배와 커피와 와인으로 묘사되는 그녀. 암선고를 받고 5일만에 사망한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 한동안 피나에 대한 관심을 놓지 못할 것 같다.
3.
야구가 시작되었다. 고로 나의 2014년이 이제 시작되었다. 비록 두산이 이종욱을 내보내고 손시헌을 내보내고 (그닥 좋아하진 않았지만 준우승의 주역인) 김진욱 감독을 내보내고 최준석을 내보내고 등등등 해서 20대 ~ 30대 초반의 사람들로 포진한, 마치 신생팀과 같은 구성에 알지 못했던 재일교포 60대 2군감독에게 감독을 맡겨서 실망에 실망이지만, 그래도 나는 두산팬. 응원한다.
올해는 내가 좋아하는 김동주가 제발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고, 제발 부상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발 선수생활을 깔끔하고 무리없이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산의 젊은 기운으로 화이팅하는 경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어제는 엘쥐에게 5:4로 이겼고 지금은 4:1로 지고 있다. 어쨌든 매일매일 (올해는 월요일도 경기를 해준다니..ㅎㅎ) 야구 덕에 즐거울 수 있겠다. 구장에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제 오늘은 손도 대보기전에 매진이 되어버렸다. 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