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가고 싶어 미치겠으니까 앞에 3,000원은 안 보이고 '세계여행'만 보인다. 나야 '초보' 여행자는 아니니까 이런 책이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주문 주문... 근데 이걸 보니 하루 3,000원씩 커피값을 아끼면 일년 백만원이 되고 이걸로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 이건 맞다 싶다.
내가 (어울리지 않게) 가계부란 걸 쓰는데 커피를 하도 사먹어서 몇 년 전부터 일년에 쓰는 커피값을 계산해보고 있다. 근데 정말 100만원 쓴다는.. 더 쓸 때도 있다. 스벅 커피 한잔을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좀 비싼 걸로 가끔씩이라도 먹으면 한달 10만원은 눈깜짝할 새라는 거. 나는 이거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커피값으로 쓰는 돈 만큼 어디다 기부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더랬는데.. 흠... 그걸 결심한 자가 비연인가 삐연인가... ㅜㅜ;;;; 올해는 꼭 해봐야겠다..;;;
여행가고 싶다고 주문을 외우니까 신간도 그만큼 나오는 건가.. 가 아니라 눈에 많이 띄는 건가.


규슈는 조만간 갈 일이 있을 것 같다. 방사능이 어쩌고 해서 자중하고 있었는데.. 내 나이에 노출된다고 해도 얼마나 영향이 있겠는가 라는 (자포자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일단 가볼까 싶다.
고비사막은 멀어 보이네. 짜투리 시간밖엔 여행에 활용하지 못하는 내 인생이 좀 화가 나는 점심시간이다. 도대체 한달씩 팍팍 휴가를 쓰게 하면 덧날까? ... 아마 회사는 덧난다고 생각할 지도. (철푸덕)


이런 책을 신간이라고 고를 때마다 생각한다. 얼마나 인생에서 '더' 잘 지내고 싶으면 맨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 가엾은 비연.
사람이 뜻대로 살아지지 않고 그렇게 나이를 차곡차곡 먹다보면 어느 새 지나온 세월이 다가올 세월보다 길어지고 그런 즈음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깝게 느껴지고 꿈보다는 포기가 더 친근해진다. 그런 걸 (억지로) 떨쳐버리고자 이런 책들을 (억지로) 머리에 쑤셔넣으며 나를 지키고자 한다. 참으로 불쌍한 일이 아닌가 싶다. 인생이란 뭔지. 사람들은 왜 이런 책들 자꾸 읽는 건지.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어느 새 나의 것이 아닌 그 순간에도 이런 걸 읽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저 정신 수양인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노벨 문학상 작가인 앨리스 먼로의 단편집. 노벨 문학상이라든가 신춘문예라든가 등등등의 감투를 뒤집어 쓴 (노벨 문학상과 신춘 문예를 병렬로 놓는 건 좀 그런가...) 책들을 구태여 들여다보지 않게 된 지도 꽤 된 것 같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흥미가 떨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어떤 글을 제 3자가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평가해서 상을 준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가 의아스럽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글만큼은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찾아서 읽고 싶다. 상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마음에 호소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걸 신간으로 고른 이유는 문득, 아주 문득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요즘 노벨 문학상이란 걸 타는 작품들은 어떻지? 라는 괜한 호기심? 단편이라니까 가볍게(과연?) 읽어볼까 생각 중이다.

"미시시피의 샤봇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흑인과 백인 두 친구의 짧은 우정과 20여 년의 세월을 두고 발생한 두 건의 실종 사건을 통해 미국의 어두운 정서를 드러낸 걸출한 작품" 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2010년 작품이라 한다.
꽤 괜챦은 작품인 것 같아서 이건 바로 구입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스릴러물이라고는 하지만 성장소설의 분위기를 풍긴다 하니... 사실 요즘 범죄소설과 일반 교양소설과의 경계가 많이 흐릿해져서 말이다... 그나저나 피아졸라의 음악들을 들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참 좋네..우히히. 뜬금없는 멘트다.



에릭 호퍼의 책들이 세 권 연달아 나왔다. 오. 좋아하는 사람의 책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올 때, 정말 반갑고 좋지만 두렵다. 다 사겠구나.. 라는. 넘쳐나는 책장을 바라보며 한숨 한번 푹. 근간에 책들 정리해서 중고로 팔아치워야겠구나... 라는 결심 아닌 결심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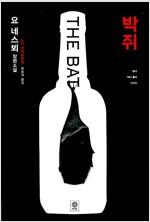
점심 시간 지나가기 전에 한 판 자야겠기에 황급히 마무리하려던 차. 요 책들은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싶어서 찾아 올린다. 요 네스뵈의 따끈따끈한 신간 번역물들. 아 북유럽 아저씨의 멋들어진 이야기를 두 권이나 한번에 만날 수 있다니. 기뻐서 발가락 세워 춤을 추고 싶을 지경이다.
물론 난 이 책들을 이미 '예약주문' 했고 이번 주에 온다고 해서 손꼽아 발꼽아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그 특유의 두꺼움으로 자다가 베개 역할까지 겸하게 하는 이 요 네스뵈의 책들을 이번 주말에 부둥켜 안고 지내봐야지... 약속을 하나만 했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뻔 했지 뭔가.
나는 <네메시스>라고 하면 예전에 아가사 크리스티의 어느 책이 생각나곤 한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충분히 연상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섬찟한 내용에 전율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어서 말이다.
<박쥐>는 우리의 해리 홀레가 처음으로 등장한 책이라고 한다. 오호호. "노르웨이 여인의 살인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해리. 저항의 흔적도, 범행패턴도, 범인의 인상착의를 아는 자도 없는 묘한 사건에 맞닥뜨린다. 올림픽을 앞둔 시점이라 모두가 쉬쉬하며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가운데 해리만이 사건의 심연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같은 방법의 연쇄살인이 이어진다. 함께 수사하던 동료경찰마저 죽음을 맞고 미끼가 되기를 자청한 해리의 연인은 실종되는데…..." 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 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