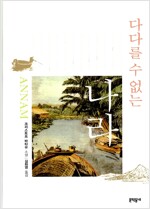
얇고 문장도 많지 않고.. 그래서 오며가며 다 읽어버린 이 책. 근데 왜 이리 마음에 잔상이 남는 것인지. 역자인 김화영 교수와 평론가인 신형철이 극찬한 책. 카뮈의 <이방인>에 비긴다는. 21살의 남자가 쓴 처녀작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책.... 하나 그른 말이 없었다.
어느 문장을 딱 뜯어다가 좋았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냥 그 흐름에 맡겨 주욱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속에 침잠되어 있는 나를 발견한다. 신과, 나라와, 종교와.. 그 모든 것들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결국 나라는 인간의 본연을 명징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 흐름. 어쩌면 신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쩌면 그렇지 않은. 무엇을 부정하고 긍정하고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아무 가림막없이 생각하게 하는 흐름. 망각 속에서 해방되는 인간의 마음.
수사들의 얼굴은 서서히 초췌해져갔다. 도미니크 수사의 뚱뚱하던 배가 들어갔고 수염에 이가 끓어서 면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카트린 수녀는 아름다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그녀의 몸으로 갔다. 그 노인이 말했었다. "각각의 존재는 하느님의 집이지요."
멀리 떠나간 프랑스의 선교사들은 베트남에서 잊혀져갔다. 조국은 그들을 어느 틈엔가 잊었다. 그들이 보낸 편지도, 자료도 얼결에 불태워졌다. 그리고 잊고 싶어서 잊은 게 아니라 그냥 잊어야겠기에 잊혀졌다. 그 망각 속에서 그들은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은 스스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도미니크, 우리는 진정으로 바딘의 농사꾼들을 개종시킨 것일까요?"
"나도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카트린. 그들은 우리가 들에서 하는 일과 당신의 미소 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과연 하느님만을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대화체가 거의 없는 책 속에서 따옴표 안에 든 말은 이 말들 뿐. 신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 들에서 하는 일과 미소 안에 머무는 것인지. 신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은 고되고 절제된 생활을 했다. 저녁이면 한 자루 촛불의 불꽃 아래서 기도를 했다. 더는 진심이 깃들어 있지 않았다. 시편을 낭송하는 것도 습관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의 소망들은 베트남의 무기력 속에 지워졌다. 온갖 고난과 미셀 수사의 죽음이 그들에겐 마음의 짐이었다. 일체의 종교적 감정이 그들에겐 멀게만 느껴졌고 그들과 상관없는 일만 같았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이에게서 잊혀졌고 무용해졌다. 신이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었고 그저 지치고 외롭고 공허할 뿐이었다. '베트남에서의 그들의 존재 의미는 비극적 사건들과 여러 계절 속에서 갈피를 잃어버렸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그들의 마지막.
그들은 벌거벗은 채 서로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남자는 젊은 여자의 젖가슴 위에 손을 얹어놓고 있었다. 여자의 배는 땀과 정액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했던 것이다. 깊은 정적만이 깃들어 있었다.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망설였다. 육체를 서로 나누는 법이 없이 눈이 매섭고 말씨가 공격적인 남자들과 여자들을 찾아내게 될 줄로 기대했던 것이다. 성직자들의 태연하기만 한 모습과 창백함에 군인들은 감동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떠났다.
창백함이라는 말이 꽂힌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했다는 말도. 말이 필요없는 마지막이다...


크리스토퍼 바타유의 책이 두 권 더 번역되어 있었다. 모두 문학동네에서 출간되었다. <시간의 지배자>와 <지옥만세>는 <다다를 수 없는 나라>와 비슷할 것 같으나 그 이후(1999년) 글쓰기 방식이 새로와졌다고 한다. 그 이후 작품은 알 수가 없으나 어떻게 변모했는 지도 궁금하다... 21살의 나이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도 궁금하고.
오랜만에 읽으면서 내 내면에 깊이 들어가는 느낌을 가져보았다. 그것은 우울이나 심란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에 가까와지는 느낌이었다. 담백하고 짤막한 문장들로, 맑게 쓴 글이 '창백함'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숙연한 느낌이었는 지도 모르겠다. 많은 것을 벗어던지는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 강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