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읽은 두 책. (지난 번에 글 썼다가 날려먹은 두 책.. 이 더 적절한 표현이겠다 ㅜㅜ)

딘 쿤츠. 우리나라에도 몇 권 번역되어 나와 있긴 하지만 동시대의 유명한 이야기꾼인 스티븐 킹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좀 낮다고나 할까. 근데 미국사람들은 딘 쿤츠를 꽤 좋아한다고들 한다. 미국에 출장갔을 때 보면 페이퍼북으로 딘 쿤츠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목격한 적도 더러 있었고.







이 외에도 꽤 된다. 이 중에서 내가 읽은 건 <남편>과 <살인예언자> 정도. 간만에 딘 쿤츠의 소설이, 그것도 시리즈물 첫 권으로 나왔다고 해서 사본 게 <사일런트 코너>이다. 남편 닉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제인 호크라는 FBI 요원이 그 비밀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주인공의 캐릭터가 마음에 든다. 누가 봐도 반할 정도의 미모의 소유자이지만,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 매우 담담하고 냉정하고 공사 분별 뚜렷하고 판단력 좋은 멋진 여성으로 표현된다. 책의 말미가 다음을 기약하듯이 끝나서 다음 책도 나오면 봐야겠다 그정도 마음은 들게 하는 책이었다. 사실, 스티븐 킹의 소설같은 흡인력이 있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마 그래서 스티븐 킹의 소설은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딘 쿤츠의 소설은 뭐랄까. 약간 인공감미료가 안 들어간 자연주의 식단같은 느낌이랄까. 슴슴하고 밋밋하고 그렇긴 한데 볼수록 감칠 맛이 나는 글인 건 맞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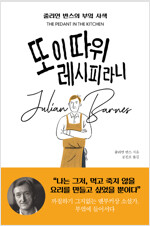
나는 줄리언 반스라는 소설가를 좋아하고, 그의 책이라면 덮어놓고 사서 보는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책도 샀다. 그리고 많은 위안을 받았다. 요리라는 거, 요리사라는 것, 요리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쾌한 말들을 많이 날려주는 데다가, 레시피 보고 허우적 거리는 나에게, 괜챦아 원래 그런 거야, 쓸 때부터 걔네도 확실히 몰랐던 거야, 라는 투로 위로를 하니 그럴 수 밖에.
부엌의 현학자는 새 레시피를 마주하면 간단한 음식이라도 불안감을 느낀다. 단어들은 '일단 정지' 도로 표지처럼 그를 향해 번득인다. 이 레시피는 설명이 애매한데, 그러면 적절한(아니 그보다는, 겁나는)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건가? 아니면 저자가 더 정확한 언어를 구사할 수 없어서 그런 건가? 간단한 단어부터 문제다. 한 '덩어리(lump)'는 얼마만큼이지? 한 '모금(slug)' 또는 한 '덩이(gout)'는 얼마만큼이지? 언제를 이슬비라고 하고 또 언제를 그냥 비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와 다를 게 없다. '컵(cup)'이라는 말은 편리한 대로 대충 쓸 수 있는 용어인가 아니면 정확한 미국식 계량 단위인가? 포도주 잔은 크기가 다양한데 왜 단순히 '포조두 한 잔'만큼이라고 하지? 잠시 잼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두 손을 합쳐 최대한 덜어낼 수 있을 만큼의 딸기를 넣으시오"라는 리처드 올니의 레시피는 어떤가? 정말들 이러긴가?고 올니 선생의 저작관리인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손이 얼마나 컸는지 물어보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어린이가 잼을 만들려면 어떡하란 거지? 서커스단의 거인은 어떻게 하지? - p41~42
내가 늘 속으로 (가끔은 밖으로) 울부짖는 말이다. 나에게 왜 이러시나요. 나만 못 알아먹는 건가. 도대체 한 스푼 넣으라고 하면 그게 밥숟가락인지, 차숟가락인지 망설이는 자는 나뿐이란 말인가, 좌절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 말씀이다. 이 외에도 줄리언 반스의 유머러스한 묘사들이 많이 등장해서, 읽는 내내 심심하지 않은 책이다. 물론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이 책에 무슨 레시피가 들어있다고 기대하진 않으리라 믿는다. 레시피에 대한 줄리언 반스 나름의 생각들이 주욱 나열된 에세이라는 거. 역시 글 잘쓰는 사람이 쓰는 에세이는, 대충 쓰는 것 같아도 재미있다는 거.
오늘부터 읽고 내일부터는 출퇴근 길에 읽으려고 고른 책은, 이거다.

벌써부터 읽겠다고 찜해놓고 이제야 책을 든다. 재미있으면 오늘 다 읽고 내일은 다른 책 들고 나가야지. 아. 커피 한잔에 즐거운 마음으로 고른 책을 들고 소파에 앉는 맛이란, 일요일 저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내일 출근할 걸 생각하면... 금새 싸..한 마음이지만, 일단 카르페 디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