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과서를 자꾸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선 학창시절에 보던 교과서와는 외연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내 나이 정도(97학번)의 세대가 교과서를 본다면 아마 '참고서'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문체'가 제법 세련되게 다듬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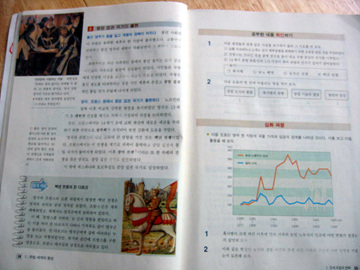
<요즘 교과서를 보면 예전의 참고서를 연상케 한다. 도표는 물론이고 사진과 그림에 세련된 문체까지 마치 시중에 파는 교양서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다>
가령 중학교 1학년 도덕의 경우 "폭넓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때,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교육인적자원부, 61쪽)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갈라 놓은 이성과 감정, 혹은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을 훌쩍 뛰어 넘는다.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당시의 모습들이 생동감 있는 필체로 묘사돼 있다.
"1347년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던 것이다.
흑사병에 걸렸다고 생각되면 가족들조차도 그 사람을 포기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덩이에 파묻혔다. ㆍㆍㆍ 유럽은 갑자기 '텅 비어 버리게' 되었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36쪽)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역시 '헌법'의 가치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입헌주의는 단순히 헌법이 제정되었다고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법에 따라 나라가 다스려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때 확립되는 것이다"(중앙교육진흥연구소, 14쪽)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교과서는 절대로 '빙산'을 보여주지 않고 '일각'만을 보여준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과학적 발견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문맥'이 있기 마련인데,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 토머스 쿤의 비판을 모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과학 교과서들(그리고 너무나 많은 구식 과학사(科學史)들)은, 명백하게 동시에 고도로 기능적이라는 이유로 해서, 교과서의 패러다임 문제들의 서술과 해결에 기여했다고 쉽사리 평가될 수 있는 과거 과학자들의 연구 중 그런 부분만을 인용한다. 더러는 선택에 의해, 더러는 왜곡에 의해 이전시대의 과학자들은, 과학 이론과 방법의 가장 최근의 혁명에 의해 과학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었던 바로 그 일련의 고정된 규범들에 부합되도록, 고정된 문제들의 한 벌에 대해 연구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암묵적으로 표현된다.
- 토머스 S. 쿤, 『과학혁명의 구조』
이쯤해서 한번 반문해본다. 교과서가 '정보의 종합'을 고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모든 정보를 수박 겉핥기로 알아야 한다면 '지적 번거충이'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정보의 종합'을 조금만 유연하게 받아들여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고질적인 양비론'이다. 교과서는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불문율이다. 불편부당한 서술방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양비론이 불편부당을 대변해주지는 않는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덕, 사회, 국사)를 살펴보면 '양비론'적 서술방식과 함께, '정보의 총집합'을 고수하려는 욕망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무의식적인 자기합리화와 적당주의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
"절대왕정이나 나치 정권 등과 같이 정치 권력이 부당하게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경우에,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지나친 저항권 행사는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중앙교육진흥연구소), 15쪽
얼핏 보면 이 대목은 상충하는 양쪽의 진영을 적절히 만족한 듯 보이지만, 전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장이다. 일단 극단적인 상황을 사례로 든 점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역부족이므로 유의미한 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저항을 한다면 저항을 하는 이유와 문맥이 있을 테지만, 위 서술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고 다만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무의미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주장은 대립하는 양쪽의 특징을 적당히 지적하고 있을 뿐 양쪽의 입장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양쪽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양쪽에 배치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서술 방식일 것이다.
위 문장은 교과서 어디를 펼치든 만나게 된다. 이러한 서술이 잠재적 사회인인 학생들에게 주는 악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매사에 무의식적으로 '적당주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병폐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 양비론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뇌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단체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식의 자기합리화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결코 가벼운 걱정이 아닌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특히 '뇌물'에 약하며, 불필요한 관습을 '법률'과도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양비론'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이제 교과서도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성찰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