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좋은 책들이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강렬한 기억을 남긴 책 몇 권만 추려 본다.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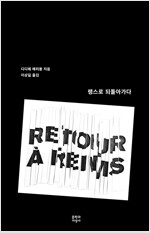
사적인 글이 범람하는 시대다. 구태여 책을 읽지 않아도 SNS 검색만으로 충분히 독서를 했다는 환각을 줄 정도다. 그러나 내 개인적 경험이 독자에게 가 닿아 의미를 가지려면 다른 차원의 심화와 확장이 필요하다. 내 욕망, 내 회한, 내 해석, 내 주장이 부수어야 하는 경계가 있다. 대부분은 나를 포함해서 거기에 머무른다. 디디에 에리봉이 출발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다. 그는 읽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 기대하는 최적화의 그 지점에서 과감히 탈주한다. 자신이 떠나온 가족이 가지는 의미, 마침내 탈출했다고 여긴 계급이 끝내 남긴 잔상과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귀하는 부끄러운 지점에 대한 고백은 내가 말하고 싶었으나 끝내 말하여지지 못한 부분들을 마침내 환기한다.
그와 다른 나라, 다른 시대를 통과해 성장했지만 내가 버리고 온 나를 불러오는 작가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가 끝까지 내려가고 끝까지 파고들어 쓴 자신의 그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백 때문일까. 보편성에서 개별성을 환기하는 필력이 놀랍다.
-교육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니어도 그냥 여기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삶의 난제들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나를 덮쳐오는 사건들, 관계에서의 고통, 모든 통제권을 상실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면 이 책이 큰 위안이자 지침이 될 것이다. 내가 삶 앞에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끔찍해 하는 어떤 면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그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깨어서 인생을 사는 태도를 갖추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읽기가 될 것이다. 특히 십대 사춘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이를 키우기 전에 읽어도 좋을 것 같다. 부모가 된다는 건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성장한 나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대면해야 하는 순간과도 같으니까.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정수는 사실 마지막 권에 있다. 마르셀이 '되찾은 시간'의 의미는 결국 그가 잃어버린 시간으로 통한다. 우리는 시간의 궤적이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성취하고 이별하고 아프고 죽고 사라진다. 이 궤적이 모여 삶의 서사를 이룬다.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일이기도 하다. 마르셀이 말했던 오전에 라떼를 앞에 두고 한없이 뻗어나갈 것만 같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결국 스러지고 사라진다. 단 사물에 내재한 그 실재만은 둔 채로. 시간을 언어로 경험하는 신비로운 경험과 다름 아니다. 끝내 붙잡을 듯 붙잡히지 않는 그 수많은 아름다움에 대한 처절한 구도의 길에서 프루스트가 죽기 직전까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의 조각들은 눈물겹도록 아름답다.
-철학

아무 데도 데려가지 않는 삶의 여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천착. 이 젊은 두 철학자는 삶의 부조리
와 불합리에 구태여 대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며 결국 죽어가는 그 여정에 동참할 뿐이다. 삶의 덧없음을 상기하면서도 그것이 무의미에 굴복하지 않는 방법이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빛난다" 어떻게? 찬찬히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미약한 빛이 새어 들어온다. 2022년의 마지막에 맞춤하게 만난 책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철학과 실생활을 접목시키려 시도한 여러 과제들도 해볼만 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을 나누는 부분 같은 것들. 가독성과 깊이를 모두 갖춘 철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