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출처 : 밥헬퍼 > 신영복의 글에서 읽는 지리산, 남명 조식, 거창고등학교
전출처 : 밥헬퍼 > 신영복의 글에서 읽는 지리산, 남명 조식, 거창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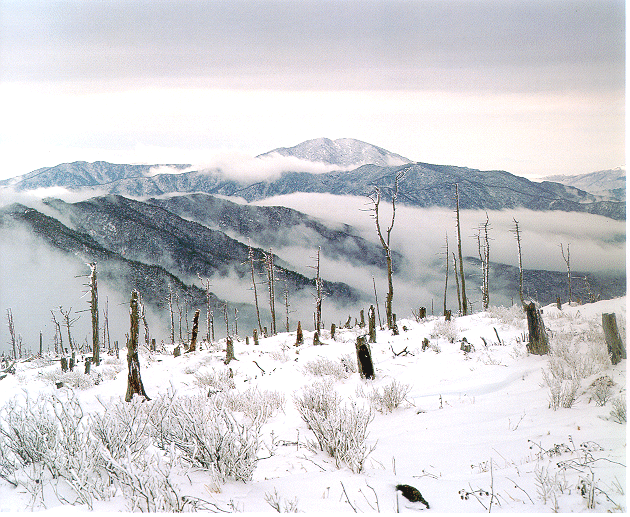
어느 서재에서 이 사진을 봤습니다. 지리산 제석봉의 설경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사진을 보다가 이 산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문득 신영복님의 '나무야 나무야(돌베개,1996 106-111쪽),'에서 읽은 글이 떠올라 다시 읽어봅니다. (사진 stella09님 서재)
....................................................................
빼어남보다 장중함 사랑한 우리 정신사의 '지리산'
남명 조식을 찾아서
신 영 복

금강산은 빼어나긴 하나 장중하지 못하고(秀而不莊) 지리산은 장중하나 빼어나지
못하다(莊而不秀)라고 합니다. 금강산은 그 수려한 봉우리들이 하늘에 빼어나 있되 장중한 무게가 없고, 반면에 지리산은 태산부동의 너른 품으로 대지를 안고 있되 빼어난 자태가
없어 아쉽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빼어나기도 하고 장중하기도 하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산의 경우이든
사람의 경우이든 이 둘을 모두 갖추고 있기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秀)와 장(莊)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이 둘 가운데 하나만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 수(秀)보다는 장(莊)을 택하고 싶습니다. 장중함은 얼른 눈에 띄지도 않고 그것에서 오는 감동도 매우 더딘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있음'이 크고 그 감동이 구원(久遠)하여 가히 '근본'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발 2천여 미터의 지리산 천왕봉이 바라다 보이는 덕천강가에는 지리산만큼 무거워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대답이 없는(非大 無聲) 고고한 선비 남명 조식(南冥 曺植)의 산천재(山天齋)가 있습니다.
퇴계(退溪)와 더불어 영남유학의 쌍벽이었으되 일체의 벼슬을 마다하고 지리산 자락에 은둔하였던 남명은 한 시대의 빼어난 봉우리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정신사에서 그 위상이 차지하는 무게는 가히 지리산의 그것에 비길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퇴계가 "나의 명정에는 처사(處士)라고만 쓰라"는 유연을 남겼다는 말을 듣고 할 벼슬 모두 다 하고 처사라니 진정한 처사야말로 나뿐이라는 말을 남겼을 만큼 그는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사(士)에 처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산천재는 남명이 생애 마지막 10년을 보낸 곳으로 지금은 강물을 돌려놓아서 둘레가 매우 삭막하지만 강가의 절벽 위에 서 있던 당시의 산천재와 이곳아 앉아 천왕봉을 마주하고 있었을 남명의 모습은 가히 지리산의 장중함을 연상케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 내린 비 뒤끝이 채 걷히지 않아 짙은 구름 때문에 마치 문을 열지않는 남명처럼 천왕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산천재 정면 마루 의 벽면에는 소를 모는 농부와 냇물에 귀를 씻는 소부(巢父) 허유(許由)의 고사가 벽화로 남아 있고 주련(柱聯)에는 남명의 고고함을
전해주는 시구가 있습니다.
봄산 어딘들 향기로운 풀 없으랴만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천왕봉을 사랑하여 이곳에 있노라
春山底處無芳草 只愛天王近帝居
퇴계가 풍기군수로 있을 당시 그곳의 백운동서원에 어필을 받아 사액서원(賜額書院)의 효시를 열고 곳곳에 서원을 건립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명은 철저하게 선비의 재야정신(在野精神)을 고수하였습니다. 서원이 초기의 개혁적 성경을 잃고 결국 붕당의 후방기지가 되고 향촌사림의 출세의 거점이 되어 경향(京鄕)의 이해관계가 유착된 정치적 집단으로 전락해 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명은 철저한 재야정신의 역사적 의의를 누구보다도 일찍이꿰뚫어 보고 이를 견고하게 지켜온 형안(炯眼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경(敬)과 의(義)를 근간으로 하는 학문의 대도(大道)는 그것만으로도 어떠한 현실정치보다 더 높은 차원
에서 더 오랜 생명력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있고 또
지탱하여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높이 배어나지는 않되 흡사 산맥 속에 묻힌 숯처럼 역사의 동력을 갈무리하는 중후한 무게를 그는 재야라는 공간에서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물 위의 배에 지나지 않는 것. 배는 모름지기 물의 이치를 알아야 하고 물을 두려워하여야 한다는 지론을 거침없이 갈파한 남명.
벼슬아치는 가죽 위에 돋는 철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는 탐관 오리들을 질타하였습니다. <자료:논개>
산천재 마루에 앉아서 지리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장중한 지리산의 자태가 바로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민중적인 재야성(在野性)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크게 두드리는 민족사의 고비에는 마치 지리산이 몸을 열고 걸어 나왔던 것처럼
남명의 제자들은 몸을 던져 그의(義)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재야의 요체는 한마디로
이러한 진퇴의 중후함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개량'에 매몰되는 급급함보다는 '내일의 건설'을 전망하는 유장함이 더 소중한
까닭은 오늘의 개량이 곧 내일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야의 요체는 독립성이라 믿습니다. '오늘'로부터의 독립이라 믿습니다.
구름 속에 묻혀 있는 천왕봉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지리산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였습니다. 성장(成長)과 출사(出仕)의 급급함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오늘을
개탄하던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일러준 대로 돌아오는 길에 거창에 들러 거창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일러준 대로 돌아오는 길에 거창에 들러 거창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시가지 변두리에 보잘것없는 교사가 울타리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대안교육을 모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를 보내는 곳입니다.
휴일이라 인적도 없는 교정을 돌아보다가 강당의 벽면에서 다음과 같은 직업 선택의
십계(十戒)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한 시대의 빼어남을 지향하는 길을 가지 말고 장중한 역사의 산맥 속에서 익어가는
숯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부품이 되지 말고 싱싱한 한 그루 나무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무너지는 일이 없는 지리산의 장중함이면서 동시에
남명의 철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