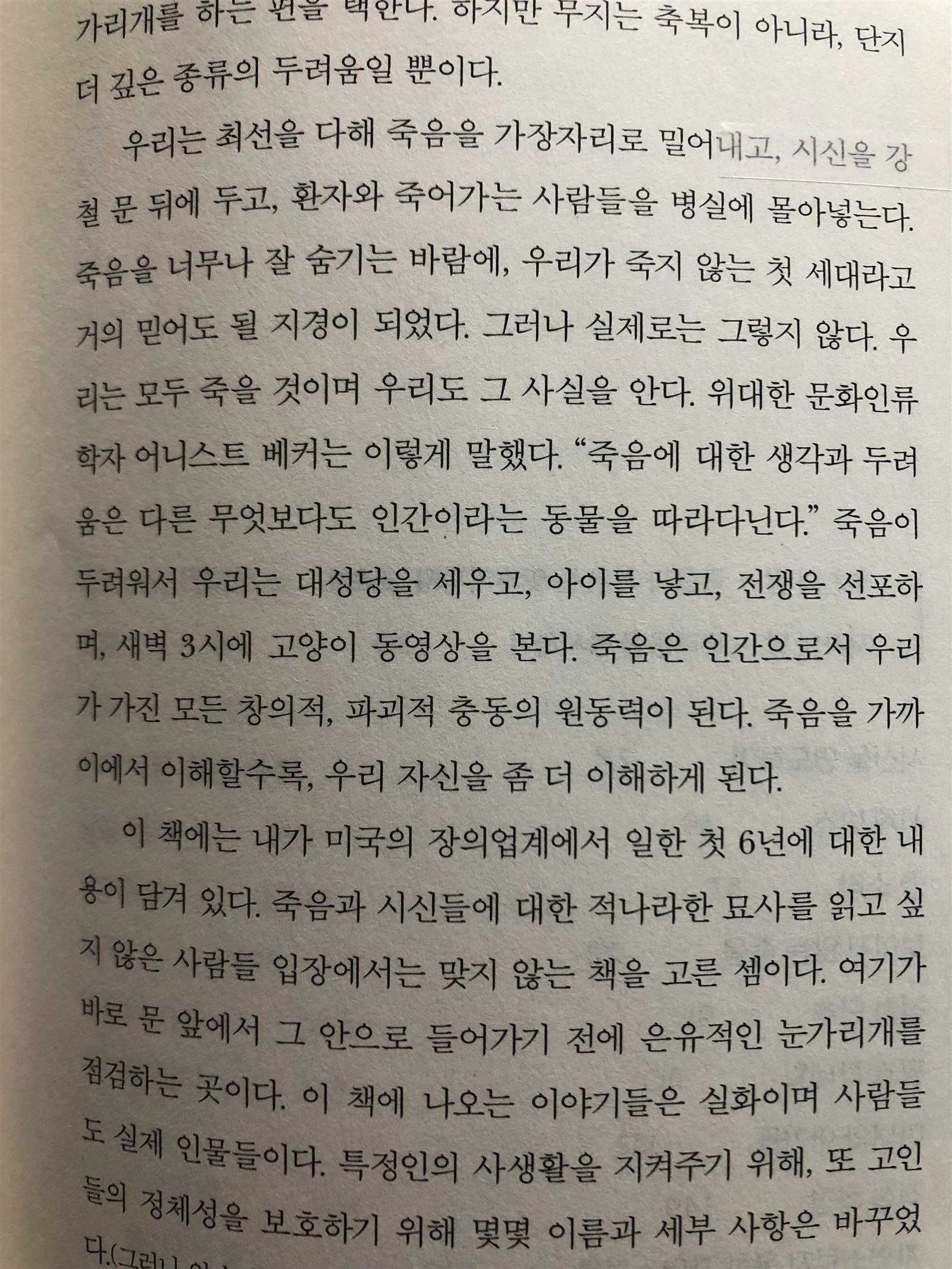좋은 죽음에 대하여
고등학교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가까이서 본 첫 죽음이었다. 아저씨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옥상이나 마당에 천막을 치고 커다란 석유난로를 켰다. 그 위엔 커다란 들통들이 올라가고 소고기뭇국이 끓었다. 국방색의 모포들이 깔리고 화투판이 펼쳐졌다. 시끌벅적했고, 이웃들은 으레 상갓집은 그러하다는 듯 한밤의 소음을 참아내 주었고, 상여가 나가는 날 같이 울어주었다. 근엄과 존엄, 이별의 순간, 서로에 대한 애틋함은 모두가 떠난 뒤에 밀려왔다. 할머니를 묻고 오던 날, 왜 할머니의 얼굴을 할머니의 손을 만져드리지 못했나 생각했다. 다들 온 몸이 지쳐 널부러져 있던 오후, 아버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우시던 그때가 진짜 장례식같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죽음은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의사가 사망시간을 확인하고 나면, 상조회사에 전화를 걸고, 그러면 상주들은 그저 사인을 하고 카드를 건네 계산을 하는 행위들의 반복이다. 무슨 수의를 할지 어떤 비석을 할지, 어떤 방식의 화장이나 매장이 선택될지, 조문객들에게 어떤 종류의 국을 대접할지도 정해야 한다. 상복을 빌려 입고 장례식장의 방 한켠을 차지하면, 곡을 하고 인사를 하는 행위들이 기계처럼 반복된다. 내가 사랑하던 사랑했던 이젠 시신이 된 가족은 상징적인 사진으로만 그 곳에 존재한다.
<인체 재활용>이란 책을 지은 매리 로취 또한 어머니의 죽음앞에서, 이 시신이 정말 내 어머니인가에 대해 생각했다고 한다. 그 생각에서 출발해, 시신들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 책을 쓴 것이다.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은 고스족 출신의 여성 장의사가 보는 장의 문화와 모순에 대한 책으로 둘은 어느 정도 닮은 책이며 서로 보완을 해 준다. 두 권을 같이 읽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듯 하다.
시신은 어떻게 될까.
먼저 일부는 시신기증이 이루어진다. 병원에서 해부를 하는데, 지금은 필요 부분만 절단해서 전달된다고 한다. 천에 덮여 손 하나가, 혹은 머리부분만 40개가 해부실 등에 전달되는 것이다. 물론 기증자에 대한 예의와 고마움의 표시로 조사를 읊는다고 한다.
최초의 서양 외과 수술은 루이14세의 치루 수술이었고, 이 수술이 성공하면서 널리 퍼졌다. 단점이라면 마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가난한 이들은 자신의 수술에 대한 방청권을 팔아 의사에게 진료비를 내야 했다는 것 정도? 물론 수술시엔 꼭 환자를 잘 묶어야 한다.
종교적 이유등으로 해부할 시신이 모자랄 때는, 사고로 아들의 다리가 잘리자 그 다리를 맥주 값에 의사에게 판 아버지 사례부터, 살해를 통해 시신조달을 한 무시무시한 사례도 있다.
(네크로 필리아는 1965년까지 미국에선 범죄가 아니었단다. 지금도 16개 주에서만 범죄로 인정한다고. 충격적이었다.)
테네시대학에서는 시체의 부패를 실험하는 숲이 있다고 한다. 이 숲에선 한 번씩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는데, 시신이 터지는 소리라고 한다. 옷을 입은 시신, 벗은 시신, 익사한 시신등 다양한 시신들을 다양한 조건으로 숲에 가져다 놓고 부패 정도 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런 실험을 통해, 시신의 상태로 사망시간이나 사망장소를 추측하고 살인범을 잡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화장시에는 가장 잘 타는 것인 폐이며 가장 잘 안 타는 부위가 뇌라고 한다. 타는 차이에 따라서 시신이 벌떡 일어나곤 하는데, 이런 모습이 와전돼서 화장터의 괴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1960년대부터는 장례문화가 발전하면서, 화장의 기술, 보존처리 기술 등도 발달했다고 한다.
외국영화를 보면 관 안에 평온히 잠든 듯한 고인을 보며 많은 이들이 애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결국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장의사들은 고인의 눈을 찌르고 화장을 하고 입 안에 보형물을 넣고, 접착제로 입을 다물게 한다. 퉁퉁 부인 팔과 다리를 랩으로 감싸고 옷을 입히고 구두를 신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그래서 뇌사와 심장정지 사이에서 사망선고를 고민한다. 옛날 사람들은 간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고, 이집트인들은 심장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
식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돋보이게 하는 데 사용하는 식인, 그러나 유럽인들 또한 이집트 미라 가루를 만병통치약으로 믿었다. 디에고 리베라는 고양이에게 고양이를 먹였더니 털빛등이 좋아졌다는 화상의 말을 믿고 두 달간 사람고기만 먹기도 했다. 우리나라 또한 효와 관련된 기록엔 허벅지를 잘라 구워 드렸다거나 단지해서 피를 먹였다는 사례가 많다. 아랍에선 꿀에 절인 시신을 약으로 먹었고, 십자군 원정 시 어린아이는 구워서 노인들은 질기니 삶아서 먹었단 기록이 있다.
건조한 기후로 시체가 썩지 않아 조장(시신을 새 등이 먹게 하는 장례)을 했던 지역도 있었고, 고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나눠 먹던 지역도 있었다. 부활을 위해 시신을 그대로 보존하려 애쓴 곳도 있었고, 어머니의 강에 흘려보내는 곳도 있다. 최근엔 스웨덴에서 활발하게 행해지는 형태로, 수산화나트륨에 시신을 녹이는 장례도 있다. 비용은 30달러이며 남은 부분은 퇴비로 사용된다.
장례와 관련해서는 세세히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꺼린다. 그것이 왠지 고인에 대한 모독 같아서 혹은 금기처럼 느껴져서이다. 화장터의 열을 이용해 물을 데우고 지역난방에 활용한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어색해할 것이다. 내 방이 지금 따뜻해지는 건 38구의 시체가 화장되면서 쓰인 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으스스해진다. 상업적이고 차가운 장례문화는 달라져야 한다. 화장을 위해 쓰이는 에너지낭비, 매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낭비, 보존처리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외면해선 안된다고 한다.
엄청난 돈을 들인 장례식과 스웨덴의 30달러짜리 장례식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장의 문화에 몸을 담았던, 그리고 시신에 대해 취재한 두 작가는 죽음을 숨기는 것에 반대하며 좋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숨겨지고 싶지 않다. 삼나무 숲에서 영혼의 캄캄한 밤을 보낸 후로, 난 평생 내가 먹은 동물들이 언젠가는 반대로 나를 먹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우리는 아무리 죽음을 숨기려 해도, 삶의 끝에서 만나게 됨을 안다.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거나, 사랑하는 이 옆에서 눈을 감는다면 그건 썩 좋은 죽음일 것이다.
그 후엔?
이 책에 쓰여진 대로다.
“장례문화는 남은 사람의 몫이다.”
(아래 그림은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에 소개 된 이재림이 만든 수의이다. 수목장블로그에서 가져온 사진으로 버섯포자에서 만든 실로 만들어진 이 수의는 부패시 발생하는 독소등을 없애고 생분해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