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들은
아침에 올 상반기 베스트 셀러 도서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 참고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24/2011062402200.html )
아쉽게도 이곳, 알라딘의 통계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 (4대 서점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음. 온라인으로는 들겠지만)
놀라웠다. 놀라워.
가장 놀라웠던 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제외하곤 올해 신간으로 50위 권에 든 한국소설은 김진명의 <고구려>와 정유정의 <7년의 밤>이 유일했다.(솔직히 김진명 작가 다시 보았다) 그외 가뭄에 콩나듯 <허수아비춤>, <덕혜옹주>등 작년에 베스트 셀러가 된 작품들이었고 100위 권에 최신작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가 의외로 느껴질 정도였다. 한국소설을 이렇게들 안읽으시다니... 대부분 소설은 일본, 미국 대중소설이었고 그 판매부수도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슬펐다.
소설가가 되고 싶은 꿈이 참 어이없어 보였고, 새삼 고현정, 신정아, 백지연이 대단해 보였다. (정확히는 고현정의 피부, 신정아의 남자들, 백지연의 미모가 대단한 것이지만) 그렇게들 욕하더니 신정아 책의 판매부수를 보라. 우리는'정의'만큼 그녀가 궁금했던 것이다. 김제동의 책이 많이 팔린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체로 유명해지고 볼 일이 아니던가. 그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에 의해 한번도 화제성을 창출하지 못하고 먼지 날리고 있을 순수문학 작가들이 안스럽다는 말이다.
어제, 문학동네 편집부장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김남일의 소설 <천재토끼 차상문>은 참 좋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던 차에 하필 현빈이 시크릿 가든에서 한번 품에 안아주었더니 그 다음날로 하루에 이백권씩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 김남일 작가가 위암으로 투병하고 있던 터라 그 소식이 너무 반가워 현빈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만약 현빈이 그 책 말고 다른 책을 가슴에 품었다면 그 책 또한 비슷한 운명이었으리라. 그렇다면 그건 현빈의 공이 아니고 현빈손에 그 책을 쥐어준 김은숙 작가의 공일 터인데, 앞으로 편집자들은 드라마 작가들과 연계를 하는 것이 어떠한가, 싶을 정도다.
또 한가지, 작년에 이어 상반기 2위인 <정의를 무엇인가>는 끝까지 책을 읽는 사람이 없다고 하며, 그 책을 사는 이유는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고보는 보상심리의 일환이며, 니가 사니 내가 산다식의 패션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1위인 <아프니까 청춘이다> 역시 저자인 김난도 교수가 다름아닌 서울대 교수인 것이 위로가 되었다고 하며, 이러저러한 분노를 치유하기 위해 스님 시리즈가 합이 십만부 이상 팔려나간 것이라고 한다. 이 틈에 한국소설이 위치할 곳은 그저 사람들이 많이 보았기에 나도 한번 보아야 할 것 같은 초대형 베스트 셀러 정도에 국한되며(3년째 엄마를 울궈먹고 있는 사람들은 독자인가, 출판사인가) 신간 같은 건 좀 두고 볼일로 미루어 지는, 확실히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안 읽어도 큰 상관없는 책으로 전락한 듯하다.
#2. 나는
상반기에 내가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는 세어 보지 않았다. 그런 건 잘 안한다.
그런데 내 맘대로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국내작가의 베스트를 뽑아 보고 싶었다.
(마치 그들의 리스트에 항거라도 하는 심정으로 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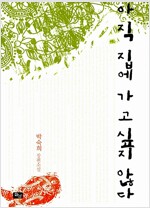
천운영의 <생강>이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주제가 너무 무겁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하나, 제목이 주제와 조금 동떨어져 보인다는
낯설음도 무시 못 할 것이다. 안타깝다. 정말 수작이었는데.
최인호의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는 칼날과 붓끝이 예리한 소설이다. 워낙 고정독자가 많아 초기 마케팅에 성공한 듯하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이도 오래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예감이 드는 건 뭘까. 연말까지 롱런하시길 빈다.
글쓰기 하는 분들은 꼭 최일남의 에세이를 한번씩 읽어 보셨음 싶다. 국어라는 언어의 위대함을 새삼 확인할수 있을 테니까
박숙희의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치 문단에서 버려진 소설처럼 이 책을 읽었다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다. 재미도 괜찮고
문장도 매력있다. 대형출판사와 유명작가에 밀린 작품이라 안타깝다.
그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으로 서경식의 <언어의 감옥에서>와 시집<오늘 아침 단어>도 좋았다. 사실 시집은 올해 끝까지 독파한 적이 거의 없고 내 의지로 집어든 신간이 없지만, 만 하루 동안 정들었던 시집이라도 읽었다고 생색은 내고 싶다. 무엇보다 제목이 마음을 끌지 않는가. 물론, 오늘 아침 나의 단어는 '베스트 셀러'였음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으로 서경식의 <언어의 감옥에서>와 시집<오늘 아침 단어>도 좋았다. 사실 시집은 올해 끝까지 독파한 적이 거의 없고 내 의지로 집어든 신간이 없지만, 만 하루 동안 정들었던 시집이라도 읽었다고 생색은 내고 싶다. 무엇보다 제목이 마음을 끌지 않는가. 물론, 오늘 아침 나의 단어는 '베스트 셀러'였음이다.
<언어의 감옥에서>는 처음으로 논리의 아름다움이 눈물을 자아낼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책이다. 이 책의 리뷰를 쓸 때 나는 살짝 설레기 까지 했고 다 쓰고 나서 무언가 내 논리의 틀을 깨부순 느낌이 들었다.
많은 책을 읽었던것 같은데,
막상 꼽으려고 하니 기준도 애매하고, 주제넘는다는 생각도 든다. 또 내 독서의 취향이 무척 편향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걱정되는 건, 누군가는 저런 베스트 셀러의 목록을 확인하곤 그 안에 든 책을 또 의무방어전 치르듯 서점가서 집어 들 것이라는 것이다. 남들이 다 읽었다 하니 행여 뒤질세라 피곤한 심정으로. 그럼 알려진 책은 더 잘 팔리고 반대로 뜨지 못한 책은 더 묻혀지게 될 것이다.
하여튼, 베스트 셀러의 소식은 언제나 우울하다.
언제쯤 베스트 소식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