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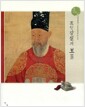
-
조선 왕실의 보물 ㅣ 보림한국미술관 5
김경미 외 지음 / 보림 / 2008년 4월
평점 :

품절

여간해서는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어젠 이산하는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게 되었다. 마침 정조가 수원으로 능행을 가는 장면이 나왔다. 그렇잖아도 낮에 이 책에 나오는 혜경궁 환갑장치 때 그렸던 그림(물론 드라마에서는 환갑잔치는 아니었다.)을 자세히 보았던 터라 얼른 책을 가지고 가서 남편에게 보여줬다. 특히 서민층 노인들에게 경로잔치를 열어주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그 그림도 함께 보고 배다리를 만들어서 건너는 장면도 보고...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건만 오히려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왕비의 치마가 어제는 다르게 보였다. 중전의 경우는 스란단을 두 단 댄 대란치마를 입었고 후궁은 한 단만 댄 것을 입었다. 또 비녀에 용무늬가 있는 것까지 보였다. 다른 사극에서는 왕비나 후궁들이 떨잠을 화려하게 꽂고 나오는데 이산에서는 그건 나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전에는 한번도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장면들이다. 그저 사극 주인공들의 옷이 점점 화려해지는구나를 느끼는 정도라고나 할까. 그런데 책에 있는 곤룡포를 보니 요즘 나오는 사극에서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다. 용 무늬가 있고 비단에 금실로 수 놓은 것을 제외하곤 수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시대 흐름에 맞춰 옛모습도 변형시키는 것 같아 약간 씁쓸함을 느낀다.
흔히 말하는 용상과 어좌의 정확한 의미도 알았고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도 알게 되었다. 그 중 특히 기억나는 것은 임금이 행차할 때 옥새를 실은 수레를 앞세우고 임금이 그 뒤를 따라간단다. 다른 곳으로 행차를 해서 그곳에서 교지를 내리거나 공식 문서를 작성할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옥새를 가지고 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읽고 나니 당연한 것이건만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이러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 시리즈의 책을 접할 때면 설레임이 앞선다. 은은한 종이색과 어울리는 멋진 사진과 잔잔한 문체 등 어느 것 하나 지나칠 수 없는 책이다. 왕실에서 쓰는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단순히 역사로 접근하던 때와는 다른 뭔가가 느껴진다. 뭐랄까. 더 친근하고 사람사는 냄새가 느껴진다고나 할까.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조선의 신하들은 당파싸움만 일삼고 왕들은 권력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각인되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나의 지나친 편견이었음을 새삼 깨닫는다. 곳곳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임금이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절제가 있었고 신하들은 신하들 대로 규제와 격식을 지키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 정말 이 책은 단순히 좋다는 말로는 얼마나 좋은지 나타내기 어려운 그런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