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치철학, 문학비평, 소설, 미디어아트 등 그간 '파국'을 다룬 다양한 표현영역이 있었지만, 대박은 뜬금없이 영화에서 터져나왔다. 감히 말하자면, <빅 쇼트>는 파국을 다룬 근래 작품들 중 가장 섹시하게 이 주제를 건드리고 있다.
2. 사실 난 이 영화가 나올 당시 크레디트에 아담 맥케이(감독)가 있는 걸 보고 의아했다. 진지한 사회적 주제에 윌 패럴 같은 유머를 얹어 그만의 논평을 해온 의진 알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라니. '만만찮은'이란 표현도 모자란다. 누가 이 테마를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하나 맥케이는 '블랙 코미디'라는 자신의 오랜 장기를 십분 발휘해 비슷한 주제를 건드린 영화 <마진 콜>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의 선택은 자신이 연출한 내용 속 인물들의 운명과 일치했다.
3. 사실화된 정보가 무수히 나오는 작품을 보면 (이동진이 요즘 한국영화의 재능을 까는 것과 유사한 차원에서) 부러울 때가 많다. 가령 애론 소킨 같은 작가가 보여주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 속 정보량의 적절한 배치, 서사와 대사에 녹여내는 정보 전달의 안정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데 꼭 공로는 이야기 전달자인 작 가들에게만 있을까. <빅 쇼트>의 숨은 공신인 편집기사 행크 코윈은 실화 바탕의 영화, 특히 사실화된 정보량이 압축적으로 쏟아져나올 수밖에 없는 작품에서 '편집'이 갖는 매력과 기여도를 증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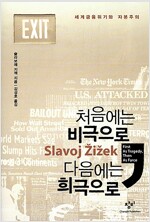
4. 영화를 본 이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영화의 편집적 특색을 '지젝적 편집'이라 부르려 한다. 어그레시브하면서 다변가인, 그리고 2008 금융위기에 관해 그가 수없이 언급해온 우화, 주장, 이론 등을 떠올려본다면, <빅 쇼트>는 지젝의 퍼포먼스와 닮았다. 살짝 정신적으로 흥분한 상태마저도.
5. 코윈은 애덤 맥케이와 한 번도 같이 일해본 적이 없었다. 테렌스 맬릭과 올리버 스톤 등 그가 함께 작업해온 감독을 생각해볼 때 애덤 맥케이는 속된 말로 고삐리 양아치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코윈은 "왜 나지?" 하며 캐스팅 과정을 두고 의아해했다. 허나 코윈은 촬영 과정에서 맥케이가 이 무거운 주제를 유머러스하고 영리하게 풀어가는 걸 확인하면서 신뢰하기 시작했다.
6. 영화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두 축인 크리스천 베일과 스티브 카렐을 통해 숏 자체를 상당히 '분열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풀 숏은 거의 나오지 않는 가운데, 영화는 경제적 파국의 불안을 대화와 표정의 교환에서 읽어내려 한다. 여기서 코윈의 역할은 '잡스럽고 다변적이며 혼란스러운' 숏의 의미를 커팅을 통해 살려내는 것이다.
7. <빅 쇼트>는 고난이도의 금융공학 용어가 등장할 때, 이를 재치있게 설명하는 인터미션을 적절히 살렸지만, 이 금융 비극과 연관된 여러 인물의 시공간적 속 활동과 템포에 색깔을 넣는 데 큰 공을 들인 것이 느껴진다(그리고 그런 것이 은은하고 은근하게 보여야 편집은 성공한 것이다).
8. 크리스찬 베일이 맡은 베리와 스티브 카렐이 맡은 바움이 나오는 씬을 비교해보면, 숏의 다채로움과 보여지는 템포는 차이가 나며, 그러한 편집술이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어떤 분노를 메탈과 락으로 다스리는 베리란 캐릭터는 좀처럼 사무실 바깥을 나가지 않으며 협소한 영역에서 씬을 끌어간다. 이에 반해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는 카렐의 캐릭터 바움은 공격적이면서도 인간미 있는 씬을 만들어가면서 특히 월가를 쏘다니고 인간들을 직접 접촉한다. 카메라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두 주연을 빈번한 클로즈업, 줌인, 줌아웃, 핸드헬드로 잡아갔고, 코윈은 분열증적이고 잡식적인 편집으로 캐릭터들의 불안과 영화 속 사실화된 정보량을 성공적으로 제어해나간다.
9.맬릭의 느리면서 명상적인 스타일, 한 작품에 쏟아내는 시각적 정보량하면 일가견 있는 스톤의 다큐식 스타일을 접해본 코윈에게 <빅 쇼트>는 그 믹싱을 시험해볼 무대였을지 모른다. 지금 평단의 환호와 코윈에 대한 언론들의 주목으로 봐선 테스트 결과는 성공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