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D.H. 로런스 연구서를 써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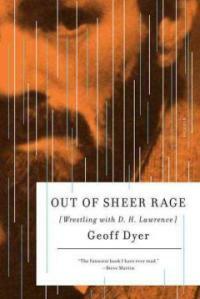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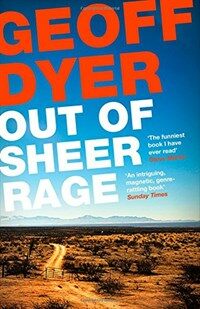
"요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만의 D.H. 로런스 연구서를 써야만 한다. 절대 출판하지 못할지라도, 절대 완성하지 못할지라도, 몇 년 후에 손을 떼고, 몇 년간의 노력이 끝을 맺지 못하고, 처음 가졌던 야망을 끝까지 밀어 붙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기록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만의 D.H. 로런스 연구서를 약간이라도 진척시켜야 한다. 타오스에서 타오르미나까지, 우리가 찾아갔던 곳에서부터 절대 발을 들이지 못할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만의 D.H. 로런스 연구서를 진척시키도록 애쓰는 것이다." (308)
장의 장의 구분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글이 수다스럽게 느껴지면서도 제프 다이어만의 솔직함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두서없이 생각이 가는대로 글을 써가는 특징은 이번에 읽은 《미루고 짜증내도 괜찮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다.
이 책에서 묘사되는 로런스의 모습은 다이어가 로런스의 서한집(로런스는 무려 7권짜리 서한집을 자비로 출판했다)중 여러 곳에서 인용한 부분에 근거하는데, 로런스가 얼마나 성마르고 예민한 면모가 있는 인물인지 잘 보여준다. 책을 읽다보면 로런스가 제프 다이어와 닮은 구석도 많은 듯하다. 다이어도 온갖 질병을 달고 다니고, 어께가 좁다는 콤플렉스를 비롯해서 끊임없이 셀프 디스를 하며 자책하기도 하고 독자를 웃기기도 한다. 물론 다이어가 쓴 말의 절반은 정말로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회만 되면 로런스 연구서 쓰기를 미룰 핑계를 찾아내는 '재능'을 가진 작가의 면모가 유감없이 들어있다. 다이어는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모범적이고 반듯한 것에 두드러기가 나는 인물 같다. 알레르기 치료약에도 알레르기를 가진 인물이니 말이다. 뭔가 하고 싶어서 실행으로 옮기고 나면 시간 낭비했다고 자책하는 자신에 대해 고민하지만, 또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련과 후회로 고민하는 사람이 제프 다이어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은 예상 외로 '교훈적'이다. 왠지 '제프 다이어스럽지 않은' 마무리이지만, 이 또한 그가 D.H. 로런스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그의 서간집을 읽고 좋아하면서도 그에 대해 연구서를 쓰지 않은 여정의 기록이기에 마음에 든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로런스 연구서를 써야만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 우울증세로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과 열정을 잃었을 때, 제프 다이어가 다시 무언가에 대한 열의와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만의 로런스 연구서 쓰기 프로젝트'같은 것들이 있어서일 거다. 바로 현대인들이 잃어가는 것, 현대인의 우울증을 완화하고 삶을 새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대상을 각자 하나씩 갖는 일이 아닐까 싶다. 누구에겐 하루에 단 30분 정도만 주어지는 독서 시간일 수도 있다. 나만의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책에 대한 생각]
*이 책은 장의 구분 없이 저자의 생각들을 이어붙이듯 쓴 글이기에 독자에 따라 읽다가 지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이어의 솔직한 수다와 은근한 유머가 이런 점을 상쇄해주는 면이 있다. 제프 다이어는 이 책에서 로런스에 대한 연구서를 완성하지 않는다. 그 '변명'을 책의 마지막에 다소 '교훈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이유가 나름 인상적이다.
**전자책이 아니라면 물성으로서의 책 역시 독자에게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표지가 일반적인 소프트커버에 비해 얇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거슬리는 더스트 커버가 같이 나오지 않은 점은 좋다.
***미주에 대한 방식이 독자에게는 불편하다. 본문의 해당 문장 일부를 미주란에 가져와 참고문헌을 기록해두었는데, 원서에 번호가 없었더라도, 번역서에는 본문에 일련번호를 달아 혹시나 찾아보고 싶은 독자가 활용하기 쉽게 배려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요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만의 D.H. 로런스 연구서를 써야만 한다."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