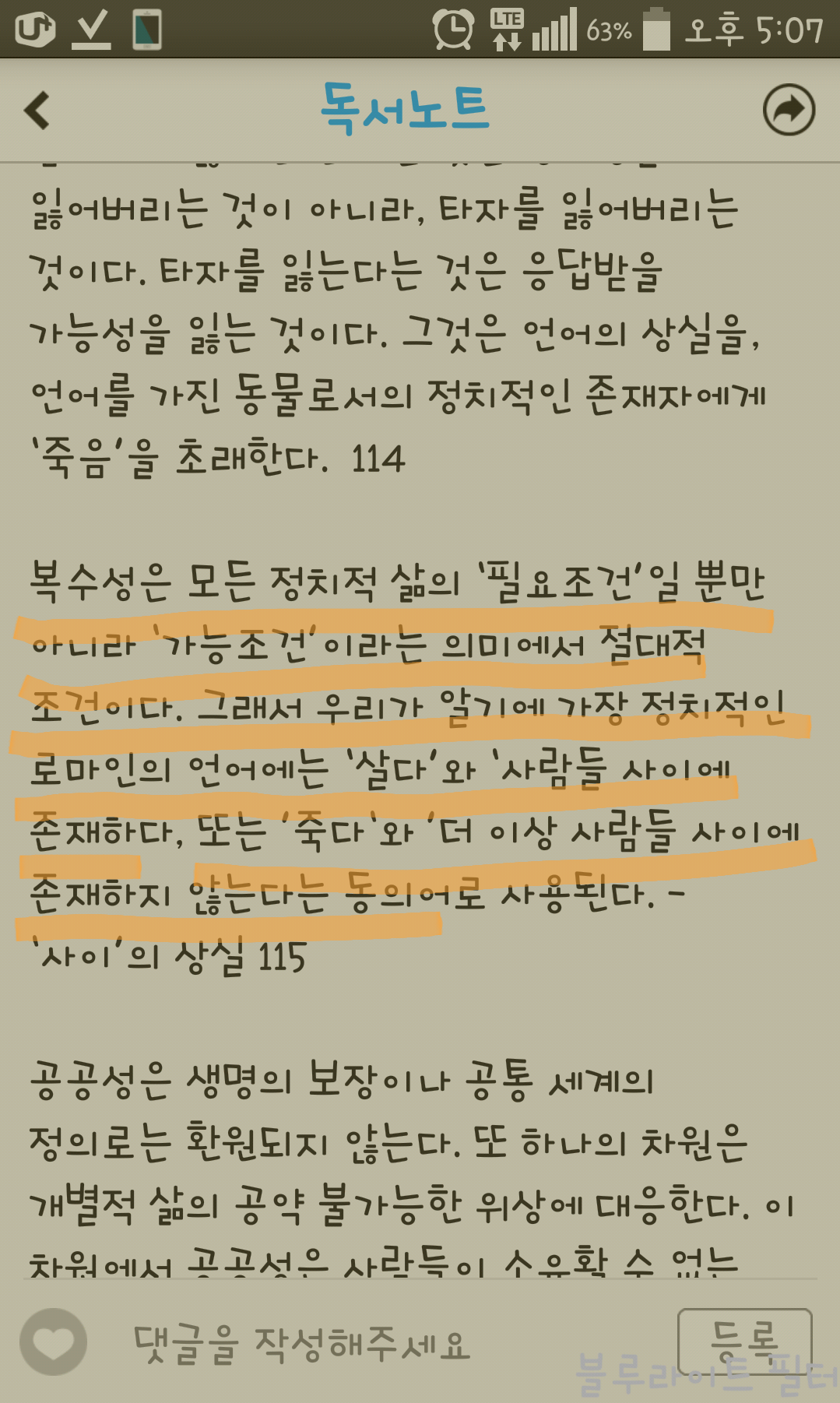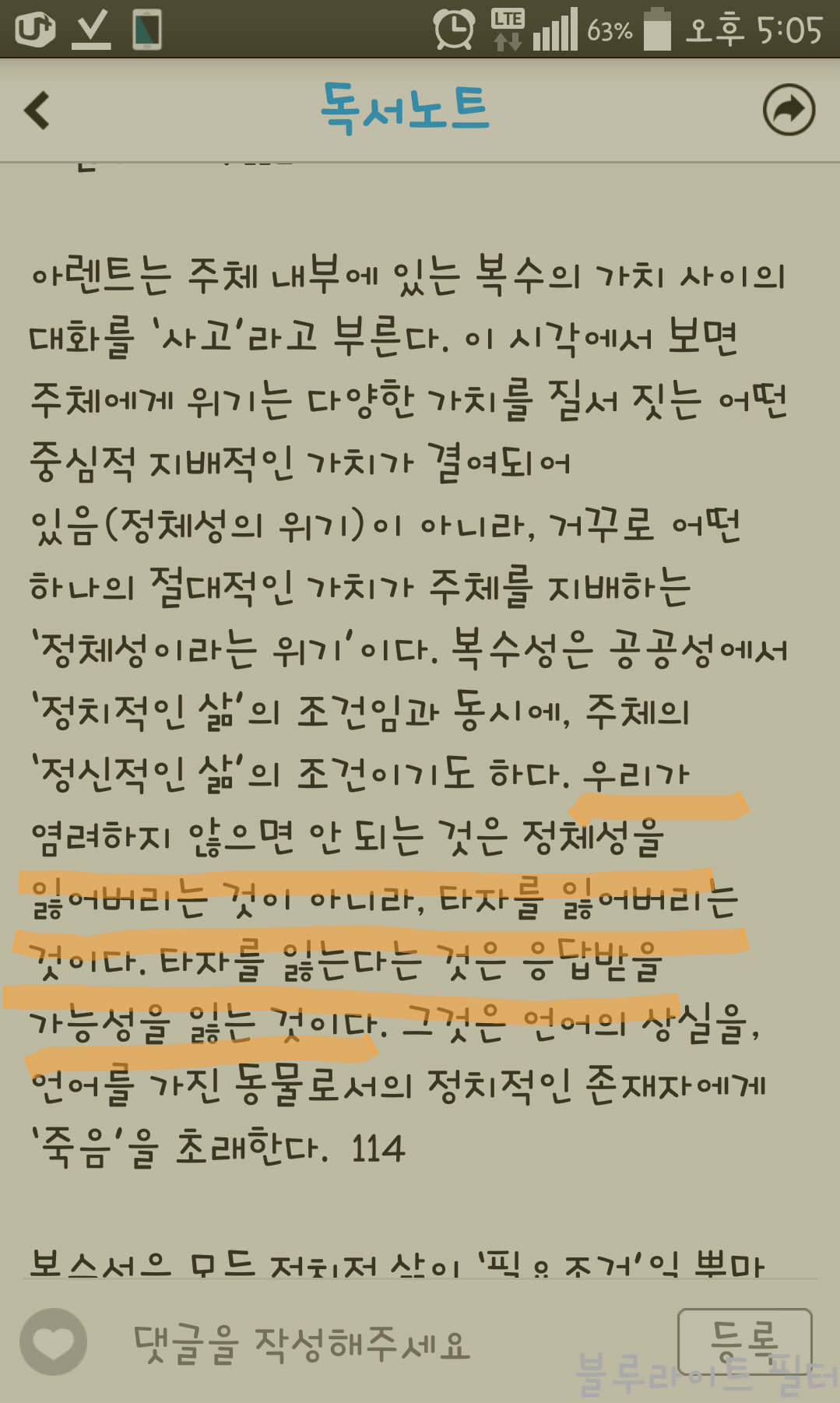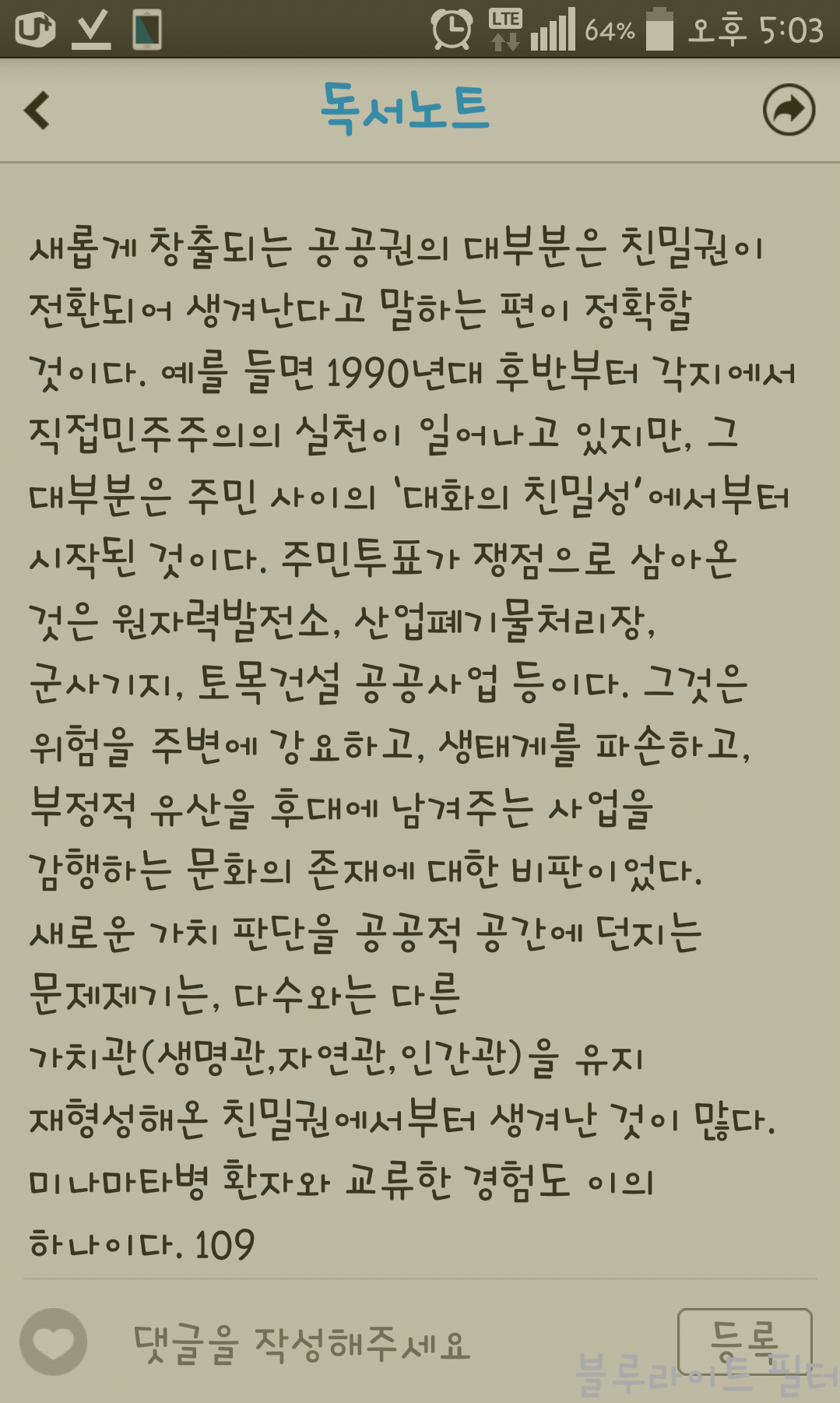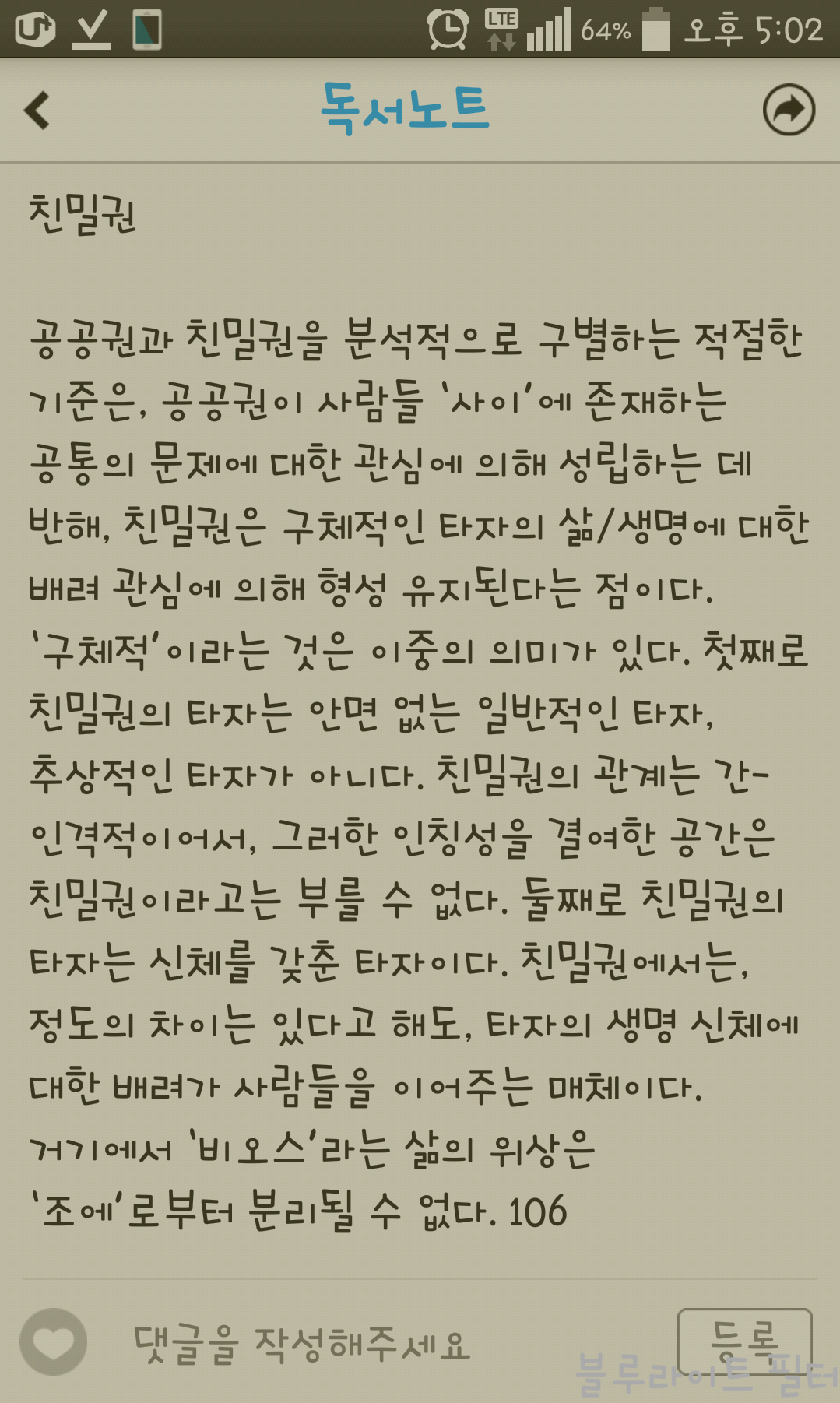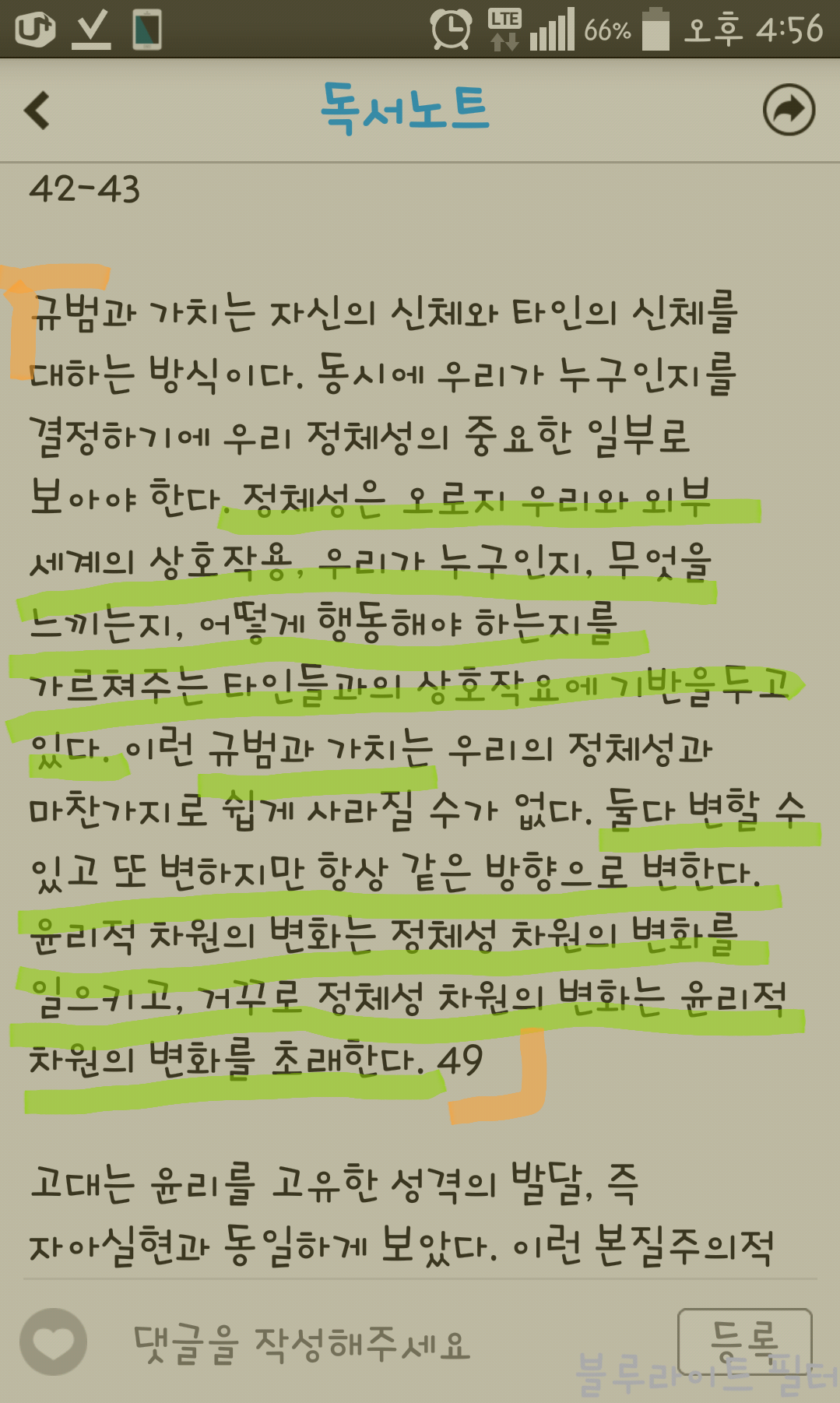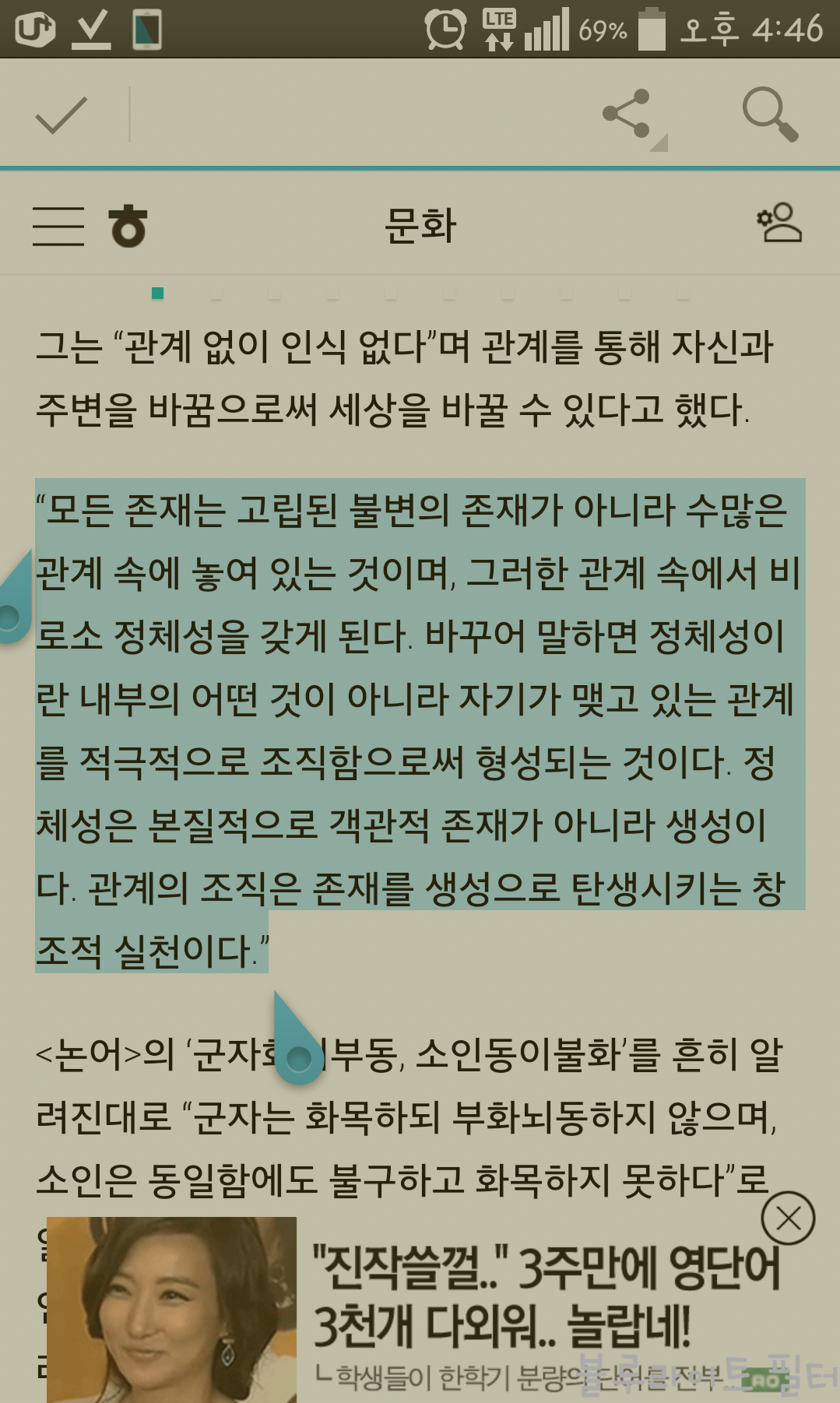`정체성은 없다` - 사람이나 모임들도 인정을 전제로 할 것이다. 거기에 정체성이란 허구는 늘 타자를 전제로 한다. 나는 너로 설 수밖에 없다. 나로 깊어지면서 너로 다가서는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그래서 미움은 독이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젠 어디에 흔적이 있는지 기억도 희미해졌다. 기록을 부여잡는다. 느끼면 버려야 할 것이다. 모임들의 경계도 희미해지고 정체성을 파고드는 소모적인 일들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라고 부르는 모임 사이 과연 중력은 존재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