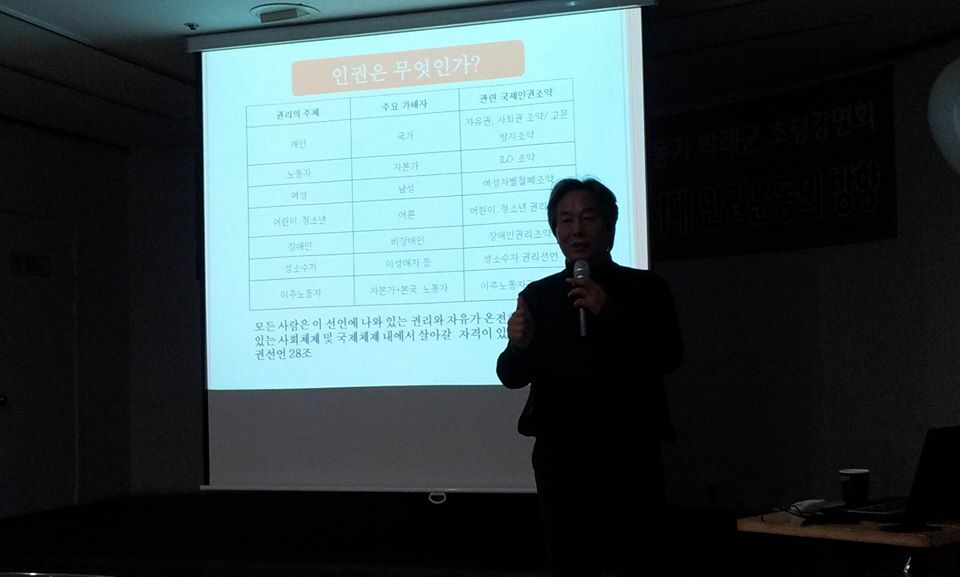모서리.
루쉰을 읽어내면서 의문과 동시에 회의가 이는 지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루쉰이 끈질기게 잡아당기고 있는 시선. 왔다도 혁명도 지금이 유보된 주장과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처절하게 잡고자 했던 그것. 절망을 수선하고, 죽음을 조련해낸다. 뺏겨진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 점점 더 벼랑에 몰리는 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따르라고 하는 자들. 더 격렬하게 따라오라고 외치는 자들. 그 멀어지는 간극과 해결될 수 없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그렇게 붙들리면 눈밖에 사라졌던 이들이 소환된다. 죽음의 벼랑앞에 선자. 예비된 주검으로서 환자. 우울의 그물에 걸린자들, 장애인, 노인, 어린이...삶의 살아내는 절반. 법밖과 시선의 범위에 벗어난 절반이상의 사람들. 정상인의 시선과 꿈 속에도 없는 사람들이 보인다. 똑 같은 삶인데 왜 말도 일상도 살아냄도 없어야 하는가. 없었는가.
일상은 혁명이다. 혁명 속이다. 혁명을 지켜보는 시선만 닫혀있을 뿐 현실은 혁명이다. 아무도 지금에서 사상의 싹을 키우려하지 않는다. 빌려와서 다른 이들과 삶 속에서 빌리려고만 할 뿐이다.
경제적 공포에서 하는 주장은 '노동은 없다'이다. 만들어주고자, 누구나 외치는 일자리는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이다. 없는데 없다고 해야지 왜 자꾸 있을 것이다.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라고 거짓을 말하느냐고 말한다. 정치인도 경제인도 이 세상누구도 노동을 구해주지 못한다. 현실을 직시하라. 기껏해야 허름한 일자리밖에 없다. 벽이다. 없다. 또 벽이다.
루쉰에 머무르면, 탈식민주의의 보드를 탈 수밖에 없다. 말할 수 없는 자들, 목이 없는 자들. 그 이중, 삼중의 굴레에 살아내고 있는 이들. 그래서 권력을 말한다. 누리는 것들. 공기처럼 호흡하는 편안함에 대한 속성들. 신음소리가 삐져나오는데 그 가마를 타고가는 이들. 가마를 타려는 이들.
진보의 낙수효과는 있는가. 진보연하는 무리가 끌고가는 것들은 고통의 조각과 아픔의 신음소리를 끌고갈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할 수 없는가부터 말하라.
우리는 외친다. 외치는 수밖에 없다. 설명은 너네가 해라. 여기에서 비명을 지를테니 말이다. 말이 없어 지를 수밖에 없다. 모을 수 밖에 없다. 뒤편의 삶을 드러내야 한다. 보일 수밖에 없다. 똑같은 목숨이다. 너네가 말해야 한다. 살게 해줘라. 단 하루라도 고통을 줄여라. 너네가 할일이다.
이게 현실이다. 정상과 미래를 주장하는 이들도 늘 아프고 다치고 헐벗고 늙고 병든다. 삶이 온다. 삶이 이리로 올 수밖에 없다. 만들고 기획하고 더 나은 삶을 저축한다는 자는 자신을 우롱하는 자다.




볕뉘. 볕이 드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루쉰이 떠올라 그늘진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던 스피박, 호미 바바를 소환해야 한다. 고통스럽다. 안심이기도 하다. 삶을 잡을 수 있다던 오해는 이렇게 이해를 낳는다. 가을과 겨울이 겹치는 지점 앎의 우울을 앓는다. 사유의 탐침자 정희진을 만난 것도 아프고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