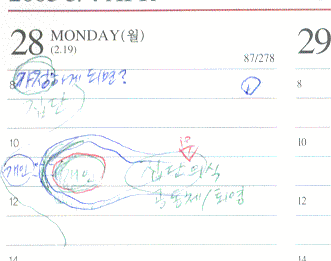
1. 개인-개인의 만남은 자연스럽고 존중하려고 하나, 무엇인가 낯설음에 대해 개인이라는 다양성으로 고리를 찾으려 하는지? 낯설음에 대해 개인이 담그고 있는 단체나 레토릭이나 색깔로 너무 쉽게 얼버무리는 것은 아닐까? 단 몇마디나 서너번의 만남으로 판단하고 마는.... 개인의 움직임에 거스르는 물살의 뒷부분에 남는 퇴영의 그림자. 공동체를 빙자한 퇴영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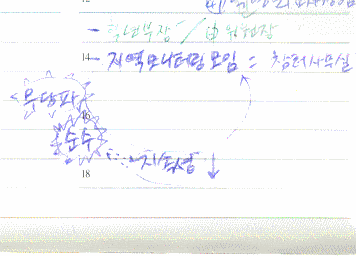
2. 신문 모니터링 모임에 참관하다. 문득 엊그제 학교운영위가 생각이 났다. 순수함과 당색깔 없는 운영위를 바라는 주부님을 보고 역시 아무 색깔없는 것이 모두를 정체시키는 가장 진한 색깔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색깔없는 중용은 중용이 아니지 않을까? 변화시키려면 자기 색깔을 내고 그만큼 서로 맛이 버무려져 비빔밥이 될 때 참다운 중용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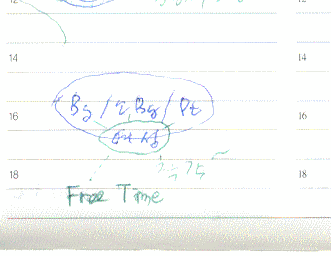
3. 여성과 모성에 대한 책을 읽다가 여유로 손길이 간다. 식민지를 바라보듯, 타잔 영화처럼, 남자들의 그늘은 늘 퇴영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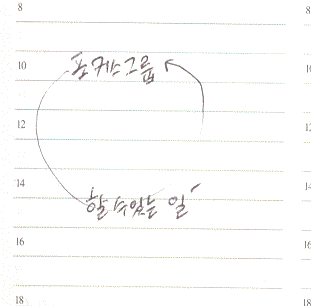
4. 과학 주제 관련 포커스그룹을 적용한 분의 강의를 듣다. 심의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고, 심층면접을 통한 현안의 질적 접근법인데, 강의 내내 몇몇분이 준비해서 지역 활*가 그룹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가시지 않는다. 골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행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활동,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 다른 그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관심도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