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의 비늘] 그녀를 바라보려해도 바라볼 수가 없다. 그와 시선을 피한지가 오래되었고, 그녀를 만나도 도통 눈빛 한번 줄 수가 없다. 그녀가 꼬리를 감출 무렵에서야 그의 여운을 바라볼 뿐, 아니면 그녀가 다가 올 무렵에야 그쪽을 응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요즘 그녀의 금빛 향香을 받아 안는다. 그녀가 준 햇분粉을 볼에 바른다. 반짝이는 만개의 온기를 온몸으로 받아 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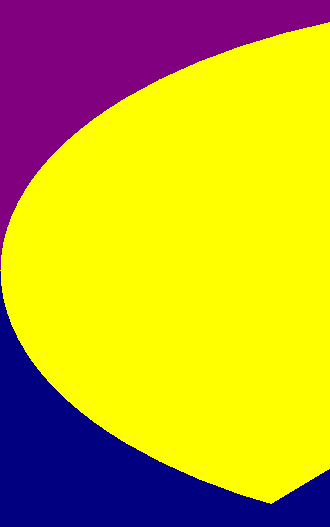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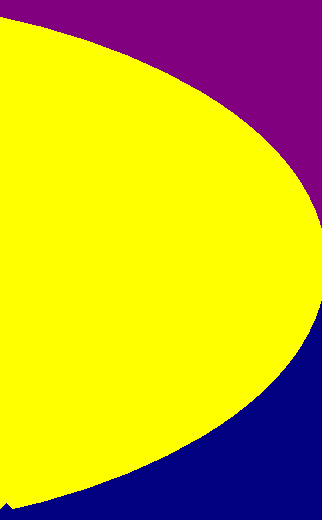
#2. [달의 비늘] 달과 사귄지도 아마 이천여일이 되었을게다. 그런데 난 지금에서야 그 녀석이 저렇게 둥둥 떠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렇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시냇물처럼 흐를 수 있을 것이란 느낌이 걸린다. 바스락거리기도 하고, 파르르 떨리기도 하고, 부서져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상상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바닷가에 호수에 저혼자 천개의 비늘로 멱을 감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아마 난 그녀가 너무 가까이 있어 늘 그려러니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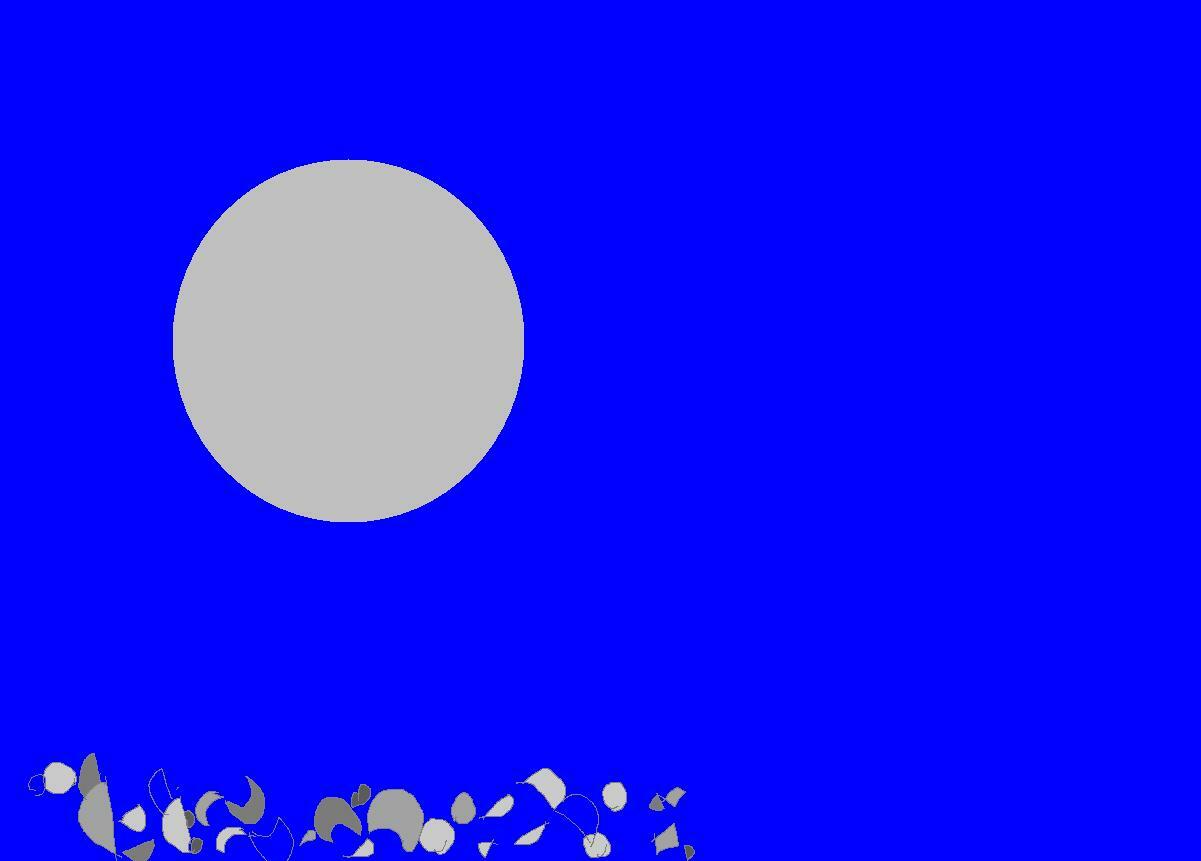
뱀발. 퇴근길 보름이 가깝다. 달이 많은 도시. 호수를 지날 무렵 비친 달은 잔물결에 흐느낀다. 밝은 조명등아래 도시인들은 눈길한번 주지 않는다. 난 시인이 필요했고, 저기 달에게 말한번 건네줄 이가 가까이 있으면 했다. 가까이 함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이 이렇게 몸의 유격에서야만 발견해내는 어리석음에 곡한다. 해가 많은 도시.섬으로 돌아서는 노을에 비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