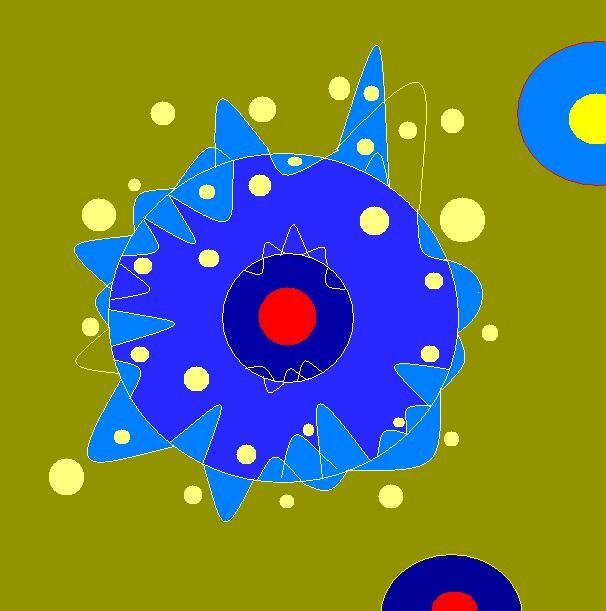071028 시민독서프로젝트(作)
071028 시민독서프로젝트(作)
>> 접힌 부분 펼치기 >>
|
필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엄마’ 하면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따뜻한, 푸근한, 부드러운, 안기고 싶은, 편안한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지만 잔소리, 쌀쌀맞은, 불편한, 차가운, 무서운, 신경질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원망스런,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멀리 도망가고 싶은 등 아주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필자는 엄마가 다 같은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엄마’라는 같은 말로 불리기는 하지만 우리들 마음 하나하나에 새겨진 엄마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자신도 모르게 저 사람의 엄마와 나의 엄마가 똑같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엄마가 화제의 중심이 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물어보세요. 말하는 이에게 엄마가 어떤 분인지, 엄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엄마에 대하여 어떤 개인적인 의미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앞의 예화에서 광대가 공주에게 하듯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겼고 우리의 경험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같은 낱말을 쓰더라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우리가 모두 같은 것처럼 ‘나’로 미루어 ‘너’를 다 알 수 있다는 듯 아는 체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 우리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온갖 오해와 갈등이 싹트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쓰는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에 에너지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사람들이 전개하는 논리에는 나름대로의 개성이 들어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이 다를 뿐 아니라 경험하며 성장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를 진행하는 방식에 커다란 개인차가 나타납니다. 사실이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상하고 생뚱맞게 여깁니다. 앞에 이야기한 낱말과 상황이 똑같지요?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하게 생각할 거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정이 사실상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부터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면 상대방이 전개하는 논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서로 같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상대방이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스럽게 여겨지고 그를 자신과 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 ‘억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공감적 이해와 사뭇 다릅니다. 공감적 이해는 ‘나와 같아지라’고 상대방을 몰아가지 않고 상대방이 전개하는 논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충실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박성희 [공감] 책소개에서 땀]
|
<< 펼친 부분 접기 <<

1. [엄마와 나]의 세미나에 앞서 '혹시' 하는 느낌이 든다. 나눌 이야기나 까칠함을 나누는 독서 모임상 전제를 건드린 전력이 있어 왔다는 점. [엄마와 나]에 빠져들고나서는 다른 관계나 관점으로 사라져버린다. 개인적 경험이 온전히 그 안을 휘젓고 다니게 마련이다. 혼자 읽기를 떠나 함께 읽게 되면서 느끼는 점의 요지는 접힌 글처럼 홀로관점의 흔들림이다.
2. 아빠와 나도 아니고, 아버지와 나도 아니고, 왜 엄마와 나여야할까?라는 물음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함께 읽는 초입,부터 제기되는 문제는 오로지 책속의 [엄마와 나]의 바깥을 볼 것을 요구한다. 가정에 가족에, 혈연의 끈에 함몰되지 않는 딱딱한 무엇도 놓치지 말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싶다.
3. 함께 읽는 독서 기획의 생각씨는 지역 사회단체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그 노력들이 모여 그나마 제도권?의 공간으로 스며들고 공명하게 된 것. 기획의 마음줄기가 지금까지 온전히 이어지는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일전 시민지식네트워크라는 연결망으로 서울 수유너머를 중심으로 [부서진 미래] [KTX..], 비정규직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독서를 시작한 바 있다.(먼댓글 참조) 개인적인 참여경험도 있구. 하지만 생각이나 마음들이 그곳으로부터 자라지 않음. 문제제기의 심오함의 연유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다. 일회의 파고가 아니라 잔잔하지만 여파가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들 말이다. 흔들리거나 자란 마음들이 뭉쳐지지 못하는 싸락눈같은 상황들. 뭉글뭉글해지거나 아직 그렇게 마음들이 따듯해지지는 않은 상태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지만 말이다.
4. 책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다. 있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도 은연중에 저어했던 것, 하는 것은 아닐까?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대로 드러내고 나누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읽는 대상들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는 것이 우리는 아니였을까? 이런 속내를 들었다. 동화읽는 어른모임, 도서관운동하시는 분들의 내공도 섞여있다고 한다.
5. (2)의 이런 선밖의 전제, 서로 다른 가족사를 염두에 두고, 가족으로 품을 수 없는 다른 제도와 문제를 안고 저자의 시선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일차 함께 읽고 나눈 소회이다. 이차 모임이 있다면 또 다른 관점이 녹아날 것이다. 한편 다른 생각을 해본다. 이 사회는 어쩌면 [때문에]를 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엄마때문에, 아빠때문에, 잘되지 않은 것에 누구탓을 많이 한다. 부모를 잘못만나서 이거나, 시류에 회자되는 조부모의 재력까지 아이키우기에 동원령을 내리는 세상을 보면, 그 탓에 너무도 익숙하게 만든다. 그것이 불화로 커지고 트라우마로 자라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서로 짓누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엄마가 아니라 우리의 아빠가 아니라 늘 내아빠 내엄마만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손짓을 홀로서거나 함께서는 나와 너가 아니라 늘 너때문이라고 손가락질 해왔던 것은 아닐까 싶다.
6. 책을 읽다보면 따듯한 가정, 따듯한 엄마,아빠를 압박하며 살아지게 만드는 사회 속에, 엄마, 아빠를 가슴에 따듯하게 품어보자는 것이 저자의 평화의 마음은 아닐까 싶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로서 그 숱한 덫과 트라우마을 따듯하게 품어 넘을 수는 없는 것일까? 책 속에 행간을 보며 아픔과 슬픔을 가져온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상처를 서로 보듬고 어루만지지 못할 때, 또 다른 시선을 길러내지 못하면 그 역시 함께하는 독서의 의미는 퇴화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의 책, 하나의 달을 보며 비추는 만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다면 그래도 이 한밭은 그래도 따듯하지 않을까 싶다. 081211 아*** 책방 아홉분의 만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