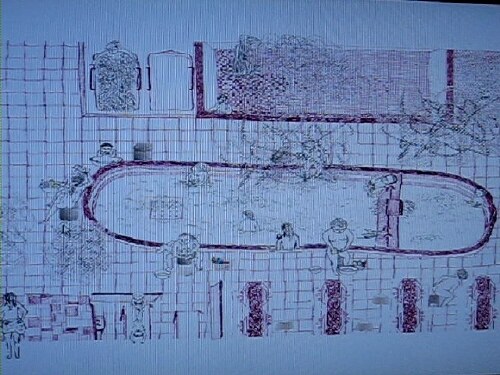인근 미술관, 1시간 남짓한 여유, 늦은 아침으로 제법 허기가 느껴진다. 혼자 배를 채우기도 겸연쩍다. 인상에 남는 세편, <젊은 작가 5인전> 끝물이다. 혼자와서 물끄러미 보는 눈총은 이내 사라진다. 몸이 환기를 느끼기도 하고 혼자인들 어떠랴(청승~..)
1.
 인상에 남는 마지막은 비누를 만들어서 휑하니 마당에 깔아놓았다. 이거이~ 무슨. 작품이라구. 벽을 따라 일직선으로 배열해놓은 비누 하나하나를 보니 각인되어 있다.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대충 헤게모니라는 것은 무엇무엇이다. 하지만 헤게모니가 겨우존재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없을까~ 라는 내용인 것 같다. ( 전단지에라도 있겠지 했는데 내용은 없다. )
인상에 남는 마지막은 비누를 만들어서 휑하니 마당에 깔아놓았다. 이거이~ 무슨. 작품이라구. 벽을 따라 일직선으로 배열해놓은 비누 하나하나를 보니 각인되어 있다.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대충 헤게모니라는 것은 무엇무엇이다. 하지만 헤게모니가 겨우존재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없을까~ 라는 내용인 것 같다. ( 전단지에라도 있겠지 했는데 내용은 없다. )
그리고 시선을 옮겨 본 마당에 늘어선 비누조각, 말캉한 벽돌같기도 하다. 그 나뭇잎새같은 비누조각에 겨우존재하는 것들이 새겨져 있다. 빠져나오는 벽면을 따라 어디어디서 얻은 발에 차이는 가을 나뭇잎새들이 편액을 따라 걸려있다.
2.
다른 하나, 동양화 화폭에 환등기가 비추인다. 태안가는 길. 새들이 날아다니고 버스와 승용차가 비켜서고 나무들이 비쭉삐죽 움직인다. 점점 곱고 정교해질 듯,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출입구 첫번째 작품이다. 짐짓 자화상의 세시선을 하나에 모았다. 거울에 겹치듯 인물화가 모두 그러하다. 그리고 말미 빠져나갈쯤 세시선을 하나로 모은 자화상이 정리할 겸 서있는 듯하다.
하나의 시선, 하나의 화폭만 고집하는 일상은 아닐까?
3.
6 개의 공간-둘러 나가면 끝이다. 6개의 공간은 분절되어 있다. 6개의 시간은 나눠져 있다. 공간과 시간은 분리되어 있다. 하나의 시간-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옷만 옷걸이에 걸려있다. 몇걸음 옮긴 뒤, 벽화가 움직이고 있다. 다음 몇걸음 뒤, 그 벽화가 다음 공간의 프리젠테이션 화면이란 것을 눈치챈다. 다음-다음, 첫 공간의 옷걸이의 옷이 인어의 옷이란 것을, 퍼덕거리는 ... ...
시간과 공간을 쪼개어 보는, 쪼개어 즐기는 우리에게 무수한 공간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공간을 잇는 시간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듯. 끊임없는 반복과 퇴행을 계속한다. 새로운 듯 하지만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이다. 그것을 시간에 꿰어 나눌 수 있다면, 끊임없이 소진하기만 하는, 소멸하는 파도가 아니라 새로운 일에, 새로운 시험의 결과로 일상을 나눈다면 시공간의 씨앗은 만들어 질 수 있을까?
071121-080217 대전시립미술관, 박용선-박영선-이준호-이인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