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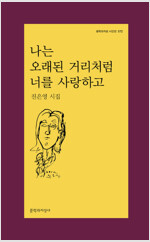





볕뉘.
긴 작업의 끝. 무진, 무진장 더운 여름의 끝에서야 작업의 말미가 보인다. 뭉게구름을 그리다나니 뭉게구름과 먹구름이 번갈아 하늘을 메우는 나날이기도 하다. 어느 순간 작업이란 터널에 갇혀 깊숙히 깊이 볕이 보이지조차 않는 여름을 헤메인다. 불쑥불쑥 나날이 마친 작업분들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악어처럼 입을 벌리고 문다. 그렇게 '사부작'이란 단어조차 모르던 길을 지나, 사부작사부작 하루를 채운다. 하루하루 무엇인가 그리며 바위를 올린다. 끝인 줄 알았지만, 그저 한 고개만 넘었을 뿐이다. 그러던 터널에도 볕이 든다. 밀리던 몸은 이제서야 일 앞으로 몸을 숙인다. 물려 통증에 시달리던 새벽도, 소풍가는 날처럼 설렌다. 그랬다. 말미는
오랜 고요의 끝에 바닷가 작은 서점을 들러 시집을 한보따리 싼다. 며칠이면 읽을 줄 알던 그 시의 집들이, 아니 좋아하는 시인들의 등대는 여전히 깜박깜박 빛을 비추인다. 흩어진 삶들의 항해를 먼 시선으로 품는다.
참고 읽는 시인들은 여전하다. 웅숭깊은 맛은 여전하다. 조금씩 조금씩 낯선 항해의 끝을 음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