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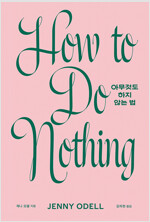

-1.
부대육개계장이라, 허기를 메우는 것인지. 채우는 것인지. 아쉬움을 밀려오는 식사 뒤에 책 읽을 곳을 찾기 위해 미니벨로로 여기저기를 달린다. 단골카페엔 단골이 없고, 책을 읽기엔 의자가 너무 불편하고, 조금 푹신하거나 넓은 책들이 보초를 서있는 곳에 자리를 잡다. 밖은 벌써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데, 루프탑을 가볼까. 들어선 넓은 공간에 구슬조명이 반짝인다. 하늘은 왜 감청색일까. 찍히는 하늘과 보는 하늘의 간극을 보정하려 색을 올려본다. 맨 눈위로. 파랑을 많이 넣어보니 밤하늘이 몹시 아름답다 싶다.
0. 문을 활짝 열어두어 방안의 열기를 식히고 싶었다. 새벽 건너 방 안 온도는 30도를 가르킨다. 겨우 2도가 떨어졌을 뿐, 외기가 쉽게 방안으로 스며들지 못한다. 여태껏. 흐린 날씨도 소용이 없구나.
1.
이른 새벽 등을 켜고 책을 읽다. <너는 너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 카프카 단편이 지나가고, 불구하고-실존주의자 시오랑을 거쳐, 비트겐슈타인이다. 배경음은 니체로 깔고 간다. 읽히지 않는 부분을 잡아내는 재주. 비트겐슈타인을 자기수련의 모습으로 읽은 이가 과연 있을까. 놀랍다. 그래서 레드컵라면에 끓는 물을 부었다. 면발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알싸한게 좀 나아졌구나. 그 뒤에는 푸코가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다시 보게 될지 기대하고 있다.
2.
다행히 비가 오지 않고 흐리고 바람이 부는 날씨다. 가을이 불쑥 들어온 느낌이 나는 날. 아침 쪽잠을 자고 페달을 밟는다. 뭐라고 말할까. 읽은 책들 가운데 맴맴 여운이 도는 인물. 책이 있다. 이하루라는 감독인데, 고병권선생이 서문을 쓰고, 읽기의 집에서 저자와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까지 아는 인물.
<<사회 적응 거부 선언>> 바틀비처럼 계속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아류가 아니다. 히치 하이커, 대형마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나누는, 가축에게 한 명 한 명이라 존칭을 붙이는....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기를 뜬 활동가와 영상감독으로 돌아온? 작가. 여러 수식이 아니라, 육식의 난폭함을 우물우물거리게 되는 작가. 그의 책을 안창살과 채끝살을 먹으면서 소개를 하다니.
생선이 아니라, 물고기에게 살아있는 눈을 그리고 싶은 충동. 수조 밖을 탈출하는 방어의 눈을 본 순간. 어쩌지 못하는.
2.1 그래 이런 심경이다. 책을 읽고서 다시 보기 겁나는. 랭보는 더 이상 시를 쓰기를 멈추고 세상으로 대면했다. 장 주네는 또 다른 삶들을 의도적으로 살아낸다.
2.2 어떻게 읽힐 지 잘 모르겠다. 돌아온 이하루아는 인물에게는 많은 삶들이 여전히 퍼덕퍼덕거리고 있다. 아빠도 엄마도 여럿. 친구도 늘 생동한다.
2.3 그래 그가 그녀가 시를 끊고 아프리카로 간 랭보가 돌아온 지 모르겠다. 우리의 눈은 늘 거대하고 뭔가 있는 태그. 꼬리표. 간판을 찾으니 정녕 보일까 싶다.
3.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법>>은 페터 슬로터다이크의 '인간공학'의 현재 버전으로 읽어도 될 듯 싶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책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