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독서들에 대한 간략한 기록

009. 에이프릴 마치의 사랑
이장욱의 소설을 좋아한다. 전작인 <기린이 아닌 모든 것>도 무척 흥미로웠는데, 이 책 역시 흥미로운 소설들로 가득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건 이장욱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상상해냈지? 싶을 정도로 '새로운데 리얼한' 인물들이 잔뜩 등장한다. 표제작인 에이프릴 마치의 사랑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알라딘에서 책 사고 받은 머그에 카누를 털어넣는 사람이 나온다. 구체적이고도 신선한 인물,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 읽는 재미가 가득하다. 나는 이미 그의 다음 소설을 기다리고 있다.

010. 디스옥타비아
2월에 소개했던 <깨끗한 존경>을 읽고, 가장 먼저 구매한 유진목의 책이다. 제목만 보고 옥타비아 버틀러와의 연관성이 궁금했는데, 책 소개를 보니 옥타비아 버틀러가 'SF 속에서, 당신은 상상 가능한 곳으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고, 이 책은 그 말에서 영감을 받아, 스스로를 미래 세계에 데려다 놓은 설정이다. 이것은 에세이인가 소설인가 싶을 정도로 소설적 설정이지만, 소설 속 화자와 작가를 떼어 놓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가끔 생각한다. 미래세계에서 현재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미개할까. 우리가 20~30년 전의 과거를 그렇게 생각하듯. 나는 미래 관점에서, 미개한 관점을 살아가고 있지만, (작가의 말처럼) 먼 훗날, 사무치게 그리워할 어떤 눈부신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구나... 생각도 했다. 사유로 가득한 작가의 문장들이 곧 나의 사유로 이어지는 책이어서 좋았다.

011. 브랜드, 짓다
내게는 네이밍이 최고 어려운 과제다. 자식 이름 짓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서 한참을 고민하고 헤맸는데 (잘 지은 것 같지만!) 이런 일을 뚝딱 뚝딱 해내는 사람의 이야기가 신기하지 않을 리 없다. 브랜드 이름을 짓고, 콘셉트를 구성하는 사람을 브랜드 버벌리스트라고 한다는데 이 책의 저자인 인터브랜드의 민은정 전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브랜드 버벌리스트라고 한다. 들어보니 그럴만도 하다. 티오피, 카누, 타라, 서울스퀘어, 뮤지엄산, 아난티 등의 익숙하고 멋진 이름들이 다 그녀를 통해 태어났다고 한다. 콘셉트 잡는 법을 나도 알고 싶어 샀지만, 그저 이 책의 브랜딩 이야기에 홀려 홍차 '타라'를 구매햇고, '뮤지엄산'을 언젠가 가봐야 할 곳 리스트에 넣어두었을 뿐이다. 아무래도 네이밍에는 확실히 재능이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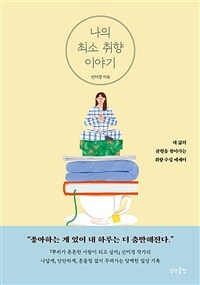
012. 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
꾸준히 찾아 읽는 신미경 작가님의 책이다. 최소한의 규모로 꾸려가는 정갈한 삶. 나도 혼자 살았으면 많이 벤치마킹해봤을텐데, 이미 내 삶은 너무 무거워져버렸다. 가진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아져버린. 그럴 수록 이런 책들을 읽으며 조금씩 단정함과 정갈함을 추구해본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가능한 만큼만.

013. 나답게 살고 있습니다.
마쓰다미리 시리즈는 사실 좀 흥미가 떨어졌는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궁금한 마음에 사봤고, 생각보다 좋았다. (근데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네? ㅎㅎㅎㅎㅎ) 노후 문제,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에 대한 마음 등 마흔의 이슈들을 같이 늙어가는 수짱의 삶을 통해 보다가 어떤 지점에서는 또 울컥하게 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서점 남자 (이름 생각 안남) 와 다시 나와서 설레었는데, 와 유부남이다. ㄷㄷㄷ 멀쩡한 놈인 줄 알았는데 대체 왜 유부남이 찝적대는거냐... -_- 언니 그 남자랑 만나지 마요. 설레지마요. 할 뻔했네. -_- 이건 마스다미리가 너무했음...아무리 마흔이라도 이런 설정 너무한 거 아니냐고 -_-

014.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서울대에서 가장 인기라는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한 법의학자이자 교수인 유성호 저자의 책. 앞쪽에는 저자가 겪은 법의학 관련 사례들이, 뒤쪽에는 그토록 많은 죽음(시체)을 경험한 저자의 죽음에 대한 생각, 윤리적 자세나 인식에 대한 것들이 쓰여져 있다. 특히 흔히 이슈가 되는 연명 의료에 대한 생각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예산의 10~12%가 삶의 마지막 1년 동안 쓰인다는 점은 무척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그 중 마지막 한 달이 5% 이상이라고 한다.) 삶의 마지막을 유지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비용을 보니, 나 역시 나의 죽음에 대해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됐다. 책 말미에 소개된 그레이스 리의 장례식이 무척 인상적이다. (그녀의 유언에 따름) 국화 대신 붉은 장미를, 그리고 와인을 준비하고, 슬픈 음악 대신 탱고 음악이 흘러나오던 장례식, 그리고 다들 "그레이스 리는 멋진 여성이었어."라고 말하며, 와인을 마시고 탱고를 추던 장례식. 내가 죽을 때쯤은 이런 문화도 많아지려나.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미래에 대한 여러 상상을 하게 된 책이었다.

015. 너의 거기는 작고 나의 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김민정의 시어가 엄청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랄까. 날 것은 날 것인데 숙성된 날 것의 느낌이랄까. 시어와 말맛이 너무 좋고, 읽는 즐거움이 가득했던 책이었다. 시와 에세이의 경계는 어디쯤에 누가 긋는 것일까 생각이 드는 시들도 여럿 있었지만, 형태가 시이건 에세이이건, 읽는 사람은 즐거우면 그만. 그럼에도 제목은 좀 너무 노린 것 아니냐며...(물론 성공한 것 같지만)
* 대체 몇 달이 지나서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3월의 책들도 정리 끝 : ) 4월도 얼른 정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