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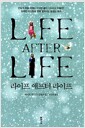
-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
케이트 앳킨슨 지음, 임정희 옮김 / 문학사상사 / 2014년 11월
평점 : 


반복되어 수정되는 그녀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걸까, 생각하다
16살의 어슐라가 하위에게 강간당한 후 그녀의 삶을 보며 마침내 케이트의 의도를 알았다.
더럽혀진 여자가 되어 남은 삶이 모두 엉망이 되는걸
다시 처음부터 살아야지. 그래서 다음 삶에서는 지뢰같은 위험들을 피해야지.
20세기초. 근대의 영국.
새로운 여성들이 중세의 높은 담벼락을 넘는 시기
그러나 더럽혀진 것 만으로 그녀의 남은 인생은 많은 가능성이 강제로 포기되고
활력있는 모든 시도는 그녀의 것이 될 수 없는 우울하고 뻔한 스토리
다른 삶을 처음부터 시작할 기회가 없는 모든 여성들의 고통이 생생하다.
일층의 공동욕실에는 늘 에나멜 양동이가 놓여있는데, 그 안에는 악취나는 아기 기저귀가 물에 담긴 채 애플야드 부인의 2구 레인지 위에서 삶기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주로 양배추가 담긴 냄비가 끓고 있었는데, 두 가지를 늘 함께 삶다보니 부인한테는 오래된 채소와 눅눅한 빨래 냄새가 흐릿하게 배어 있었다. 어슐라는 그 냄새를 알았다. 가난의 냄새였다.
십대에 그녀가 강간당한 순간 그녀는 남은 삶을 즐기며 살수 있는 모든 권한을 빼았긴 더럽혀지 여자가 된다.
가족들의 수치인 그녀는 행복해서는 안돼었고 마침내 찌질한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
다시 태어나 십대에 강간의 위기를 넘긴 그녀는 자의식 강한 독신여성이라는 신종 인류의 대열에 합류하여
유능한 남성의 정부가 된다.
이런 스토리가 너무 익숙해서 놀랐다.
강간당하거나 정부이거나.
자의식강한 남성이 성공한 여자의 정부가 되는 스토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도리스 레싱이 비슷한 시기 사회주의자 엘리트 여성의 예민한 삶을 정신분석하듯이 보여주더니
앳킨슨은 훨씬 평범한 여성들의 우연같지만 필연적인 삶을 보여준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로 살며 행복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여성이 못나서가 아니라 여성을 못나게 내몰아버리는 사회가 참 재수없다고
"오빠가 날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줄 알았는데. 파시스트가 아니라."
어슐라는 뿌루퉁하게 말했다.
이 문장을 읽고 깜짝 놀랐다.
어머나.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적어도 공산주의자와 파시스트를 구분하는구나.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와 파시스트와 빨갱이와 김일성과 주체사상과 노동조합을 구분하지 않는다.
저 모든것을 같은 것으로 공격한다.
적어도 공산주의자와 파시스트 정도는 구분할 줄 하는 보수주의자가 대한민국에도 있기는 있는가 싶네.
랠프는 벡스힐 출신으로 약산 냉소적이고 좌익에다 유토피아적이었다. ("사회주의자는 모두 유토피아적이지 않아?" 파멜라가 말했다.)
공사주의자와 파시스트를 구분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유토피아적이라고 평가하는 영국이 나는 부럽다.
적어도 빨갱이라는 한단어로 마녀사냥 하듯이 덤비지는 않으니까.
앳킨슨이 반복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어슐라를 통해 20세기초 영국에서 사는 모든 여자들의 삶을 보여준다.
성차별과 전쟁, 사랑과 배신, 가난과 폭격
흥미로운 설정이지만 뒤로 갈수록 지루하다.
모든 삶을 보여주는 것보다 대표적인 몇가지를 좀 줄였더라면 더 집줄하기 좋고
줄어든 주변인물들도 더 집중해서 개성을 살려 풍부한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모든 삶을 줄거리처럼 보여주니까 반복될 수록 재미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