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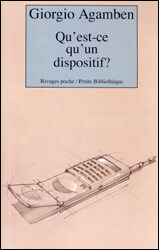
▷ Giorgio Agamben, Che cos'è un dispositivo?, Roma: Nottetempo, 2006.
▷ Giorgio Agamben, Qu'est-ce qu'un dispositif?(traduit par Martin Rueff),
Paris: Payot & Rivages, 2007.
1) 장치(dispositif)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2006년에 처음으로 던진 질문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 1970년대에 이미 푸코(Foucault)가 먼저 제기하였고, 따라서 또한 먼저 대답해야 했던 질문이었다. "당신의 이론에서 '장치'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푸코는 이미 다양한 '정의(definition)'의 방식들로 답한 바 있지만, 아감벤은 오늘날 이 질문을 다시금 새롭게 제기한다. 이 글은 아감벤의 논의를 따라서, 그리고 또한 푸코와 들뢰즈(Deleuze)가 먼저 내놓은 길을 되짚어보면서, '장치'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재독(再讀)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내가 읽은 아감벤의 책은 불어 번역본인데, 아직 이탈리아어 판본은 제대로 검토해보지 못했다. 따라서 원문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감벤의 논의가 일차적으로 푸코의 '장치' 개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어본을 중심 텍스트로 잡아 독해해 나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일독을 권한다. 현재 아감벤의 책들이 몇 권 번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 책은 짧은 분량이기에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국역본이 나왔으면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책들 중의 하나.
2) 먼저 아감벤은 1절에서 '장치'에 대한 푸코의 정의를 다소 길게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한 아감벤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장치'란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ㅡ제도, 기구, 법, 치안, 철학적 입장 등 담론적이거나 담론적이지 않은 거의 모든 것ㅡ의 집합이며, 이것이 '장치'의 첫 번째 정의를 이룬다. 그리고 '장치'란 언제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기능을 지니며 권력 관계 안에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또한 '장치'는 그러한 권력의 관계와 지식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어떤 교차점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어 2절에서 아감벤은 특히 '헤겔(Hegel)-이폴리트(Hyppolite)-푸코'의 삼자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폴리트는 '청년' 헤겔이 도입했던 실증성(Positivität/positivité)을 헤겔의 역사철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실증성(positivité)이라는 용어는 장치(dispositif)라는 용어와 같은 어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푸코의 저 『지식의 고고학(L'archéologie du savoir)』의 핵심 범주를 이루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감벤이 보기에 푸코의 실증성과 헤겔의 실증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푸코가 주체화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규칙들 사이의 화해를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헤겔은 바로 그러한 화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일전에 나 역시나 '헤겔의 자리에 선 푸코' 혹은 '비변증법적 변증법'에 대해서 짧게나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http://blog.aladin.co.kr/sinthome/1770074), 칸트와 헤겔의 볕과 그늘, 그 안팎을 횡단하는 푸코에 대해서는 아감벤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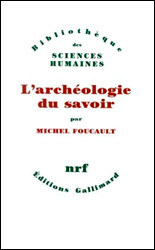
▷ Michel Foucault, L'archéologie du savoir,
Paris: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s sciences humaines"), 1969.
3) 장치 개념은 '보편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와 관계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보편적인 것의 범주 그 자체를 대체하고 치환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3절에서 제기된 '어원'에 관한 물음은 바로 4절에서 희랍어 'oikonomia' 개념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 이러한 분석이 '장치'라는 개념의 파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아감벤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이 '오이코노미아'의 개념은 기독교 성립의 핵심적 개념 중의 하나인 '삼위일체'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서,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의 실체인 신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습을 띨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 속에서 이 '오이코노미아'의 개념이 재-전유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이코노미아'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적 도그마의 성립을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장치가 신이라는 '하나의' 실체 안에서 존재와 행위를 분리해내는, 곧 존재론과 실천론을 분리해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감벤이 보기에, 이러한 분리는 곧 '오이코노미아' 개념의 재-전유가 서구 문화 안에 불러일으킨 하나의 분열증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번역'의 층위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나는 문제는ㅡ이어 5절을 통해서 상세히 논파되고 있는바ㅡ,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바로 이 희랍어 'oikonomia'의 개념을 다시 라틴어 'dispositio'로 옮겼다는 사실에 있다. 이 라틴어 개념ㅡ그리고 그 '번역'ㅡ이 가져온 것은 존재와 실천, 자연(본질)과 작용을 가르는 어떤 하나의 균열이다. 여기서 작용이란 곧 피조물들의 세상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신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치의 개념은 언제나 주체화(subjectivation)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며ㅡ아감벤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 역시나 그의 어원 분석을 '패러디'해서 말해보자면ㅡ, 여기서 우리는 또한 'subjectivation'이 항상 'sub-jectivation'으로 '분절'될 수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 미리 앞서ㅡ하지만 시기상으로는 '선행(先行)하는'ㅡ들뢰즈의 논의를 차용하자면, 바로 이러한 '주체화'는 고고학적 분석의 대상인 지층들(strates)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지층들을 초과하여 감행하는 도주의 선(ligne de fuite), 그것을 위한 조건이기도 한 것.
4) 아감벤은 6절에서 이러한 분리 혹은 균열의 결과로 제기되는 두 개의 대립적 개념들, 곧 살아 있는 존재자들(실체들)과 그들을 포획하는 장치들을 설정하고 있다. 그가 푸코적 '장치'의 '사례'들을 확장하면서 첨가하고 있는 '현대적' 예시들의 범위는 글쓰기와 문학으로부터 담배와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이 대목에서 불역본의 표지에 왜 휴대전화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약간의 허탈함이 동반된다). 이러한 장치와 살아 있는 존재 사이의 구분, 바로 그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 주체이다. 아감벤은 바로 이러한 '생체'와 '장치' 사이의 관계가 빚어낸 결과로서 주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들을 통한 아감벤의 진단은 곧,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한한 장치의 발전에는 또한 그와 같은 정도로 무한한 주체화의 과정들이 대응하고 있다는 것. 이어 7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치의 '불가피성', 곧 장치로부터의 이탈이라는 문제가 지닌 어려움이다. 이에 아감벤이 8절을 통해 진입하고 있는 곳은 일종의 모스(Mauss)-바타이유(Bataille)적인 이론 지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여기서 첨예한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성스러움(le sacré)의 개념과 대립하는 신성모독/세속화(profanation)의 문제이다. 곧, 장치의 개념은 일종의 희생제의(sacrifice)로 이해되며, 따라서 신성모독/세속화는 그러한 희생제의가 분리하고 구분해놓은 것을 다시금 공동의 사용을 위해 복원하고 재구성하는 역(逆)-장치(contre-dispositif)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아감벤은 '탈주체화(désubjectivation)'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어떤 실제적인 주체화도 수반하지 않는 이러한 탈주체화의 정치적 '부작용'들에 대한 아감벤의 비판으로부터 우파도 좌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장치의 광범위한 일반화는 혁명의 요소와 조건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ㅡ우리가 'oikonomia' 개념과 그 번역어로서의 'dispositio' 개념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듯이ㅡ오히려 묵시록적 혼돈을 동반하는 일종의 유사-신학적 체제에 근접하고 있다. 개인적인 견지에서 볼 때, 아감벤의 이러한 접근법은ㅡ또한 개인적으로 이미 그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를 통해 확인했던 것이지만ㅡ바타이유적 '정치학'이 내놓은 여러 물길들 중의 한 계보를 잘 정식화해주고 있다는 느낌이다(『호모 사케르』에 대한 글은 차후에 다른 자리를 통해 시도해보기로 하겠다).



▷ Gilles Deleuze, Deux régimes de fous. Textes et entretiens 1975-1995,
Paris: Minuit(coll. "Paradoxe"), 2003.
▷ 질 들뢰즈, 『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박정태 편역), 이학사, 2007.
▷ Gilles Deleuze, Foucault, Paris: Minuit(coll. "Critique"), 1986.
5) 앞서 아감벤이 푸코의 장치 개념이 지닌 직접적 특징을 '보편적인 것의 거부'라고 보았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러한 '푸코 해석'을 가장 먼저 피력하고 정교화한 공(功)은 아마도 들뢰즈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들뢰즈는 이미 푸코의 장치 개념에 대해서 아감벤과 같은 제목의 글(「장치란 무엇인가(Qu'est-ce qu'un dispositif)?」)을 남긴 바 있다(아마도 아감벤의 저 제목은 바로 이 들뢰즈의 제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인하고 있는 것일 터). 이 글은 들뢰즈 사후에 출간된 두 번째 저작/대담집(2003년)에 다시 수록되었는데, 박정태 편역의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에도 국역되어 실려 있다(박정태 편역 책의 표지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 철학자들의 그림 중에서 플라톤과 헤겔의 그림만이 거꾸로 뒤집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내가 '거꾸로 뒤집힌' 바젤리츠의 그림들이 지닌 '어떤 의미'를 언급한 일전의 글에 비추어 볼 때(http://blog.aladin.co.kr/sinthome/1840680), 어쩌면 다분히 유치한 수준의 '뒤집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들뢰즈의 이 글은 푸코의 장치가 지닌 차원을 크게 가시성과 언표행위, 힘, 주체화로 정리하며 이러한 장치 개념의 도입이 산출하는 결과를 보편성과 영원성의 포기로 요약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푸코 이론이 지닌 '역사성'과 '현재성'을 각각 푸코의 저작과 인터뷰에 할당함으로써, 푸코의 저작과 이론적 기획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줌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의 인터뷰를 '읽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명쾌히 제시해줬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 일독과 재독을 권한다. 또한 이 글과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하는 글로서 「미셸 푸코의 주요 개념들에 대하여(Sur les principaux concepts de Michel Foucault)」를 꼽을 수 있을 텐데(또한 이 글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을 『푸코』 또한 '필독(必讀) 목록'에 함께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장치 개념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푸코 사상의 전체적 풍경을 아주 뛰어나게 정리하고 분석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 역시 위의 저작/대담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박정태 편역의 책에 국역되어 있기도 하다. 이 글은 비교적 가독성 있게 말끔히 번역되었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들도 눈에 띈다.


▷ Louis Hjelmslev, Prolégomènes à une théorie du langage,
Paris: Minuit(coll. "Arguments"), 1971.
▷ 루이 옐름슬레우, 『 랑가쥬 이론 서설 』(김용숙, 김혜련 옮김), 동문선, 2000.
6) 첫 번째 유의점은 옐름슬레우(Hjelmslev)의 언어학적 개념들과 관련된 '오역'이다.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지층들은 역사적 형성들이며, 따라서 지층들은 실증성이요 경험성이다. 지층들은 사물과 말, 보기와 말하기, 가시적인 것과 진술 가능한 것, 가시성의 구역과 독해 가능성의 장, 내용과 표현으로 형성된다. 우리는 이러한 용어들을 엘름슬레브로부터 빌려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거론되는 내용[가시적인 것]을 [언어학적] 기의와 혼동하지 않으며, 여기에서 거론되는 표현[진술 가능한 것]을 [언어학적] 기표와 혼동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러하다."(『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437쪽) 일단 '옐름슬레우'를 '엘름슬레브'로 표기한 것이 눈에 밟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단 넘어가기로 하자.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진한 글씨로 강조한 부분에 있는데, 먼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여기에서 거론되는"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자. 이 표현은 본래 원문에는 없는 구절이다(Deux régimes de fous, p.227 참조). 그렇다면 번역자는 왜 이 문장들을 번역하면서 이런 구절들을 첨가할 수밖에 없었을까? 많은 이들이 주지하다시피, 저 '내용(contenu)'과 '표현(expression)'이란 개념은 옐름슬레우가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 개념인 기의(signifié)와 기표(signifiant)를 '발전적으로' 대체한 개념의 짝이다. 내용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내용'은 '표현'과 마찬가지로 '형식(forme)'의 측면과 '실질(substance)'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내용의 형식/실질', '표현의 형식/실질'이라는 구분법은 옐름슬레우 언어학이 수행한 가장 뛰어난 분석 중 하나이다. 물론 역자가 친절히 '[ ]' 안에 부연해주고 있듯이, 들뢰즈의 이 글 안에서 '내용'과 '표현'이 각각 문맥적으로 '가시적인 것'과 '진술 가능한 것'에 연결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보다 구조적인 것이다. 들뢰즈의 논의 속에서 푸코가 옐름슬레우로부터 차용한 용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내용'과 '표현'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거론되는"이라는 '첨가된' 번역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어떤 특정한 내용'이 '가시적인 것'이라는 말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거론되는 어떤 특정한 표현'이 '진술 가능한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번역에서는 '내용'과 '표현'이라는 말이 옐름슬레우의 이론 체계에 속한 고유의 개념어가 아닌 단순한 '일반명사'처럼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문제는, 옐름슬레우를 따라서, '내용'을 단순한 '기의'와 구분해야 할 필요성, 또한 '표현'을 단순한 '기표'와 구분해야 할 필요성에 있는 것이다. 들뢰즈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일 터. 그렇게 본다면 내가 진한 글씨로 강조한 다른 부분, 곧 "이러한 용어들"이라는 번역이야말로 사실 이러한 '오역'에 대한 '최초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종류의 어떤 '착각' 때문에 역자는 "여기에서 거론되는"이라는 사족을 두 번씩이나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역자가 "이러한 용어들"이라고 옮긴 부분은 본래 원문에서 "이 마지막 용어들(ces derniers termes)", 곧 앞서 열거한 모든 개념의 짝들이 아니라 오직 그 열거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옐름슬레우적 개념들만을, 곧 '내용'과 '표현'이라는 개념의 짝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Deux régimes de fous, p.227 참조).



▷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édition critique par Tullio de Mauro), Paris: Payot & Rivages, 1972.
▷ Ferdinand de Saussure, Écrit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 philosophie"), 2002.
▷ 페르디낭 드 소쉬르, 『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옮김), 민음사, 1990.
7) 주지하다시피, 옐름슬레우가 내용의 형식/실질과 표현의 형식/실질이라는 구분법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소쉬르의 언어학 덕분이었다. 옐름슬레우도 직접 인용하고 있는바, 소쉬르는 『일반언어학 강의』 2부 4장에서 사고(pensée)와 음성(son)이라는 "두 가지 질서의 요소들이 결합하는 접경 지역(terrain limitrophe)"에 대한 학문이 바로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학임을 밝히고 있다(마우로 비평판, p.157). 곧 소쉬르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러한 [사고와 음성의] 결합은 실질이 아니라 형식을 생산한다(cette combinaison produit une forme, non une substance)"는 것(마우로 비평판, p.157). 옐름슬레우가 '내용'과 '표현'의 개념을 통해 보다 더 정치하고 첨예하게 정식화시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소쉬르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소쉬르의 『일반언어학 강의』 번역으로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위의 민음사 판본이 통용되어 왔으나, 이 국역본이야말로 '뭔가 부족한' 번역이 아닐 수 없다(옐름슬레우의 국역본 역시나 완벽한 번역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나 1972년에 나온 마우로 편집본의 주석들과 함께 어서 빨리 새롭게 번역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책이다(이런 소망을 품은 지도 정말 오래되었다는 느낌이지만, 사실 저 국역본이 1990년에 간행될 때만 해도 '일러두기'에서 마우로 주석본이 곧 번역되리라는 예고까지 있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번역의 '부족(不足)'과 '지각(遲刻)' 탓만을 해야 하는가). 더불어 시몽 부케(Simon Bouquet)와 루돌프 엥글러(Rudolf Engler)의 편집으로 2002년에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간행된 소쉬르의 수고집(Écrits de linguistique générale) 또한 일독을 요하는 책인데, 특히나 이 책은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많은 『일반언어학 강의』의 해석에 있어 여러 유용한 시사점들을 던져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책이다.
8) 「미셸 푸코의 주요 개념들에 대하여」의 국역을 읽을 때 두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외성(extériorité)'과 '내성(intériorité)'이라는 번역어들이다(예를 들어,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445쪽, 454쪽). 이와 더불어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는 바로 'immanence'의 번역어인 '내재성'일 터. 나의 일천한 독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extériorité'가 가끔씩 다른 책들에서 '외재성'으로 번역되곤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따라서 내게는 이러한 개념어들의 번역에 대한 일종의 '일괄적' 정리가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항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immanence'와 대립되는 개념은 당연히 'extériorité'가 아니라 'transcendance'이다. 곧 '내재[성]'의 대립어는 '초월[성]'인 것이다. 하지만 'extériorité'가 '외재성'으로 옮겨질 경우, 그것이 마치 '내재성'의 대립어로 여겨지게 되는 부당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의 편역자가 취하고 있는 '외성'과 '내성'이라는 번역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개인적인 기준ㅡ그리고 취향(?)ㅡ에서 볼 때, '외성'과 '내성'보다는 '외부성'과 '내부성'이라는 번역어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점만을 밝혀둔다(이러한 '개인적인' 선호의 이유들 중 한 가지를 '귀류법적'인 반문(反問)의 형식을 통해 밝혀보자면, 예를 들어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의 454쪽에서 역자는 'intériorisation'이라는 단어를 '내화'라는 번역어로 옮기고 있는데, 하지만 한국어의 '상용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그 반대어인 '외화'를 우리는 바로 저러한 '내화'의 대립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덧붙이자면, 이러한 번역어 '정리'의 문제는, 좁게는 레비나스(Levinas) 전공자들과 들뢰즈 전공자들 사이에서 모종의 '합의'를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ㅡ도대체 『전체와 무한(Totalité et infini)』의 국역본은 언제, 또 누가 내줄 것인가ㅡ, 또한 동시에 더 넓게는 '차이'와 '타자' 혹은 '내재'와 '초월'을 둘러싸고 서양 현대 철학의 전체 맥락 안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개념어들의 '한국적 전유'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후자의 문제가 전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은, 또한 후자의 문제가 이미 전자의 문제를 포함하고 해소하고 있음은, 불문가지(不問可知),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 Friedrich Nietzsche, Kritische Studienausgabe, Band 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88[2. Auflage].
▷ 프리드리히 니체, 『 아침놀(니체 전집 10권) 』(박찬국 옮김), 책세상, 2004.
▷ Michel Foucault, Dits et écrits. Tome 2: 1970-1975,
Paris: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s sciences humaines"), 1994.
9) 세 번째 유의점은 니체(Nietzsche)의 번역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는 어쩌면 '중역(重譯)에 의한 오역'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푸코가 인용한 니체의 문장(불어로 번역된 것)에 대한 들뢰즈의 재인용을 다시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잉여-번역'이 그것이다(아, 번역의 과정 안에서도 'G-W-G´'라는 자본의 일반 공식이 적용되고 있었음을!(Das Kapital, Band 1, p.170 참조)). 역자는 니체의 『아침놀(Morgenröthe)』에 나오는 저 유명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다: "우연의 나팔을 흔드는 필연성이라는 완강한 손(la main de fer de la nécessité qui secoue le cornet du hasard)."(『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455쪽) 이는 푸코가 자신의 글 「니체, 계보학, 역사(Nietzsche, la généalogie, l'histoire)」에서 인용하고 있는 니체 번역을 그대로 다시 인용한 것이다(이 글은 푸코의 『말과 글(Dits et écrits)』 2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는 독일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jene eisernen Hände der Nothwendigkeit, welche den Würfelbecher des Zufalls schütteln[...]"(KSA, Band 3, p.122(§130) 참조). 곧, 내가 진한 글씨로 강조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불어 번역은 독일어 "Würfelbecher"를 "cornet"로 옮긴 것인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를 다시 "나팔"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어 'Würfelbecher'는 '주사위를 넣고 흔들어 던지는 통'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불어 번역에서는 '[원뿔 형태의] 주머니' 또는 '[나팔 모양의] 통'이라는 뜻의 'cornet'라는 단어를 번역어로 채택한 것인데, '중역된'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불어 단어의 일차적인 뜻에 주목하여 이를 단순히 '나팔'로 옮기고 있는 형국이랄까. 참고로 박찬국의 국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다: "우연의 주사위 통을 흔드는 필연성의 저 철(鐵)로 된 손[...]"(덧붙이자면, 여기서 독일어 단어 'eisern'과 불어 단어 'de fer'가 지닌 의미의 범위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ㅡ곧 이 둘은 모두 일차적으로는 '철로 된', '쇠로 된'이라는 뜻을 갖고 이차적으로는 '무쇠 같은', '불굴의', '냉혹한' 등의 뜻을 갖는 단어들인데ㅡ옐름슬레우의 용어를 차용해보자면, 이 두 단어는 '내용의 형식'이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팔'과 '주사위 통'의 차이, 이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하고 반문할 이도 물론 있겠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니체의 저 '주사위 던지기' 개념의 함의와 중요성을 망각하고 지나갈 위험을 내포하는 국역이기에 다소 '부족한' 번역이라는 점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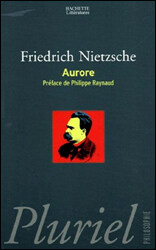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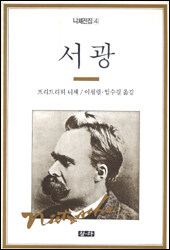
▷ Friedrich Nietzsche, Aurore(traduit par Henri Albert),
Paris: Hachette(coll. "Pluriel"), 2005.
▷ 프리드리히 니체, 『 서광(니체 전집 4권) 』(이필렬, 임수길 옮김), 청하, 1983.
10) 독일어와 불어와 한국어 사이의 번역이 빚어내는 어떤 '간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와 관련된 개인적인 소회를 하나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나는 책세상에서 새로 간행된 니체 전집 국역본이 'Morgenröthe'의 번역 제목으로 채택한 저 '아침놀'이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물론 이는 저 독일어의 '직역'에 가장 가깝긴 할 것이다). 예전에 청하에서 간행되었던 국역본은 그 번역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는 해도ㅡ그렇다고 해서 책세상 판본의 번역이 결코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ㅡ저 '서광'이라는 제목만큼은 니체의 사유가 선사하는 숨 가쁜 박력과 저돌적 힘을 잘 표현해줬던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불어 번역본은 이를 'aurore'라는 단어로 옮기고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의미에서 나의 개인적인 취향(?)에 부합하는 표제라는 고백 한 자락 남겨본다. 여담 삼아, 위에서 내가 문제 삼았던 부분을 청하 국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우연의 주사위 통을 흔드는 필연성의 저 쇠로 된 손[...]". 책세상 국역본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말 그대로 '한 끗 차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11) 「미셸 푸코의 주요 개념들에 대하여」의 국역 독해에 있어 네 번째로 유의할 점은, 일견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오역'들에 관한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짧은 언급만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다. 첫째, 'désir'를 모두 '욕망'이 아닌 '욕구'로 옮기고 있다는 점(『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457쪽 이하). 이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역자가 지닌 일종의 '신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 현재 '욕망'이라는 번역어가 지니고 있는 적절성과 상용도를 생각해볼 때, 이러한 '신념'이 앞으로도 계속 통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둘째, 'topologie'를 모두 '위상학'이 아닌 '유형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467, 469쪽). 이는 분명한 오역의 경우라고 하겠는데, 아마도 역자가 'topologie'를 'typologie'로 오독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낸다(특히나 역자가 「장치란 무엇인가?」의 번역에서는 'typologie'를 '유형학'으로 제대로 잘 번역하고 있음에야).


▷ Michel Foucault, Dits et écrits. Tome 3: 1976-1979,
Paris: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s sciences humaines"), 1994.
▷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2: l'usage des plaisirs,
Paris: Gallimard(coll. "Bibliothèque des histoires"), 1984.
12) 푸코에게 있어 '장치'란 무엇인가. 결국 나는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장치 개념의 검토에 있어서 무엇보다 푸코의 목소리, 그 육성 자체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가장 일차적인 인터뷰 텍스트는 바로 푸코의 『말과 글』 3권에 수록된 대담(pp.298-329)이다. 앞서 아감벤이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푸코의 '말'도 바로 이 텍스트에 속한 것이다. 아감벤이 인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싶은 푸코의 '말', 곧 장치에 관한 그의 여러 정의들 중 가장 주목하고 싶은 두 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장치라고 부르는 것이 에피스테메(épistémè)가 지닌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말해서, 에피스테메란, 담론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의 집합인 장치와는 다르게, 특별히 담론적인 의미에서의 장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말과 글』, 3권, pp.300-301, 번역: 람혼) 둘째, "거짓으로부터 참을 분리하는 일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규정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는 일,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장치입니다."(『말과 글』, 3권, p.301, 번역: 람혼) 이 두 가지 '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장치'의 개념은 푸코의 저 '에피스테메' 개념을 대체하고 또한 확장하고 있다는 것. 둘째, 그러나 또한, 들뢰즈가 이미 예리하게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장치'의 개념에 의해 가능하게 된, 주체화 과정에 대한 '후기' 푸코의 연구는 어떤 '단절'이나 '방향 전환'과는 거리가 먼 일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 아마도 이러한 두 가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푸코 개인의 이론적 발전사에서뿐만 아니라 보다 전체적인 사상사의 맥락에서 '장치' 개념을 사유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리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아감벤의 『장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독해를 통해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금 계획하게 되는 일은ㅡ이는 어떤 이에게는 일종의 '비약'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에게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ㅡ푸코의 저 『성의 역사』 2권, 곧 『쾌락의 활용』에 대한 재독(再讀)에 다름 아니다.
13) 개인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천착해 오고 있는 '사상사'라는 지평에서 생각해볼 때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점은, 아감벤과 랑시에르(Rancière), 그리고 '후기' 푸코가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어떤 '희랍적' 지향성이다. 예를 들자면, 아감벤의 'zōē'와 'bios' 사이의 구분, 랑시에르의 'logos', 'démos', 'politeia' 등에 관한 논의, 또는 푸코의 'enkrateia'와 'parrhêsia' 개념에 관한 연구 등등에서 포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내게는 매우 첨예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실제로 서양 철학사라는 '제도'가 지닌 일반적 의미 안에서 저 '희랍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적이고도 회고적인 태도가 언제 문제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겠느냐마는,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이러한 지향성의 '특수하고도 현대적인' 경우는 별도의 연구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이론적 지평이라는 생각이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그것은 곧 '감각적인 것의 분배'와 관계되는 문제이기에, 또한 바로 저 '장치'라는 개념과 직결되고 있는 문제이기에. 고래의 개념들과 그것이 낳은 분류법을 발굴, 검토하고 그로부터 어떤 새로운 의미와 분류법의 체계를 그려냄과 동시에 여러 가능한 실천의 지도들을 작성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사상사적' 문제가 아니었던가.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1: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