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 밖으로 동이 터 오는 책상 앞에서. 『에로스의 눈물』의 세 가지 판본들.
1)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국어'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읽기의 편집증. 나라는 인간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의 『에로스의 눈물(Les larmes d'Éros)』의 불어본(1판과 2판)과 영역본과 국역본을 동시에 펼쳐놓고 비교 독해하기. 이러한 병증(病症)은 사실 어떤 하나의 원칙,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발현되고 발설되고 있는 가장 개인적인 징후이자 증상의 장소일 터. 그 원칙과 이데올로기란 아마도, 불어와 영어와 '국어'가 만나 그 중간의 어디쯤에선가 '형성'되는, 형성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하나의 '진의(眞意)'에 대한 순진하리만치 '독실한' 믿음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프로이트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타협[절충] 형성(Kompromißbildung)'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도 벤야민(Benjamin)이 말했던 저 '순수 언어(die reine Sprache)'의 가장 철저한 신봉자, 지독히도 철저하고 처절한 일종의 '텍스트주의자'에 다름 아닐 것, 그런 것, 그런 곳으로, 몇 자락의 잡설들이, 흘러든다. 예를 들자면, 에스페란토(Esperanto)라는 '인공적' 언어의 창안자들에 대한 나의 오래 묵은 애틋한 심정 또한 저 '순수 언어'에 대한 '동병상련'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 그 공통의 병인(病因)이란 아마도 에스페란토의 '창안'이라는 움직임이 지닌 저 '형이상학적' 운동성 안에 있을 것. 말하자면 언어는, 나의 안과 밖에서, 다시금, 반복되고, 또한 매번 다르게, 반복된다. 이 원환(圓環)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은 소박한 '인류애'임과 동시에ㅡ이는,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표현을 차용하자면, '희망의 원리'일 것인가ㅡ그에 못지않은 하나의 거대한 '공포증'ㅡ말하자면, '대중들의/에 대한 공포'ㅡ일 것.



▷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and IV-1: Kleine Prosa. Baudelaire-Übertragung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1.
▷ Walter Benjamin, Selected Writings, Volume 1: 1913-1926,
Cambridge/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발터 벤야민, 『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1983.
2) 하나의 집착. 예를 들면, 벤야민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므로 번역(Übersetzung)은ㅡ아이러니컬하게도ㅡ원문을 적어도 보다 더 결정적인 언어의 영역으로 옮겨 심는(verpflanzt) 것이다. 왜냐하면 원문은 더 이상 이 이외의 그 어떤 중계(Übertragung)를 통해서도 옮겨질 수 없으며, 항상 오직 이러한 언어의 영역 안에서만 새롭고 다른 부분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독어판, p.15) 이를 일종의 '전도된' 낭만주의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어 벤야민은 이렇게 쓰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원문의 성립과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번역의 언어가 원문처럼 읽힌다는 것은 번역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문자 그대로의 번역에 의해 보장 받게 되는 충실한 번역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작업에서 언어의 보충(Sprachergänzung)에 대한 거대한 갈망(Sehnsucht)이 드러난다는 점이다."(독어판, p.18)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보충'으로서의 번역/중계, 곧 원문 전체에 대한 포괄이 아니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원문보다 더 '결정적인' 어떤 언어의 영역, 이식과 이행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착이란 내게는 '언어' 자체에 대한 신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교통(Verkehr)'에 대한 이론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이러한 집착이 내게 단순히 '아집'으로만 여겨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순수 언어는, 바로 그 순수 언어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에서,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므로 순수 언어란, 하나의 확고한 동일성으로서,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행과 이식의 행간에서, 언뜻, 순간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 터. 그런데 잡설의 범람이 여기까지 이르고 보면, 나의 '공간'이란, 그 이행의 순간들과 이식의 지점들을 포착하고자 하는, 무수히 헛되거나 헛되이 무수한, 그런 덩어리들이 비우고 있고 그런 틈새들이 채우고 있는 하나의 장소에 다름 아닐 터인데, 그렇다면 아마도 나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름 아님'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내 정원의 오래 된 이름, 'Anarchiv' 혹은 '襤魂齋'. 나는 가끔 이 정원의 이곳저곳에 물을 주지만, '잡초'를 솎아내지는 못한다. '잡초'따위는 없다고 하는 서투른 연민의 감정과 '시혜의식'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잡초'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설픈 '범신론(汎神論)' 때문이다.
3) 번역이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정의(definition/justice)'의 한 형식:
얼마 전에 이제이북스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완역본이 출간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물론 이 번역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왈가왈부 말들이 많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이제는 유달리 '도발적'일 것도 없을 하나의 테제는, 흔히 고전 번역의 '위태로운' 기반이라는 '위급한' 정세 진단과 맞물려서 자주 논의되곤 한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한국어] 그 자체로 읽힐 수 있는 번역본'의 [가슴 벅찬] 가능성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가능성'이란, '번역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에 대한 '가장 나은' 차선(次善)을 생각하는 사유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그러한 번역본의 가능성은 인문학을 향유하는 '대중'의 수효와 수요의 가능성에 곧 바로 연결되고 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훈고학(訓詁學)'이 아닌 다음에야 이러한 번역본의 존재 여부가 바로 '인문학의 위기'를 타파하는 열쇠 중의 하나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세계 시민'이라는 존재를 단순히 '조잡한 인류애의 총합'이 낳는 결과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다언어와 다문화에 대한 이해ㅡ그것도 단순히 '어설픈' 이해가 아니라 '농밀한' 이해ㅡ는 필수적이다못해 필요불가결하다고까지 할 사항일 것이다. 그렇다면 감히 말하건대, 우리 모두는 단순한 '향유자'가 아니라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적어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이라는 기준을 멋대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준은 흔히 '하향 평준화'되기 십상인데, 나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기존의 연구자 또는 번역자야말로 역설적으로 가장ㅡ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의미에서ㅡ'엘리트적'이고 '부르주아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개인적인 기준에서 볼 때, 외국어를 한국어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번역본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어로 된 번역본은 무엇보다 그것의 '원문'이 되는 외국어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야 한다. 내게 있어 좋은 번역본이란, 이런 '완벽한' [언어의] 타자를 계속 '환기'시킬 수 있는, 또한 심지어 그러한 유령의 출현을 '조장'할 수 있는 언어의 집합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결국 다시금 가르치기와 배우기가 그리는 어떤 나선형의 선으로 소급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바의, 또한 내가 원하는 바의 '순수 언어'일 것이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원전과 함께 읽을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이야말로 성마른 번역에 대한 변명이기는커녕 '최고의 차선'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한 가지 더 덧붙여, 최근 인터넷 공간 안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여러 '서평'들을 보고 있자면, 하나의 책을 채 다 읽지도 않고 다만 몇몇 부분의 오류에 대한 인상만을 가지고서 마치 그 책 전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처럼 덤벼드는 행태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그러므로 이 또한 '몇몇 부분에 대한 인상'이 지닌 편견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전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된 번역본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역설적이지만, 그 고전을 이루고 있는 타언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유발'하는, 따라서 번역본 그 자체로서는 어쩌면 '실격'일지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번역본을 통해서야 비로소 '완전히' 가능해진다, 라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번역본[과 그것에 수반되는 '타자'와 '유령']을 미련하리만치 또박또박 읽어나가는 끈질기고 진득한 '독해(讀解/毒解)'의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읽는다, 읽을 뿐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 형이상학 』(김진성 역주), 이제이북스, 2007.


▷ Aristotle, Metaphysics[Books I-IX](trans. by H. Tredennick),
Cambridge/Lodon: Harvard University Press(Loeb Classical Library), 1933.
▷ Aristotle, Metaphysics[Books X-XIV], Oeconomica, Magna Moralia
(trans. by H. Tredennick, G. C. Armstrong),
Cambridge/Lodon: Harvard University Press(Loeb Classical Library), 1935.


▷ 조대호 역해, 『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 문예출판사, 2004.
▷ Vasilis Politis, Aristotle and the Metaphysics,
London/New York: Routledge, 2004.
4) 소장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원본은 희랍어-영어 대역본으로, 193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Loeb 문고로 출간되었던 다소 오래 된 판본이다. 사실상 학부 졸업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거의 볼 기회가 없었는데, 조대호 선생의 역해본이 나왔던 2004년에 다시금 오랜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열정이 불타 올랐으나 그 뜨거움이 얼마 가지 못해 이내 사그라졌던 기억이 있다. 같은 해에 출간되었던 폴리티스(Politis)의 개설서 또한 읽을 만하다. 일독을 권한다. 올해 완역본의 출간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무기'를 탑재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하여, 함께 하는 일독을 권커니 잣거니.

▷ 단 한 순간으로서만 남은, 어느 저녁. 창문을 통해 넘어온 노을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그 노을의 조명을 받은 공간이 너무 아늑해서, 문득 사진 속에 담아본 나의 '고요한 전쟁터'. 이 사진을 찍자마자, 저 노을은, 거짓말처럼, 갑자기, 산등성이 너머로, 얄밉게 물러가더니,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결국 저 저녁도, 여느 저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단 한 순간만으로서만 남게 되었다. 나를 매료시키는, 저 헤겔적 특수성과 보편성(들).


5) LP를 듣는 시간, 감싸는 먼지들의 소음 속에서. 일종의 망중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준비'의 시간. 나는, 한 인간을 '아는' 척도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얼마나 서로 부대꼈는가, 얼마나 서로 살을 맞닿았는가, 라는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대답들, 차라리 또 다른 한 무더기의 질문들. 한 인간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이런저런 담화가 항상 경솔하게 느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시간'에 대한 물음과 믿음 때문이다. 그 시간이 커지고 깊어짐에 따라, 오히려 언어는 줄어들고 축소되기 마련이다. '이심전심', '불립문자'라고 완곡하고 범박하게 말해도 좋다. 어쨌든 그럴수록 언어는 침묵에 더욱 근접해간다. 견딜 수 없는 침묵ㅡ언어는 부재하고, 급기야는 실종된다ㅡ이 있는가 하면, 모든 말을 하는 침묵ㅡ연타(連打)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무(無), 곧 하나의 연속체(continuum)에 도달한다ㅡ도 있다. 앎을 포장한 언어들의 수다스러움, 마치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취약한 단어 몇 줌에 담을 수 있을 것처럼 구는 저 모든 규정의 몸짓들이, 지겹고도 두려우며, 천박하면서도 척박하며, 또한 시시하면서도 서럽다. 조도(照度)를 한껏 낮추고, 실로 오랜만에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의 <A Love Supreme>을 턴테이블에 올려놓는다. 가사가 없어도, 가사가 들려온다, 그런 점이 좋다(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콜트레인은 굳이, "a love supreme"이라는 어구를, 입을 떼어, 그렇게 반복해서 읊조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하나의 아쉬움, 이 느낌만은 역시나 오롯이 그대로인데, 하지만 유독 오늘따라 저 부정관사 하나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건, 왜일까).


▷ Martin Heidegger, Zur Sache des Denkens,
Tübingen: Max Niemeyer, 1988³(1969¹).
6) 다시, 선물에 대하여: 일본에 다녀온 친구로부터 몇 달 전에 선물받은 앙증맞은 회중시계 하나. 귀를 기울이면, 책상 위에서 항상 째깍째깍, 나의 시간에 '메터(Meter)'를 부여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선물은 그가 내게 준 것이었으나, 다시 말해서, 그가, 내게, 선물을, 준, 것이었으나, 이 모든 주어와 술어와 목적어의 구조를 넘어서서, 다만, '그것은 준다'. 인칭과 비인칭, 그리고 [어쩌면] '3인칭'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금 주워 담으며, 오랜만에 하이데거의 「시간과 존재(Zeit und Sein)」 속 몇몇 구절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차라리, 선물(gift/don)이란, 그러므로 하나의 '문형 연습'이랄까, 혹은 외국어 습득하기에 준하는, 어설픈 걸음마와도 같은 하나의 힘겨운 '격설(鴃舌)'이랄까: '있음'을 서술하고 있는 [서구의] 여러 형식들. '직역'하자면, "그것이 준다(Es gibt)", 혹은, "그것이 거기에 갖고 있다(Il y a)". 그러니까, "비가 온다(Es regnet/It rains/Il pleut)". 아니, 차라리, "그는 운다(Il pleure)". 그러므로 사실 '형이상학'이라는 '형이상학적'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의 물음이 묻고 있는 것은 의외로 단순하다: '있음'이란 무엇인가? 이에 나는 다시금 '번역'과 '정의'의 형식으로 되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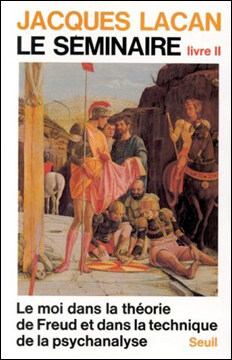
▷ Jacques Lacan,
D'un discours qui ne serait pas du semblant. Le séminaire, livre XVIII,
Paris: Seuil(coll. "Le Champ freudien"), 2006.
▷ Jacques Lacan,
Le moi dans la théorie de Freud et dans la technique de la psychanalyse.
Le séminaire, livre II,
Paris: Seuil(coll. "Le Champ freudien"), 1978.
7) 정신의 단련, 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소모: 출간은 작년부터 예고되었지만 얼마 전에야 비로소 도착한, 따끈따끈한 라캉의 세미나 18권(그러니까 전체 25권 중에서 이제 모두 열네 권이 공식 출간된 것!). 라캉이 이제는[이라고 해봤자 이미 1971년!] 한자(漢字)에도 손을 대는군, 하고 혀를 차며 읽고 있다가, 예전에 폭소를 터뜨리며 읽었던 세미나 2권의 한 구절이 갑자기 떠올라 살짝 즐거운 마음이 되었다. 라캉의 대사: "어디, 「도둑맞은 편지」 읽어 온 사람들 있으면 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절반도 안 되는군!"(세미나 2권, p.228 참조)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는 아마도, 내가 종종 라캉을 게 눈 감추듯 읽으면서도, 할 수 있는 한 항상 그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할 터.

▷ Arnaud Bouaniche, Gilles Deleuze, une introduction,
Paris: Pocket(coll. "Agora"), 2007.
8) 코스모폴리스(cosmopolis)를 가로지르거나 훑어내리는 지하철이라고, 아니, 차라리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를 관통하는 지하철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을 살짝 벗어나 살기 시작한 이후로 지하철은 나의 또 다른 '훌륭한' 독서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서울의 어느 곳으로 출타를 해도 책의 한 장(章)쯤 읽어내는 건 유(類)도 아닌 이 '적확한' 거리감과 '적절한' 소외감. 요즘 그 지하철을 오가며 가장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은, 올해 출간된 들뢰즈 철학에 대한 작은 개설서 한 권(특히나 책 사이사이에 포진한 박스 기사(encadré)까지 '게걸스럽게' 읽게 되는 아주 알찬 입문서로서, 역시나 일독을 권한다). 초반부(pp. 29-38)에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저 '새로움(nouveauté)'에 대한 강박ㅡ나는 이것을 하나의 '강박'이라고, '강박'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ㅡ을, 이제는 클리셰가 되어버린 '새로움'의 어떤 그림자일 뿐인 것으로 치부하면서도, 동시에 한편에선 이미 잔잔한 감동을 받고 있는 나는, 이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당신은 알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나는 당신이 알기를 바라고 있기는 한 걸까, 알 수 없다, 그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들뢰즈의 철학적 과제 하나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한 책 속의 어느 한 구절처럼, 다만 "현재를 진단할(diagnostiquer le présent)" 수 있기만을 바랄 뿐(p.32). 그러니, 기껏해야 나는, 나라는 인간은, 코스모폴리탄이 되기는커녕,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이 되기에도 힘에 부쳐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그렇다. 물 밖으로 나온, 아니 이제는 숫제 처음부터 물 따위는 없었을 거라고 지레짐작까지 해대는, 호흡만 가쁜 한 마리 물고기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뭍 만난' 물고기처럼.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