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숲에서 온 편지
김용규 지음 / 그책 / 2012년 4월
평점 :



"제게는 왜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요?"
"무슨 말씀인지..."
"다른 여자들은 키스를 할 때,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저는 여태 키스를 할 때마다 단 한번도 종소리를 듣지 못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숲속으로 들어가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개척하고 즐기고 누리는 김용규에게 어떤 여인이 묻는다.
김용규의 자세는, 어떤 질문에서든 배울 점을 찾아낸다는 자세.
역시 김용규 답게, 답을 몇 개 내놓아 본다.
"키스를 머리로 하시는 모양이지요. 가슴과 몸이 먼저, 그렇게 아래로부터 차오르는 황홀감이 머리를 무장해제 시키는 것.
그것이 달콤한 키스의 정석 같은데요."
머릿속으로는 환경 문제도, 세상 문제도 해결책을 많이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몸은 그 문제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삶을 살고 있기 일쑤다.
문제는 몸이다.
이 책에서는 머릿속으로만 궁글린 생각이 아닌, 자연 속에서 보고 얻은 관조들을 무료로 얻을 수 있어
푸짐한 음식 앞에서 미리 포만감을 즐기는 기분으로 읽게 되는 기쁨을 얻는다.
산중에 홀로 살면 두렵지 않느냐? 외롭지 않느냐? 묻는단다.
두려움은 알아가고 느끼는 것 앞에 사라진다.
외로움은 사람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하며, 무수한 생명과 사물 속에 내가 스며들지 못하는 데서 찾아오는 것임을 알게 되면,
곁에두고 잘 어루만질 수 있단다.
좁고 찌든 마음을 열어 천천히 내 밖의 세계인 자연과 연결하는 마음을 살려내면 웬만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1)
이 논조는 이 책을 꿰뚫는 화두와도 같은 것이다.
아궁이 불지피면서도 이 남자, 참 생각이 많다.
연소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작은 것을 태우는 데 성공해야 큰 것을 연소할 수 있다는 것.
연소에 실패하는 또 다른 원인은 서두름에 있다.
다음 원리는 직접 체험해봐야 하는 것인데, 전체가 활활 타오르려면 불이 사방에서 고르게 타오르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옵션이 '부지깽이'. 산소 공급을 위하여 조금만 공간을 열어주면 된다.
부지깽이는 좋은 스승의 역할.(28)
아궁이에서 연기만 웬수처럼 여기게 되기 십상인데, 이 남자는 이런 걸 배우려 든다.
이 남자가 나무를 기르면서, 가지치기를 처음엔 하다가 나중엔 냅둔다.
그 이치가 웅숭깊은 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억압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사람 역시 마음껏 제 가지를 뽑아 올려
드디어 제 꼴을 향한 삶의 질주를 제 속도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억압하는 면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희로애락의 균형의 추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네 가지 감정선 중에서 어느 측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헤아려 보는 것.
예전의 나는 분노와 슬픔에 민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표현은 늘 부러진 날개처럼 꺾여 있어 부실했습니다.
그대는 어떤지요.
희로애락에 대한 반응에서 어떤 부분이 자유롭고 어떤 부분이 부자유한지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요.
혹시 어느 한쪽 부러진 날개를 접고 비대칭의 여행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다가 평생 그렇게 늙고 시들어가는 것은 아닐지요.(164)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면, 우울근이 많이 발달해서 행복근이 맥을 못추게 하는 억압의 기제가 발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근육처럼, 행복근을 발달시킨다면... 우울근을 조금 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바다와 산이라는 개를 기르고, 숱한 벌들을 기르며 꿀을 얻는 농부다.
이 동물들과 겪는 에피소드도 재밌지만,
182쪽처럼 짜릿한 느낌을 주는 말은, 역시 그의 관조가 내뿜는 힘이다.
숲에서 필요한 것은 유심히 보기, 고요히 듣기입니다.
감나무 껍질이 얼마나 이쁜지...
세상 모든 게 그렇다. 유심히 보고, 고요히 들으면,
그것은 곧 애정을 가진 자세이므로, 모두 이뻐보이게 마련이다.
나태주의 풀꽃이란 시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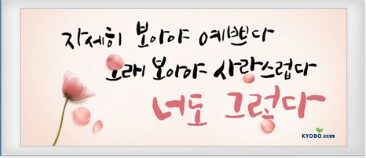
그는 농담삼아 인간과 사람을 구별해 본다.
농사해 보았으면 사람, 아니면 인간.
자신혹은 타인의 자식을 포함해서 생명을 길러본 이는 사람, 아니면 인간.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해본 이라면 사람, 아니면 인간.
위 세 가지중 하나라도 자신의 삶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는 사람, 아니라면 인간.(216)
재미로 만든 말이지만, 삶은 생명에 대한 애착 없이는 의미부여하기 힘든것임을 강조하는 말이겠다.
인생에서 겨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좋을까를 묻는 후배에게 그는 계절론으로 갈음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여서 우리 삶에도 종종 겨울이란 시간이 찾아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겨울이 찾아온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겨울을 맞았는데도 자신의 삶에 꽃이 피어나기를 바란다.
고통은 거기에 있다.
겨울을 맞아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겨울이 온 것을 알지 못한 채 지나온 봄날처럼 여전히 꽃피기를 바라는 데 우리의 불행이 있다.
나무를 보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들은 가장 붉거나 노랗거나 저다운 빛으로 잎을 물들인다.
단풍은 나무들이 자신의 욕망을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이제 곧 성장을 멈춰야 하는 시간을 맞으려는 으식이 단풍이다.
그들은 마침내 봄날부터 피웟던 모든 잎을 버려 겨울을 맞이한다.
벌거벗는 의식이다.
나무들은 나목이 되어서도 자신을 지켜낸다.
겨울엔 오로지 자신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소비도 생산도 하지 않아야 함을 알기에, 나목은 무언가를 생산하려는 시도를 멈춘다.
당연히 소비도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한다.
간결해지는 것이고, 가벼워지는 것.
어쩌면 다만 버티는 것.
자연에는 그렇게 버티는 것만이 가장 큰 희망이고 수행인 시기가 있다.(228)
박노해의 <삶의 나이>에서는 이런 말을 인용한다.
그렇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몇 개의 금을 그었는가?
지금 나는 금을 긋고 있는 중인가?
삶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는 동안 진정으로 의미있는 사랑을 하고
오늘 내가 정말 살았구나 하는
잊지 못할 삶의 경험이 있을 때마다
자기 집 문기둥에 금을 하나씩 긋는 것.
그가 지상을 떠날 때,
묘비에 금을 세어 숫자를 새겨두는 것.
이것이 참삶의 나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