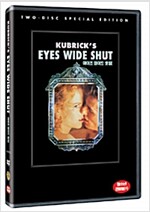강의 공지다. 현재 진행중인 20세기 러시아문학 강의에 이어서 한우리 광명지부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10분-12시 10분)에 '프로이트와 함께 읽는 오스트리아문학' 강의를 진행한다. 20세기 전반기 대표작가로 국내에 다수 작품이 소개돼 있는 아르투어 슈니츨러와 슈테판 츠바이크의 대표작을 읽는 강의다(슈니츨러는 '문학의 프로이트'로 불린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수강 문의는 02-897-1235/010-8926-5607).
슈니츨러와 츠바이크 읽기
1강 11월 30일_ 슈니츨러, <카사노바의 귀향>

2강 12월 07일_ 슈니츨러, <꿈의 노벨레>

3강 12월 14일_ 슈니츨러, <라이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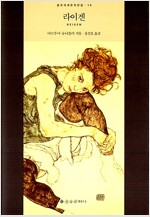
4강 12월 21일_ 츠바이크, <초조한 마음>

5강 12월 28일_ 츠바이크, <체스 이야기>

17. 11. 04.
P.S. 슈니츨러의 <꿈의 노벨레>는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셧>(1999)과 비교하며 읽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