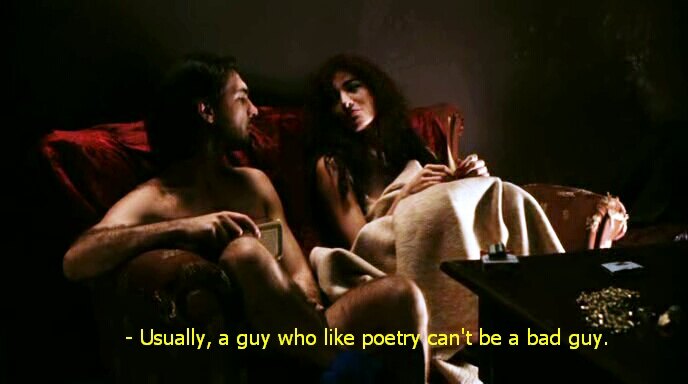어제 배송받은 책 중의 하나는 송찬호의 <흙은 사각형의 기억을 갖고 있다>(민음사)다. 오래 전에 읽은 시집이다. 시집 초판은 1989년에 나왔고 표지갈이를 한 2판이 2000년에 나왔다. 배송된 건 2015년에 나온 2판4쇄다.
내가 기억하는 송찬호는 사색적이고 진지한 시를 쓴다는 것과 전업시인이라는 것. 대구 산격동을 배경으로 한 시도 시집에는 들어 있으나 아마도 이후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한다. 굳이 행방과 근황을 추적하지는 않는다.
얼른 뜨는 시집이 대략 댓 권인데, 나는 <10년 동안의 빈 의자>와 <붉은 눈, 동백>까지 따라 읽은 기억이 있다.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과 <붉은 나막신>은 기억에 없거나 가물하다. <붉은 나막신>도 그래서 이번에 구했다. 이렇게 시집 다섯 권만 되어도 그 사이에 30년 가까운 세월이 출입한다.
‘말은 나무들을 꿈꾸게 한다‘를 읽는다. 목차를 보고 고른 게 아니고 아무 곳이나 펼쳐 짚은 시다.
말은 나무들을 꿈꾸게 한다 말을 시작하면
팔은 부드러운 나뭇가지로 변하고
딱딱한 몸도 나무 기둥으로 구부러진다
(약간 뒤틀리는 것이 자유롭고 편하다!)
통영 출신이지만 대구에서 오래 살았던(경북대에 재직했다) 김춘수의 ‘꽃‘을 연상하게 하는 시다. 김춘수의 꽃이 추상적인데 반해서 송찬호의 나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다. 그리고 더 에로틱하다.
이윽고 내 몸속에 숨어 있던 밤의 여인들이 나타난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묘령의 여인들이
허리 아래로는 한 몸으로 붙으면서
여러 개의 가슴으로 나뉘어져 뻗어 올라간
이 다성적인 나무의 줄기들
28년 전에 송찬호는 전위에 있던 시인으로 기억하는데 잘못된 기억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부드럽고 순한 상상력이라니! 게다가 논리적이다. 논리적이란 말은 말과 상상의 흐름이 방해받거나 교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요즘 시들에서는 드물어진 덕목이다(요즘 주목받는 시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과격하고 히스테리컬하다).
아니다, 말의 논리와 문법을 교란하는 난해시는 진작부터 있었다. 이 문제는 계보정리와 유형탐구가 필요하다. 아무튼 송찬호의 시를 오랜만에 읽으며 모난 것 없는 상상력에 놀란다. 그의 시에는 원래 사각형의 상상력만 있었던 게 아니었지. 둥근 것을 꿈꾸는 시인을 보라.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길게 뻗어 와 손을 내민다
이미 오래 침묵하였던 입술로
동그란 모음을 그 손가락에 끼워 준다
가지마다 푸른 물방울 보석만 반짝이는 깊은 밤
이렇게, 침묵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으랴
발이 왜 이리 가볍지,
진흙 덩어리 공기의 덧신을 신었었나?
사랑의 키스와 언약, 그리고 공중부양으로 마무리되는군. 표제시 때문에 죽음의 이미지와 같이 떠올리던 건 착시였는지도 모른다. 다른 시들도 얼핏 보니 둥근 것들 투성이다. 더불어 성애의 이미지가 넘쳐난다. 시인의 이미지를 교체하고 다른 분류 칸에 넣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