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더위가 한창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늦더위라는 복병이 언제든 덮쳐올지 모르지만, 말복도 지나면서 더위도 한풀 꺾인 듯싶다. 실내온도도 28도를 유지하고 있고 27도로 내려가기도 한다(내가 느끼는 체감더위는 29도부터라는 걸 알겠다). 그 정도는 선풍기로도 버텨낼 수 있는 더위다. 좀 덜 덥게 느껴지는 건 강의 일정도 조금 줄어든 때문인지도 모른다. 분기별 강의들이 마무리되면서 심리적으로는 한결 여유가 생겼다. 지난 계절을 되돌아보고 다음 계절, 심지어 내년 강의 일정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미친다는 게 여유의 증거다. 더불어 제목에 '인생'이 들어간 책들을 책상머리에 놓은 것도.



길게는 20년 동안, 짧게 잡아도 10년 넘게 러시아문학과 세계문학을 강의해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난 몇 년간이 나로선 전환기에 해당한다. 세계문학 전반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계획하에 강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문학을 필두로 하여 프랑스, 스페인, 독일문학을 차례로 일주했고, 그 사이에 일본문학과 중국문학, 그리고 한국 근대문학과 여성문학까지 다루었다(이 가운데 몇몇 강의가 책으로 묶였고 또 내년까지 몇 권 더 출간될 예정이다). 서양 근대문학 일주가 일차적인 목표였는데, 남은 여정 중의 하나가 미국문학이어서 내년 봄에는 19세기 미국문학을 읽을 예정이고(호손의 <주홍글자>와 멜빌의 <모비딕> 등은 이미 강의에서 여러 번 다루었다), 아마 20세기 미국 작가들도 더러 다룰 예정이다(피츠제럴드와 헤밍웨이, 포크너는 대표작들을 다룬 바 있다. 이들 외 대표 작가들을 읽으려고 한다). 가령 코맥 매카시와 필립 로스처럼 국내에 작품이 다수 번역돼 있는 작가들이 일차적인 고려 대상이다(많이 소개된 걸로는 폴 오스터도 못지않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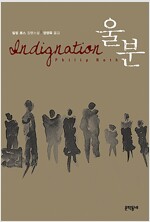


최근 '영화속의 문학'에서 매카시와 로스의 소설을 맛보기로 두편씩 읽었는데, 좀더 관심이 가는 쪽은 로스다(매카시는 영화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에). 1950년대와 60년대를 다루고 있는 두 작품이 주로 로스의 고향을 배경으로 당시 시대상과 사회상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두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아마도 로스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고 있을 법한) 분노의 정서가 흥미를 끌었다. 제목을 갖다 쓰자면 내게 로스는 '울분의 작가'다. <울분>은 2008년작인데, 195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로스는 1933년생이다) 75살의 나이에 쓴다는 것도 놀라웠다(젊은 시절에 써둔 작품이 아니라면). 한국전쟁 시기가 배경이고 주인공이 결국 한국전쟁에서 전사하는 걸로 나온다는 점은 부가적인 흥미거리고.



로스의 작품으로는 <미국의 목가>와 함께 '미국 3부작'을 구성하는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와 <휴먼 스테인>을 내년에 적당한 시기에 강의에서 다룰 계획이고, 초기작과 후기작 가운데 몇 편을 추가하려고 한다. 미국의 현대문학을 다루려니 '미국 3부작'은 필수코스일 수밖에 없기도 하고.



1950년대가 로스의 청춘시절이자 그의 문학의 밑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레 '비트세대'가 떠올랐다. 더불어 비트세대의 대표 시인 앨런 긴즈버그도. 그래서 주문하고 어제 받은 책들이 앨런 긴즈버그의 시집들이다. <울부짖음과 그리고 또 다른 시들>(1984, 2017)이 뜻밖에도 눈에 띄어서인데(출판사가 '1984'다), 시집이어서 원서도 같이 구했다. 대표작 '울부짖음'(1956)은 창비에서 나온 미국 대표시선 <가지 않은 길>에도 들어 있는데, 시 번역이라 아무래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어떤 것을 표준을 삼을지는 생각해봐야겠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시인이라면 대표시선의 표제시이기도 한 '가지 않은 길'의 로버트 프로스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다른 목소리로 긴즈버그를 넣어도 좋겠다. 시라기보다는 '울부짖음'을. 19세기 미국의 국민시인이라 할 월트 휘트먼의 '나의 노래'('나 자신의 노래')가 긴즈버그의 '울부짖음'으로 이행하는 과정도 미국문학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미국문학을 다룬 이후에는 이탈리아문학과 터키문학, 아프리카문학 등이 문학기행의 후보다. 10년쯤 전에 읽은 단테의 <신곡>을 다시 읽게 될 수도 있다. 인생의 반고비를 넘다 보니 이젠 다시 읽는 책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다시 읽어야 하는 책들을 다시 읽는 거라고 위안을 삼지만, 아주 신나는 일은 아니군...
17. 0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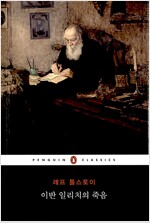
P.S. 필립 로스 얘기도 적은 김에, <미국의 목가>에 나오는 사소한 오역도 지적한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1886)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눈에 띈 것인데, "이반 일리치는 궁정의 고위 관리로"(1권 55쪽)에서 '궁정'은 '고등법원(high court)'을 잘못 본 것이다. 몇 줄 내려가지 않아서 "이 재판장"이라는 표현도 나오듯이 톨스토이 소설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고등법원의 판사다. 톨스토이의 소설이라고 하니까 역자가 자동적으로 '궁정'을 떠올린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