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저자 3인으로 '이주의 저자'를 고른다. 분야는 제각각이다. 먼저 미국의 젊은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 미국의 TV방송에서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을 진행하면서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이라는 평판을 얻었다고 한다. 뇌과학의 지식과 최신 이슈를 그만큼 알기 쉽게 전달해준다는 뜻이겠다. 그 실례가 될 만한 책으로 나온 게 <더 브레인>(해나무, 2017)이다. 우화소설 <썸>(문학동네, 2011)과 <인코그니토>(쌤앤파커스, 2011)가 먼저 소개됐었는데, 주제나 난이도 면에서 보면 <더 브레인>을 첫 책으로 손에 들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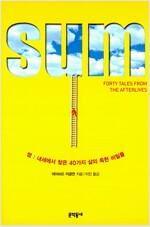
"PBS(미국공영방송)와 BBC(영국공영방송)에서 방영된 화제의 방송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6부작)의 핵심 내용을 책으로 풀어 쓴 것이다. 이 책은 뇌를 가진 생물학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어떤 한계와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캐묻는다. 또한 뇌를 더 잘 이해하면, 우리가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먼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경. 새삼스럽긴 하지만, 그의 책들 가운데 초역된 책(들로 보인다)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일단 <교외의 사탄>(김오, 2017)은 뜻밖에도 그의 소설집이다."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SF 미스터리 소설. 1953년 출간되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장기간 올랐던, 러셀의 첫 소설집이다. 러셀은 그의 자서전에서 “교외의 사탄은 내가 모트레이크에서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이상한 사람이 모티브가 됐다. 그는 나를 보자 십자가를 그리며 길을 건너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러셀은 교외의 사탄에서 평범한 주위의 인간들이 어떻게 악의적이고 사탄적인 말에 따라 행동하는지를 주인공이 과학적 방법으로 추적해 나간다."
러셀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건 1950년의 일이므로 이 책은 그와 관계가 없지만(러셀의 문학적 공적은 소설보다 에세이에 있다) 영국 대표 철학자의 소설이라고 하니까 호사가적 관심을 갖게 된다. 거기에 추가할 만한 책은 1930년대에 쓰인 <자유와 조직>(사회평론, 2017). 번역본으로는 744쪽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의 책이다. 러셀이 쓴 역사 에세이라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소개는 이렇다.
"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세계가 폭풍 전야의 위기감에 휩싸인 1930년대 러셀은 <자유와 조직>을 집필했다. 전쟁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급박한 시기에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역사서를 쓴 것이 의아해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러셀이 이 책을 쓴 이유는 1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숨겨진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다가오는 전쟁을 막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러셀은 전쟁이라는 강요된 미래를 막아내기 위해 역사를 선택한 것이다."
자연스레 주문하게 되는 책. 검색하다 보니 <서양철학사>(집문당, 2017)도 새 표지 합본판으로 다시 나왔다. 분권된 책으로 읽었던 게 거의 30년 전이다. 기억을 더듬어 다시 읽어볼까도 싶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화가 프레데릭 파작의 신작도 출간되었다. <나는 빈센트를 잊고 있었다>9미래인, 2017). '빈센트 반 고흐 전기, 혹은 그를 찾는 여행의 기록'이 부제다. "메디치 상 수상작 <발터 벤야민의 죽음>을 비롯해 여러 책에서 “말과 이미지의 매력적이고도 강력한 결합”을 보여준 바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도 자신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시대의 우울을 응시하는 웅숭깊은 성찰적 해석에 작가가 직접 그린 흑백 드로잉들이 어우러져 반 고흐의 ‘찬란한 빛’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오롯이 돋을새김된다."
그러고 보니 <발터 벤야민의 죽음>이 왜 소개되지 않는지 궁금하군. 파작의 책으론 니체와 파베세를 다룬 <거대한 고독>(현대문학, 2003/2006)과 아내 레아 룬트와 같이 쓴 드로잉 에세이 <짝 이룬 남녀는 서로 사랑한다>(미메시스, 2013)가 소개된 바 있다(<거대한 고독>은 절판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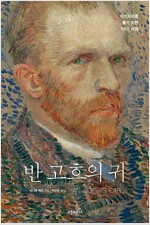


말이 나온 김에 적자면, 반 고흐에 관한 책은 해마다 여러 권이 출간된다. 올해 나온 책으로는 버나뎃 머피의 <반 고흐의 귀>(오픈하우스, 2017)는 '귀'만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반 고흐의 귀>는 아마추어 연구가의 피땀 어린 노력의 생생한 증명이자 기록이자 결실이며, 무엇보다 반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자른 그날 밤을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독자를 새로운 관점으로 안내하는 가치 있는 발견이다."
파작의 책과 같은 그림을 표지로 쓰고 있어서 나란히 꽂아두어도 좋겠다...
17.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