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간단하게 저녁식사만 하는 자리라고 해도 '가족행사'가 낀 주말은 그냥 없는 듯이 지나간다. 휴일에 잠시 낮잠이라도 자고 일어나면 몸은 좀 가뿐해지지만 밀린 일들이 머리를 무겁게 짓누른다(간혹 '제 정신이야?'라고 다그치기도 한다). 저녁시간에 세탁기로 돌려놓은 빨래를 베란다 빨랫줄에 널면서, 문득 중학생 때 빨리를 널러, 또 걷으러 대야를 들고 (아파트가 아니라) 당시에 살던 단층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낭패스럽게도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널어놓은 빨래를 다시 걷어다가 세탁해야 했던 일들도(그러니까 빗방울이 떨어지자 마자 가장 먼저 떠올려야 했던 일은 '옥상의 빨래'였다!).
돌이켜보면, 그런 게 또 '행복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아파트 베란다에 너는 빨래는 그런 '모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에 젖은 빨래를 다시 빨아 널어야 하는 불편은 덜게 됐지만, 덩달아 덜게 된 건 '일상의 모험' 한 가지이다. 그러한 손익계산을 하자치면, 삶은 공평하다. 나아지는 게 없다. 아니, 공평하게 말하자. 삶은 언제나 퇴색한다. 더이상 청춘을 찾아보기 어려운 부모님의 얼굴처럼(내가 중학생일 때 어머니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젊으셨다!).
잠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세탁기 이야기'나 옮겨적을까 하고 옛날에(10년 전에) 만든 시집들을 들춰보다가 다소 엉뚱한 곳에 시선이 머물렀다. '이 세상의 소금을 노래함'이란 시에 눈길이 간 것. 약간 교정해서 옮겨놓는다.

이 세상의 소금을 노래함
소금은 짜다. 소금은 단순하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소금은 말한다, 아니면
퍽퍽하리라고, 맹탕이 되리라고, 밥맛이 떨어지리라고-
아무도 소금을 무시할 수는 없다. 된장 공장 같은
삶의 현장에서 짠맛이 빠진다면,
오, 어느 된장국에 우리가 숟가락을 담글 것이냐?
하여 우리는 소금을 묵인한다. 소금의 활동을 묵인한다.
맛소금, 막소금, 더러는 막돼먹은 소금이 도처에서
활발하다. 닭도리탕에도, 미역국에도, 더러는 레미콘에도.
소금은, 맛의 주연이고 베테랑이며 조국 근대화의 주역이니.
보라, 땀에 배인 소금의 과거, 짭짤한 소금의 현재, 빛나는 소금의 미래!
세상에 뿌려진 소금만큼 소금의 끗발은 줄지 않는다.
소금은 미나리가 아니고 미나리 사촌이 아니니
오, 이 땅의 소금들이여!
하여 우리는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던 것이다. 인제 다신
맹탕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삶을 물말아 먹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맵짜지기로, 소금이 되기로, 소금기둥이 되기로!
소금은 짜다. 소금은 단순하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소금은 말한다, 장조림도 말한다.
아침밥을 먹고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달려간다. 숨이,
턱밑까지 찰 때쯤, 우리는
소금의 문턱에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설렁탕집에서 엊저녁에 꼬리찜을 먹은 게 '잔상'으로 남았던 모양이다. 요즘은 국산 소금이라도 믿을 수 없다고 하지. 중국산 소금을 잔뜩 사다가 염전에 뿌리고 그걸 다시 거둬들인다나. 해서, 이 세상의 소금들은 한가지로 다들 빛나지만 실제로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내 세대의 386 소금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다. '이 세상의 소금들'에 경의를 표하지만, 소금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기도 하다...



06. 09. 03.
P.S. 시집엔 '이 세상의 소금을 노래함'이란 장의 머리에 키에르케고르의 독설도 함께 인용해놓았는데, 이런 내용이다: "세상에 나서서 큰소리로 질타나 하면 마치 사람의 운명이 변혁되는 줄로 믿는다는 것은 커다란 애교이다." 이 덴마크의 철학자에겐 유머가 있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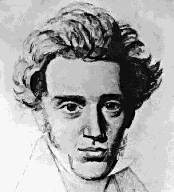
"내가 젊었을 무렵 요리점에 가면, 나도 세상의 청년들처럼 급사를 향하여 '여봐, 스테이크 하나, 고급 스테이크 한 접시, 등심살로 너무 기름기가 많지 않은 것을 가져와' 하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급사는 거의 내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그것을 황송하게 듣는 일은 없었다. 또한 내 목소리가 주방에까지 들려서 요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 따윈 더더군다나 없었다. 설령 모두가 그러했다 하더라도 스테이크의 품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리라." 문제는 '스테이크의 품질'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