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쟈의 러시아문학 강의 20세기>(현암사, 2017)가 출간된 지 두 주쯤 지났고 지난주와 이번주 언론 리뷰에서 다루어졌다. 단신으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몇몇 리뷰에서의 언급을 자료삼아 옮겨놓는다. '문학, 혁명을 만나다'라는 부제에 걸맞게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아 나온 책들과 나란히 읽히면 좋겠다. 이번 주에 나온 책으로는 만화로 읽는 혁명사로 <붉게 타오른 1917>(책갈피, 2017)과 제8회 맑스코뮤날레 결과물인 <혁명과 이행>(한울, 2017)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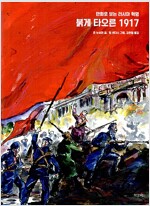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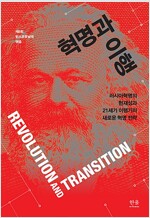
19세기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체호프 등으로 이어지는 문학의 '황금시대'였다면, 20세기는 그러한 비옥한 토대가 혁명이란 파랑을 만날 때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설명한다.
노동자의 계급 각성을 그린 최초의 노동자 소설 '어머니'의 고리키에서부터 혁명에 회의적이었던 '닥터 지바고'의 파스테르나크, 공식 문학의 문화 권력자이면서 '고요한 돈 강'으로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한 숄로호프, 모국은 물론 모국어를 떠나 이방의 언어로 작품을 써야 했던 '롤리타'의 작가 나보코프까지, 20세기를 살았던 작가 중 누구도 혁명의 물결을 비껴갈 수 없었다.
사회주의에 혁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체제의 탄압을 받아 러시아 내에서 공식 출간될 수 없었던 작품은 '비공식 문학'이라 한다. 비공식 문학이라고 해서 모두 혁명과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닥터 지바고'처럼 혁명에 비판적이거나 불가코프의 희곡들처럼 당 관료들과 속물들을 풍자하는 작품도 있었지만 플라토노프처럼 '현실보다 더 왼쪽으로' 기울어 있기에 현실 사회주의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작가도 있었다. 소련의 수용소 사회를 고발한 솔제니친 같은 작가도 서구나 국내엔 '반공 작가'처럼 소개되었지만 사실 그는 억압적 체제를 비판했을 뿐, 근본적으로는 공산주의자였다.(노컷뉴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하일 숄로호프의 <고요한 돈 강>(1928~1940)이 “소비에트 문학에서 서사적 조망 내지는 서사시적 조망을 처음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상찬을 받은 반면, 또 다른 노벨상 수상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1957)는 혁명보다는 삶과 예술의 편에 섬으로써 비판을 받았다. 역시 노벨상을 받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반체제 인사로 낙인찍혀 결국 해외 망명까지 했지만, 사실 그의 이념은 기독교적 휴머니즘을 바탕에 깐 공산주의였다. 귀족 신분이라 혁명 이후 망명을 택해야 했던 <롤리타>의 작가 나보코프는 모국어인 러시아어를 버리고 영어로 써야 했던 자신의 처지를 필생의 문학적 주제로 삼았다.
“소련에서는 부조리 문학이라는 게 따로 필요 없습니다. 현실 자체가 부조리하니까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면 바로 부조리 문학이 됩니다.” 솔제니친에 대한 장에서 지은이가 쓴 이 말은 인간 해방과 사회 변혁을 목표로 출발한 혁명이 결과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향했던 사정, 그러니까 1917년과 1991년 사이의 간극에 대한 요약이자 이 책의 결론으로서 새겨둘 법하다.(한겨레)
로쟈는 19세기 러시아가 톨스토이·도스토예프스키·체호프 등으로 대표되는 문학의 황금시대였다면, 20세기의 러시아는 문학도 혁명을 비껴갈 수 없었던 시대라고 정리한다. 1980년대 국내 대학가의 필독서였던 고리키의 『어머니』,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 구 소련 체제를 고발했던 솔제니친의 수용소 문학 등 20세기 러시아 문학사는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했다.
러시아 문학 전공자다운 깊이 있는 해설이 이야기하듯 풀어낸 문장과 어울려 술술 읽힌다. 러시아어로 ‘지바고’가 ‘삶’이고, 막심 고리키는 ‘그토록 쓰라린’의 뜻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중앙일보)
17. 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