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란 책에 관심을 표하면서 책 표지도 눈에 띈다고 적었는데, 잊고 있던 사실도 생각났다. 비슷한 책 표지. 책표지가 비슷한 사례는 드물지 않기에 특별한 얘깃거리는 아니다. 다만 내가 낸 책과 같은 표지라면 아무래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가령 <책을 읽을 자유>(현암사, 2010)와 시선집 <검은 시의 목록>(걷는사람, 2017)은 누가 보더라도 같은 책 이미지를 표지로 썼다. 통상 디자이너나 표집자라면 예전에 쓰인 표지는 꺼려할 듯싶은데(반대인가?), 이 경우는 예외이지 싶다(몇달 전 처음 <검은 시의 목록> 표지를 처음 봤을 때 놀랍기도 하고 신기했다). 지난 연말에 나온 채형복의 <법정에 선 문학>(한티재, 2016)도 가운데 들어간 책 사진은 같은 이미지다. 그래서 표지 때문에 이 세 권의 책은 마치 한 세트 같은 느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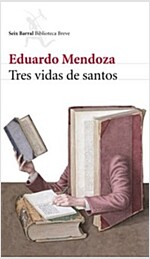

지금은 품절된 걸로 뜨는데, <아주 사적인 독서>(웅진지식하우스, 2013)도 좀 특이한 표지를 갖고 있다. 디자이너의 고안은 아니고 이미지를 저작료를 지불하고 구입했다 들었는데, 작년에 스페인문학에 대해 강의하면서 에두아르도 멘도사의 미번역 작품 가운데 <세 성자전>의 표지 이미지가 같은 걸 발견했다. 표지의 양다리, 내지 투잡? 이미지에 무슨 소속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과장하자면 우리집 식구가 다른 집 식구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느낌이 들었다. 피터 박스올의 <소설의 가치>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낸 책 가운데 가장 애정이 가는 건 <로쟈의 인문학 서재>(산책자, 2009)다. 첫 책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편집부에서 많은 의미를 담으려고 한 표지였기도 했다. 현재는 품절된 상태라 아쉬운데 기회가 닿으면 개정판을 내고 싶다. 그리고 아마도 <로쟈의 러시아문학 강의>의 표지들이 ('로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대표 표지가 될 것 같다. 기획으로는 도스토예프스키 강의와 톨스토이 강의도 내년쯤에 한 권씩 묶으려고 하는데, 어떤 표지가 나올지 궁금하다...
17. 0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