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목과 표지 모두 눈에 띄는 책을 '이주의 발견'으로 고른다. 윌리엄 데이비스 킹의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책세상, 2017)다. '어느 수집광의 집요한 자기 관찰기'가 부제. 제목과 부제에 비하면 저자의 이력은 멀쩡한 편이다. 캘리포니아대학의 연극무용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 비평판의 편자인 걸 보면 유진 오닐이 전공인 듯싶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취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 모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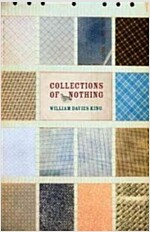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간 아무 가치 없는 물건들을 모으고 보관해온 저자는 가정에서, 일에서 여러모로 혼란을 겪던 중년에 이르러 자기 자신을 새삼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수집에 강박적으로 몰두하게 되었는지, 수집을 통해 과연 어떤 의미를 얻으려 했는지 의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 애쓴다. 이 의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얻어내고자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독특한 자전적 에세이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기도 한 인간의 사소한 습관과 일상의 사물들에 애정 어린 시선을 던지면서 잔잔하지만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꽤 유익한 자극과 성찰을 제공해줄 듯싶다.
동시에 나처럼 온통 책에 들러싸여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는 좀 나은 것을 수집하는 것이니 나름 위안도 얻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어차피 '수집광'인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면 동병상련의 심정도 느껴볼 수 있겠다. 이래저래 아무것도 아닌 것들과 씨름하는 모든 이들이 일독해봄직하다. 뉴욕타임스 북리뷰는 이렇게 평했다. "잡동사니에 얽힌 병리학을 향한 놀랍도록 솔직하고 매혹적인 시선. 인생의 회고이자 축적하려는 인간 충동의 심리에 관한 진지한 탐구."



수집가적 열정을 다룬 책들도 몇 권 고를 수 있는데, 루스 호건의 소설 <잃어버린 것들의 수집가>(레드박스, 2017)은 원저도 올해 나온 아주 따끈한 책이다. "잃어버린 물건에 얽힌 사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운명을 아름답게 그린 작품이다." 이화정의 <시간 수집가의 빈티지 여행>(북노마드, 2015)은 영화주간지 '씨네21' 기자의 빈티지 수집 여행기다. 그리고 수잔 스튜어트의 <갈망에 대하여>(산처럼, 2016)는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욕망의 구조를 이론적으로 해부하고 있는 책. 다소 어렵긴 하지만, '미니어처, 거대한 것, 기념품, 수집품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17.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