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저자'를 골라놓는다. 국내 저자 3인데, 분류하자면 소설가, 진화생물학자, 미학자다(이런 고정적인 분류를 넘어서고 있지만). 먼저 소설가 백민석. 오랜 침묵 끝에 <혀끝의 남자>(문학과지성사, 2013)로 복귀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내놓은 건 소설집이 아니라 미술 에세이다. <리플릿>(한겨레출판, 2017). 장편소설 <공포의 세기>(문학과지성사, 2016)는 지난 해에 펴냈고, 재작년에는 <장원의 심부름꾼 소년>(한겨레출판, 2015) 개정판을 펴내기도 했다.



"소설가 백민석의 첫 미술 에세이. 1990년대 한국문학 뉴웨이브의 아이콘, 백민석. 1995년에 등단해서 왕성한 활동 후 절필, 10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와 다양한 소설을 펴내고 있는 작가이다. 때로는 진보하고 때로는 퇴보한 예술과 시대의 자장 안에서 백민석은 작가로서의 8년과 절필 후 잠적한 10년의 시간을 하나로 엮어준 ‘미술관 순례’를 기록한다. “글을 쓰지 않을 때도 미술관은 다녔다”는 저자의 글 속에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를 흔든 정치적, 문화적 이행과 그 시대를 고스란히 겪은 저자 내면의 풍경이 함께 담겨 있다."
'에세이스트'로서의 백민석은 얼른 가늠이 되지 않는다. "“글을 쓰지 않을 때도 미술관은 다녔다”는 말이 힌트가 될 수 있을까. 미술 읽기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백민석의 내면 풍경이 아닐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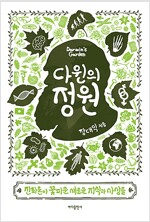


진화생물학과 진화심리학, 그리고 과학철학을 자유럽게 넘나드는 장대익 교수의 신간은 '다윈 3부작'의 마지막 책 <다윈의 정원>(바다출판사, 2017)이다. 앞서 나온 두 권, <다윈의 서재>와 <다윈의 식탁>이 두 세차례 나온 개정판이었다면 <다윈의 정원>은 오롯하게 신간이다.
"진화론에서 피어난 새로운 지식과 사상들을 소개하며 이제는 과학이 21세기의 인간학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전작인 <다윈의 서재> 및 <다윈의 식탁>에서 간간이 드러나던 장대익 교수의 문제의식은 이 책에서 구체화되어 하나의 독자적인 이론으로 정립되고, 지식의 최전선에서 우리 사회를 통찰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다윈 삼부작도 이로서 마무리된다."
3부작과 비슷한 성격의 책으로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바다출판사, 2016) 개정판이 중간에 끼여 있는데, 사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책이었다(좋은 교양과학서가 많이 나오다 보니 그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다윈의 정원>이 아쉬움을 상쇄해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미학자이자 전방위 인문학자, 사회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는 진중권 교수도 신작을 펴냈다.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천년의상상, 2017). 천년의상상에서 펴낸 책으로는 <이미지 인문학1,2>(천년의상상, 2014)에 이어지는 책이다. 그렇다고 '이미지'나 '인문학'에 대한 책은 아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고양이 인문학'이다. 반려묘 사랑이 지극한 걸로 소문난 저자의 고양이 사랑학으로도, 혹은 서문의 제목을 빌리자면 '고양이중심주의 선언'으르도 읽을 수 있는 책. 책의 세 장은 각각 '고양이의 역사학''고양이의 문학''고양이의 철학'을 다룬다. 실상은 그의 고양이 루비가 구술한 것은 받아적어 펴냈다고 하는데, "고양이의 창세기부터 현대, 그리고 동서양을 아우르며 고양이에 관한 역사, 문학, 철학에서의 재미난 이야깃거리들이 굽이굽이 펼쳐진다." 하여, '고양이 인문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되겠다.
책의 부제는 '지혜로운 집사가 되기 위한 지침서'다. 즉 고양이 집사들을 위한 책인 셈인데, 예비 집사들도 읽어보면 좋겠다. 집사도, 예비 집사도 아닌 독자라면? 루비님 말씀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하시란다...
17.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