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작가 윌리엄 트레버의 작품이 또 한권 번역돼 나왔다. <여름의 끝>(한겨레출판, 2016). 2009년작이니까 작가 나이 여든 한 살에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단편문학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트레버는 18권의 장편도 발표했다. 전천후 작가라고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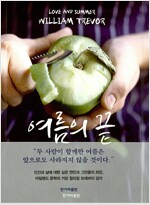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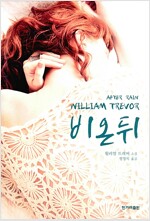

사실 국내에는 지난해 단편선집 <윌리엄 트레버>(현대문학, 2015)가 출간됨으로써 처음 소개되었고, 올여름에 단편집 <비 온 뒤>(한겨레출판, 2016)가 나왔으니 '뉴 페이스'에 해당한다. 명성에 비하면 상당히 뒤늦게 소개된 셈인데, 그럼에도 "영어권의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단편작가"(뉴요커)란 평판은 기대를 안 가질 수 없게 만든다.<여름의 끝>의 간단한 소개는 이렇다.
"윌리엄 트레버가 81세에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듯한 아일랜드의 한 작은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두 남녀의 내밀한 사랑 이야기가 이곳의 풍경, 색깔, 냄새와 소리, 빛과 그림자와 함께 섬세하게 묘사된다. 여름 한철 조용한 마을에서 일어난 누군가의 첫사랑과 과거의 사랑, 누군가의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슬픔 들이 작가 특유의 깊은 공감과 연민의 시선으로, 절제된 문장 속에 담긴다. 2009년 부커상 후보작."
<여름의 끝>이 장편이긴 하지만, 단편작가로서 더 유명한 만큼 자연스레 다른 거장들인 존 치버나 레이먼드 카버도 연상하게 한다. 각운도 얼추 맞아서 트레버-치버-카버는 '3버'로도 묶을 수 있다. 트레버는 이제 막 세 권이 출간됐지만, 치버와 카버는 사정이 달라서 거의 전집 수준으로 소개되고 있다.



가령 존 치버는 올초에 일기와 편지가 번역되었고, <작가란 무엇인가3>(다른, 2015)에서도 인터뷰를 읽어볼 수 있으며, 세계문학문전집판으로는 <팔코너>(문학동네, 2011)와 <왑샷 가문 연대기><왑샷 가문 몰락기>(민음사, 2008)을 읽을 수 있다.



<팔코너>는 "뛰어난 단편소설들을 통해 미국인과 미국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 결혼, 도덕 같은 가치들이 안온해 보이는 일상의 이면에서 붕괴해나가는 모습을 정밀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포착해내 '교외의 체호프'로 불린 존 치버의 네 번째 장편소설"이고, <왑샷 가문 연대기>와 <왑샷 가문 몰락기>는 연작장편소설로 세인트보톨프스라는 작은 어촌 마을 사람들 이야기다.





치버의 단편들은 네 권으로 갈무리돼 출간되었는데, 이게 최종판인지는 모르겠다. <불릿파크>(문학동네, 2007)가 애초에는 '존 치버 전집' 1권으로 나왔다가 후속작이 없이 묻혔는데, 아마도 다시 순번을 정돈하여 나오지 않을까 싶다(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정리된 상태는 아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제일 처음 읽은 건 <주홍빛 이삿짐트럭>(정우사, 199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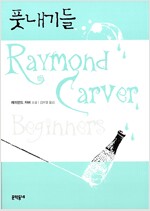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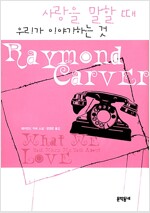

카버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요 작품은 모두 번역됐지만, '전집'이나 깔끔한 '선집' 형태는 아니다. 세계문학전집으로 빠진 <대성당>(문학동네, 2014)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품들이 모두 망라돼 있는지 모르겠다(가령 집사재판에는 들어 있었지만 문학동네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작품도 있다).



내가 카버를 처음 읽은 건 집사재판(1996)을 통해서였는데(그러고 보니 영화 <숏컷>의 원작자로 처음 소개된 모양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어판 해설이 수록돼 있는 게 특징이었다. 지금은 모두 절판된 상태. 분량으로는 카버 전집도 가능할 듯싶은데, 그런 기획이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작품집이 출간연도나 시기별로 묶여진다면 더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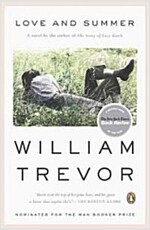
치버와 카버의 사정이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 트레버의 작품들도(단편만 수백 편이고 선집도 1280쪽에 이른다) 어떤 모양새로 더 소개될지 기대가 된다...
1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