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무거운 책들을 읽다가 머리도 식힐 겸 넘겨본 책이 KBS 다큐를 단행본으로 엮은 <명견만리>(인플루엔셜, 2016)다. 두 권짜리인데, 제목으로는 식별이 안 된다(처음엔 똑같은 책인 줄 알았다). 내가 읽은 건 '미래의 기회 편' 혹은 '윤리, 기술, 중국, 교육 편'이다.


교육 편의 두 꼭지를 읽었는데, 이미 어디선가 본 내용이었다. 아마 방송 내용을 소개한 포털 기사를 읽었던 게 아닌가 싶다. '왜 우리는 온순한 양이 되어갈까'에서는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짚었고, '지식의 폭발 이후,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에서는 주로 핀란드의 혁신 교육을 거울 삼아 우리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많이 알려진 통계이지만 대학의 혁신을 고민하게끔 하는 지표부터 다시 확인해보자. 1990년대까지 40퍼센트도 채 되지 않았던 대학 진학률은 2006년에 82퍼센트를 찍었고 2010년대 들어서도 7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대졸자 주류사회'라는 말을 낳았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 OECD 국가들 사이에 압도적인 1위이고, 미국, 일본, 유럽의 대학 진학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학력 국가인 셈이다.
그에 보조라도 맞추는 양, 비약적으로 치솟은 것이 등록금이다.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 한국 대학의 등록급은 사립대가 28배, 국립대가 30배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쌀값이 6배, 악명 높은 전세금이 11배 오른 것과 비교해도 얼마나 기록적인가를 알 수 있다(해서 우리는 평균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라나 뭐라나). 이런 시스템을 무던히도 버텨내고 있다는 점이 대단하지 않은가. 인내심이 강한 러시아 사람들을 일컬어 '노예의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국인도 그 못지 않다('개돼지'면 그보다 못한 건가?).
한데, 그 대가는 무엇인가. 왜 그토록 대학에 목을 매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졸자 평균 취업률 때문이다. 58.6퍼센트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그러는 와중에 이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거의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서는 취업도 보장 못하는 대학 졸업장 한 장 달랑 받아드는 셈이다.
대학 교육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최재천 교수에 따르면 75퍼센트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대학 진학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이유의 대부분은 취업난이다. 대학이 '취업 준비소'로 전락했다는 자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듣고 있지만, 실상은 그 '준비소'도 안된다는 게 한국대학의 현실이고 문제점이다. 등록금 후불제라도 하지 않는 이상, 뭔가 바뀌어도 한참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흥분할 일은 아니다. 상황이 대충 이렇다는 건 다들 안다(대한민국에서 한 분 정도는 확실히 모르는 성싶지만). 그럼에도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가며(사교육비 지출도 우리가 세계 1위다) 아이들을 입시와 스펙 경쟁에 내몬다. 그러면서도 최장시간 노동 국가였던 전력에(지금은 멕시코란다. 우리가 2등?) 걸맞게 한국은 최장시간 학습 국가다. 자랑은 아니다. 학습효율화지수를 따지면 우리는 바닥권이다(노동효율지수란 게 있다면 그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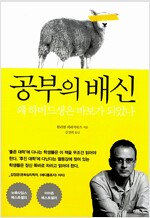

단순하게 생각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래가 없는 나라다(다시 한번 '헬조선'이다). 하지만 변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고, 솔직히는 의심스럽다. '한강의 기적'을 낳은 핵심 요인으로 우리의 교육열이 곧잘 꼽히지만, 그 역시 유효 시한이 다 되었다는 느낌이다. 의지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목표와 방향으로 보이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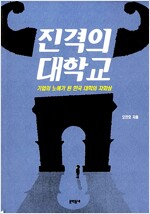

대학에는 왜 가는지, 미래의 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 새삼 고민하게 된다. 고등학생 아이가 있다 보니 이게 또 남의 고민만은 아니라는 걸 연휴에 깨닫는다...
16.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