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거창해 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번역 한 대목을 짚어보는 페이퍼다. <시학>은 분량은 얇지만 인류 최초의 문학론으로서 의의가 가볍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음미해볼 만한 고전이다. 애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립한 뤼케이온 학원의 강의노트였던 <시학>은 2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희극을 다룬 <시학> 2권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은 이 2권을 소재로 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을 모방(재현)의 양식으로 규정한 서두 이후 아리스토텔렉스는 6장에서부터 본격적인 비극론으로 들어간다. 더 정확하게는 극작법이다. 비극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하는 문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여섯 가지 구성소를 나열한 다음에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플롯이라고 지적하는데, 이 대목이 <시학>의 핵심에 해당한다(유명한 '카타르시스'는 비극의 효과로서 한 차례만 언급된다). 원전 번역본 손명현본(고려대출판부/동서문화사)과 천병희본(문예출판사)은 각각 이렇게 옮겼다.



"이 6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결합, 즉 플롯이다. 무릇 비극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생활과 행복과 불행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행동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생활의 목적도 어떤 행동이지 성질이 아니다."(손명현)
"이 여섯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결합, 즉 플롯이다. 비극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가 생활과 행복과 불행을 모방한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행동 가운데 있으며 비극의 목적도 일종의 행동이지 성질은 아니다."(천병희)
두 분 다 비극의 여섯 요소는 "장경, 성격, 플롯, 조사, 가요(노래), 사상"이라고 대동소이하게 옮겼다(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장경'은 분장을 포함한 무대미술을 가요(노래)는 음악/음향 효과를 가리킨다. 그리고 '조사'는 '언어표현'으로도 옮겨지는데, 지금의 '대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용문의 끝에서 '생활의 목적'이 행동이라고 말한 부분과 '비극의 목적'이라고 행동이라고 단언한 대목은 같은 뜻으로 읽기 어렵다. 삶의 목적이나 비극의 목적이나 그게 그거라는 뜻이 성립할 수 없다면(삶=비극?) 둘 중 하나다. 희랍어 원문이 서로 상충하는 해석을 허용하거나(고전에서는 그런 일이 드물지 않다) 아니면 어느 한 쪽이 오역이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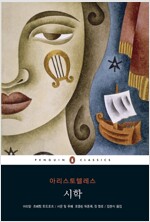
원문을 대조할 수 없는 처지에서는 다른 번역본을 더 참조하는 수밖에 없는데, 영어본을 옮긴 이상섭(문학과지성사), 김재홍 교수(고려대출판부)의 번역본과 프랑스어본을 옮긴 김한식 교수(펭귄클래식)의 번역본을 차례로 나열해 본다.
"이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들의 조직 즉 플롯이다. 왜냐하면 비극은 있는 대로의 사람의 재현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모방인 까닭이며 행복과 불행은 다같이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은 일종의 행동이지 어떤 질적인 상태가 아니다."(이상섭)
"여러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상의 사건을 결합하는 것 즉 구성이다. 비극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모방이 아니라 행동과 삶, 행복과 불행의 모방이다. 모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행동양식을 취하며 우리 삶의 궁극목적도 어떤 종류의 활동이지 성질은 아니다."(김재홍)
"이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들을 조직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실제로 비극은 사람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과 행복(불행 역시 행동 속에 들어 있다)을 재현하며, 비극이 겨냥하는 목표는 행동이지 성품이 아니다."(김한식)
여기서도 이상섭/김재홍본과 김한식본의 번역이 엇갈린다. 단순하게 말하면 영어판과 불어판이 갈리는 것 같은 형국이다(궁금해서 러시아어본을 찾아보니 '비극의 목적'으로 옮겼다). 여기서 '행동'은 우리가 현재 쓰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며, '성질'이나 '성품' '질적인 상태' 등으로 옮겨진 것은 '에토스' 즉 '성격'을 가리킨다(영어의 '캐릭터'다). 요즘 쓰는 구도로 말하면, '플롯이나 캐릭터냐'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문제 삼고 있는 쟁점이다. 그리고 단연 플롯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그는 플롯이 비극의 '영혼'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런 맥락에서, 설사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할지라도 나로선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이 '비극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그렇게 강의했다).



<시학>은 영어로도 다수의 번역본이 존재하고, 이상섭본과 김재홍본의 번역 대본도 같지 않다. 김진성 정암학당 연구원이 옮긴 사무엘 힌리 부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창작예술론>(세창출판사, 2014)의 20세기초에 출간된, 19세기 <시학> 연구를 대표하는 저작인데(부처와 바이워터가 당시 영어권의 대표 학자다) 여기서는 "비극은 인물들의 모방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모방이다. 그리고 그 삶을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삶의 목적은 일종의 행동이지, 성질이 아니다."(270쪽)라고 옮겼다. 좀더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레온 골든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예림기획, 2002)이 번역돼 있고 예전에 흥미롭게 읽은 책이지만 당장은 손에 들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다. 대신 영어권에서 평판이 높은 스티븐 핼리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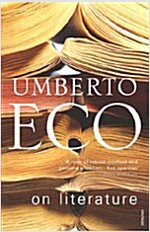
한편 에코의 <나는 독자를 위해 글을 쓴다>(열린책들, 2009)는 <움베르코 에코의 문학강의>(열린책들, 2005)을 마니아판으로 다시 펴낸 것인데(영어판은 <문학론>이란 제목으로 나왔다), 이번에 다시 구해서 '<시학>과 우리'란 글을 읽었다. 애초에 학회 발표문으로 쓰인 것인데, 주로 <시학>의 수용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흥미로운 주제지만 독서가 수월하지는 않았는데 역자가 <시학>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탓이 커 보였다. 비극의 여섯 구성 요소를 이렇게 옮긴다면 <시학>을 읽었다고 볼 수 없겠기에.
"하지만 아직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는 <어휘 lexis>, <시선 opsis>, <지각 dianoia>, <윤리 ethos>, <음악 melos>의 정확하고도 유기적인 혼합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토스>의 뼈대에 살을 붙였습니다."(352-3쪽)
포는 에드거 앨런 포를 가리킨다. 그리고 나열된 용어들이 비극의 구성소로서 미토스는 플롯을, 에토스는 성격을 가리킨다. '볼거리'로도 옮겨지는 옵시스는 분장과 무대장치를, 디아노이아는 사상을 가리킨다. (언어)표현으로도 옮겨지는 렉시스가 대본이다. <시학>과 같은 고전적인 저작에 대한 상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핵심 용어들의 번역어는 통일이 되었으면 싶다(최소한 두 가지 이내로).



아, <시학> 다시 읽기는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강의차 읽기 위한 워밍업이었다. 연휴라지만 부모님 댁에도 가야 하는 와중에 중세 수도원에도 들러야 하니 꽤나 분주한 일정이로군...
16.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