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동네답게 주말 알라딘 마을은 두 작가의 부고 소식으로 숙연하다. 오전에 차례대로 하퍼 리(1926-2016)와 움베르토 에코(1932-2016)의 서거 소식을 접했는데(한국에선 두 사람 다 '열린책들'의 작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두 작가의 독자라면 저마다의 소감이 없을 수 없겠다(알라딘은 발빠르게 추모의 공간도 마련했다). 나도 간단히 적는다(그다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편이라 길게 적을 수도 없다).



<앵무새 죽이기>(열린책들, 2015)의 작가 하퍼리는 바로 지난해 <파수꾼>(열린책들, 2015)이 55년만에 나온 '신작'으로 단연 화제가 됐었기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부고 소식이 이르게 여겨진다. 나도 <파수꾼> 출간을 계기로 행사에도 참여하고 강의에서도 여러 번 다룬 터라 아직 기억이 생생하다. 조금 이르다 싶었던 하퍼 리의 전기 <나는 스카웃이다>(2008)도 이제는 충분히 읽어볼 만하게 되었다(나는 작년에 나온 보급판을 구입했다). 더 두툼한 평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 전기의 역할을 해줄 듯싶다(아마 번역본도 곧 나오지 않을까). <앵무새 죽이기>와 <파수꾼>의 관계도 그렇고, 과연 하퍼 리가 과연 다른 작품은 남겨놓지 않았는지(젊은 시절 하퍼 리는 글쓰기에 대한 대단한 열정과 의욕을 표현한 바 있다) 궁금한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두고봐야겠다.



움베르토 에코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가 기획한 <중세> 시리즈가 작년에 두 권 선을 보였고(전4권 시리즈다), 지난 달에는 그가 공동편집자인 <셜록 홈스, 기호학자를 만나다>(이마, 2016)가 재출간돼 여전히 '현역'이란 인상을 강하게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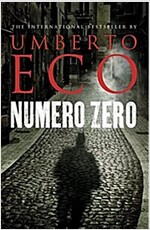


최근에 검색했을 때도 신간 소설이 나와 있어서(작년에 나온 <넘버 제로>라는 소설이다) 여전히 건재하구나 싶었다(84세이니 만큼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아무려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 이르게 여겨지는 죽음에 에코의 책들도 돌이켜보게 된다. 우리시대의 르네상스인답게 다양한 관심을 가졌던 지성이지만 에코의 삶은 중세학자, 기호학자, 소설가라는 세 타이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대표 소설 <장미의 이름>은 그런 세 면모를 한 곳에 압축해놓은 작품. 개인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강의에서 다루려고 얼마 전에 영어본도 새로 구입한 터이다(당연한 말이지만, 작가와의 만남이란 독서를 통한 만남이다. 그런 면에서 작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은 제한적이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대로, 모든 저자는 책과 더불어 또 한번의 삶을 산다). 에코와의 '재회'가 벌써 기대된다.



내게 <장미의 이름>보다 더 인연이 깊은 책은 <기호학 이론>이다(열린책들판으로는 <일반기호학이론>. 문학과지성사판은 아직 절판되지 않은 게 의아할 정도로 번역이 좋지 않다). 대학원 시절에 몇몇 사람과 영어본을 번역하는 스터디를 했었기 때문에. 끝을 보진 못했지만 나로선 <기호학이론>을 꼼꼼하게 탐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코의 책들이 '움베르토 에코 마니아 컬렉션'으로 재구성돼 나오면서부터는 에코와의 사이가 애매해졌다. 중복되는 책들이 적지 않아서 이 시리즈 전체를 구입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자연스레 '마니아'에는 끼지 못하는 게 돼 버렸다. 더불어 열독 시기도 지나갔다. 책이나 번역과 관련된 몇몇 타이틀이나 반가워한 정도. 어차피 그의 모든 책을 다 읽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마니아'가 아니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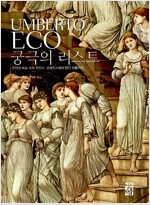
아마도 내가 마지막에 손에 들 법한 책은 <전설의 땅 이야기>와 <궁극의 리스트> 등이다. 내게는 제목이 '전설의 에코' '궁극의 에코'로도 읽힌다. 물론 아직 읽을 책이 많다는 건 독자로서 결코 손해가 아니다. 책은 저자만의 재산이 아니라 독자에게도 인생을 살아갈 두둑한 밑천이다. 그렇게 한몫 챙기게 해준 두 작가의 명복을 빈다...
16.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