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과 생물학 분야의 책을 '이주의 발견'으로 고른다. 마이클 본드의 <타인의 영향력>(어크로스, 2015)과 아지트 바르키와 대니 브라워의 <부정 본능>(부키, 2015)이다. 둘다 처음 소개되는 저자의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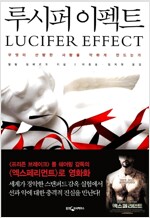
<타인의 영향력>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나에게 스며드는가'가 부제. "타인의 존재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하지만 타인의 부재는 우리를 더 험한 길로 몰아넣는다. <뉴사이언티스트> 수석에디터, 영국왕립학회 수석연구원을 지낸 저명한 저널리스트 마이클 본드가 타인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파고들었다. 저자는 역사적 사건, 사회적 이슈와 심리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접목하고 다양한 인물들을 인터뷰하며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독자를 이끈다."
'타인'이란 주제는 매우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기에, 저자가 범위를 어떻게 좁혀서 다룰지 궁금하다.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타인의 영향력에 관한 가장 유명한 심리학 연구는 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웅진지식하우스, 2007)에서 소개된다. 스탠퍼드 모의 교도소 실험을 다룬 책.
1971년 8월, 당시 38세의 젊은 심리학자였던 필립 짐바르도는 ‘반사회적 행동 연구’의 일환으로 모의 교도소 실험을 계획한다. 평범한 학생들을 무작위로 수감자와 교도관의 역할로 나눈 다음, 낯선 환경과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면서 어떤 심리 변화를 겪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이 실험의 본래 취지였다. 그러나 실험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교도소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첫날부터 마치 진짜 수감자와 교도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교도관 역할의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감자들을 가학적으로 대했고, 그 방법도 ‘창의적’으로 악랄하게 발전시켰다. 점호 시간마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서투른 수감자들에게 벌을 주고, 조금이라도 반항의 기미를 보이면 독방에 감금했으며, 심지어 성적인 수치심을 갖게 하는 등의 가학적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실험은 일주일만에 중단되었는데, 실험을 기획한 저자가 이 모의 교도소 실험을 35년 만에 공개하고 분석하여,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과 악의 근원"을 파헤친 책이다. <타인의 영향력>의 배경으로 읽어봐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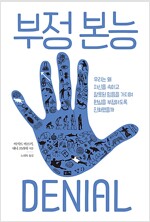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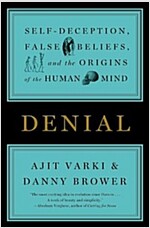

<부정 본능>은 더 긴 부제를 갖고 있다.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며 현실을 부정하도록 진화했을까'. 이 또한 흥미로운 문제제기인데, 저자들이 '부정'이란 주제를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거리다.
수백만 년 동안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인간과 같은 지적 능력을 갖춘 코끼리나 돌고래는 없을까? 저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진화한 것은 뇌의 발달 같은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 즉 죽음에 대한 부정을 비롯해 현실을 부정하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그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진화상의 특이한 사건으로 인해 현실 부정은 인간의 본성으로 굳어졌고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개인 일상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독감의 대유행이나 기후 불안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실을 애써 부정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현실 부정 덕분에 암 환자의 낙관주의 성향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와 대담성 등 소중한 자질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실 부정 능력이란 건 낙관 편향과도 이어질 수 있겠기에, 탈리 샤롯의 <설계된 망각>(리더스북, 2013)과 같이 읽어봐도 좋겠다(원제가 '낙관 편향'이다).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다.
이 책은 인간 두뇌의 가장 위대한 기만 능력들 가운데 하나인 낙관 편향을 탐구한다. 그리고 낙관편향을 지속하기 위해 뇌가 어떻게 낙관의 훼방꾼들을 퇴색시키거나 망각하게 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이 편향이 적응에 도움이 될 때는 언제이며 파괴적일 때는 언제인지 살펴보고, 적당히 낙관적인 착각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15.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