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과학분야의 책으로만 '이주의 책'을 고른다. 타이틀북은 에른스트 페터 피셔의 <과학한다는 것>(반니, 2015)이다. 저자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과학사 교수. 책소개 가운데 과학과 예술의 상보적 관계에 대한 지적이 눈에 띈다.


과학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세상의 다른 부분, 예컨대 예술과 상보적 관계 속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과학과 사회의 이상적인 관계를 보여 준 예로는 오펜하이머가 있다. 그는 나치 독일에 대항한 정치적·군사적 활동과 1950년 이후 평화적 활동으로 명성을 얻은 과학자다. 원자폭탄 개발의 일등 공신인 그는 원자폭탄의 실제 사용에서 근대과학의 위험성을 분명히 목격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유럽의 문명에서 과학이 차지한 위치를 엘리엇 같은 문학가들과 대화를 통해 밝히려고 했으며 예술가들과 과학 연구자들의 협력과 회합에 전력했다. 즉 사회와 동떨어진 과학이 아니라 사회 속 과학을 연구한 것이다.
두번째 책은 에드워드 슬링거랜드의 <과학과 인문학>(지호, 2015). 부제는 '몸과 문화의 통합'이라고 돼 있는데,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통합적 연구, 통섭적 연구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모색하는 책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저자는 문화 연구에 있어서 객관주의 접근법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렇게 하여 인문학자들이 인지과학과 자연과학의 동료들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상부상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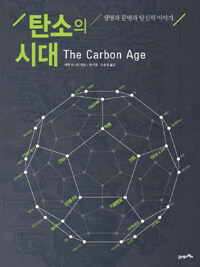
세번째 책은 사토 겐타로의 <탄소 문명>(까치, 2015). "이 책은 두 얼굴을 가진 탄소를 인류의 생명을 지탱하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탄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준다"는 소개다. 같은 주제의 책으로 에릭 로스턴의 <탄소의 시대>(21세기북스, 2011)와 짝이 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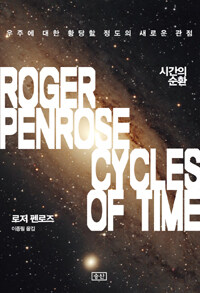
네번째 책은 리처드 프레스턴의 <핫존: 에볼라 바이러스 전쟁의 시작>(청어람미디어, 2015)이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생기를 다룬 논픽션이다.
1989년, 미국의 워싱턴 D.C.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논픽션 작가인 리처드 프레스턴이 아프리카와 미국, 독일 등에서 실제로 일어난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사태를 취재하여 SF소설처럼 흥미진진하면서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살려냈다. 즉, 1967년 독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와 사촌격인 마르부르크가 첫 발병한 날부터 미국의 워싱턴 D.C. 인근 레스턴에 나타난 에볼라 레스턴까지 약 26년간 에볼라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사투 과정을 섬뜩할 만큼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그려냈다.
끝으로 다섯번째 책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의 <시간의 순환>(승산, 2015)이다. 우주론 분야에 대한 기여로 스티븐 호킹과 과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력까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의 책. 하지만 전작인 <실체에 이르는 길>(승산, 2010)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난이도다. 초고난도 급이기에, 일반 독자에겐 '그림의 책'. 그래도 과학 전공자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로저 펜로즈는 <시간의 순환>을 통해 자신의 우주 이론을 한 발자국 더 전진시킨다. 그는 여러 고전적인 물리 이론부터 첨단 이론을 두루 논의해 나가며 우주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개진해 나간다. 우주론의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빅뱅 이전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우주 질서의 기원은 무엇일까? 어떤 우주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 과학과 인문학- 몸과 문화의 통합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지음, 김동환.최영호 옮김 / 지호 / 2015년 3월
43,000원 → 38,700원(10%할인) / 마일리지 2,150원(5% 적립)
|
|
 | 핫존 : 에볼라 바이러스 전쟁의 시작
리처드 프레스턴 지음, 김하락 옮김 / 청어람미디어 / 2015년 3월
15,000원 → 13,500원(10%할인) / 마일리지 750원(5% 적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