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분야의 '이주의 발견'을 골라놓는다. 먼저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로 첫 세 권이 출간됐다. 옥스포드대출판부에서 나오는 VSI시리즈(Very Short Introductions)를 중심으로 짜인다고 하는데(이 시리즈는 1995년부터 출간돼 현재 350권 이상이 나와 있다), 일단은 이 시리즈의 <철학>, <역사>, <수사학>이 1차분으로 나왔고 <로마 공화정>과 <로마 제국> 등이 이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



VSI 시리즈는 사실 처음 소개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단행본으로 출간되거나 '한겨레 지식문고'로 9권이 출간된 바 있다. 한겨레 지식문고가 주로 사회과학 쪽 이슈를 다룬 책들로 구성돼 있다면, 교유서가는 인문학 분야의 책들로 구성돼 있는 게 눈에 띄는 차이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짧고 저렴하다는 것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다. 영어권 대표 출판사에서 펴내는 시리즈인 만큼 충분히 소개될 만하고 읽어볼 만하다. '인문교양의 첫단추'로 삼아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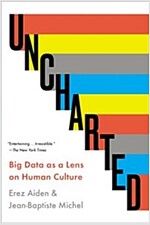

또 하나 눈에 띄는 책은 에레즈 에이든과 장바티스트 미셸의 <빅데이터 인문학>(사계절, 2015)이다. 부제는 '800만 권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빅데이터 시대가 인문학에 어떤 변화 혹은 충격을 가져올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로 보이는데, 소개는 이렇다.
지금까지 인간이 축적해온 기록 유산과는 규모 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양의 디지털 기록, 즉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인문학이 맞이하게 될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책이다. 30대 초반의 과학자인 두 저자는 첨단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인문학이 인간에 관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빅데이터는 그동안 물리적, 기술적 한계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영역을 열어젖히며 인문학을 확장해나갈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는 빅테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인력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는 계속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 들었기에. 이러한 변화가 갖는 의미와 추세에 대해서는 네이트 실버의 <신호와 소음>(더퀘스트, 2014)를 참고하는 게 좋겠다.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신호를 포착할 것인가란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2012년 미국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유명해진 통계학자이자 정치 예측가이다('정치 예측가'란 직업도 있는 것인가?)...
15.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