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웹진 '독서인'의 독서카페에 실은 칼럼을 옮겨놓는다. 지난 연말에 나온 데이비드 실즈의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책세상, 2014)의 몇 대목을 따라가면서 읽은 소감을 적었다. 그의 책이 몇권 더 번역돼 나오면 좋겠다. <죽은 언어>, <현실 갈망> 등과 책의 서두에서 언급되고 있는 밴 러너의 <아토차 역을 떠나며>는 내용이 궁금해서 주문을 넣었다. 그가 쓴 <샐린저>는 작년에 구입한 책인데 어디에 놓았는지 찾아봐야겠다...



독서인(15년 1월호) 문학이 필요한 이유
“책은 각자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게 아니면 존재를 견딜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18세기 영국 평론가 새뮤얼 존슨의 말이다. 미국작가 데이비드 실즈의 회고록이자 자전적 문학론인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책세상, 2014)는 존슨의 명제를 지침으로 삼는다. 다만 실즈에게는 그 두 선택지 가운데 한 가지는 배제된다. “각자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별로 유효한 처방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문학동네, 2010)의 저자이기도 한 실즈로서는 단순히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책은 ‘엄청난 시간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럼 책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각자의 존재를 견디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책의 존재 목적이다. 모두가 동의하진 않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쓰는 작가들이 있고, 또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있다.



아마도 최초의 독서 체험이 책에 대한 생각을 규정짓는 데 결정적일지 모른다. 실즈가 기억하는 행복한 추억은 열네 살 때 목감기에 걸려 침대에 앉은 채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던 일이다. 따끈한 버터밀크 한 잔을 건네면서 그의 어머니는 <호밀밭의 파수꾼>을 평생 처음으로 읽다니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 또한 샐린저의 대표작을 처음 읽던 시절의 행복감을 떠올린 것이었겠다. 어머니의 말에 더 고무된 실즈는 소설의 핵심 구절을 달달 외우고 어딜 가나 책을 옆에 끼고 다닌다. 그 이듬해에는 누나의 조언이 보태진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좋은 소설이지만 이젠 <아홉 가지 이야기>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많은 작품을 쓴 작가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샐린저의 모든 책이 실즈에게는 ‘내 인생의 책’이 된다. <프래니와 주이>를 읽고, 대학원 시절엔 <목수들아, 대들보를 높이 올려라>를 흉내낸 소설도 써본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일어나서 꺼내 읽을 수 있는 작가가 서른 명이 되지 않는 중에도 샐린저는 단연 앞자리에 놓이며, 그는 샐린저의 모든 책을 최소한 십여 번씩 읽었다. 샐린저의 무엇에 매혹된 것일까.
실즈가 샐린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목소리가 책마다 조금씩 다른 정도와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대꾸한다는 점”에 있다. 샐린저의 소설들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들은 것에 견해를 밝히고 또 계속 이야기한다. 그런 게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실즈 자신의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기형적인 게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샐린저를 통해서 배운다. 이 배움이 그를 덜 외롭게 만들고 삶을 살아볼 만한 것으로 만든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존재를 견디게 한다. 실즈는 자신이 온 마음으로 믿는 55편의 작품을 나열하고 그 이유도 간략하게 덧붙이고 있는데, “수많은 책을 그럭저럭 아는 것보다 십여 권의 책을 아주 깊이 아는 것이 낫다”는 D.H. 로렌스의 충고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래도 55권의 맹우들이라면 꽤 든든한 처지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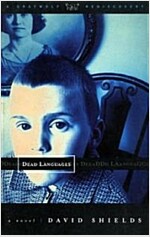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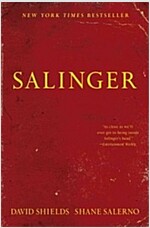
책에 대한 실즈의 몰입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 실즈는 말더듬이였다. 그의 두 번째 소설이자 자전소설인 <죽은 언어>도 말더듬증을 소재로 하고 있다(아직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았다). 말더듬증 때문에 그가 겪은 문제는 사랑과 미움, 기쁨, 고통 같은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자의식을 떨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더듬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내야 했다. 그 결과 그에게 “감정이란 남들에게나 속하는 것”이었다. 그는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지 않은 우회로”를 거쳐서만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런 그가 <죽음 언어>에서 말을 심하게 더듬는 바람에 단어들을 숭배하게 된 어느 소년의 이야기를 쓴 것은 자연스럽다.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에. 그는 그 소설을 쓰던 무렵, 문장을 반복적으로 교정하면서 “그 책에 인생이 들어 있기를, 책이 내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책을 쓴다는 것은 각자의 인생을 더 견딜 만한 형식으로 바꾸는 작업인지도 모른다.
실즈가 보기에 예술은 각자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할 때 가장 활기차고 위험하다. 자기 삶을 구제하는 일이 걸려 있기에 활기차면서 동시에 위험한 것이리라. 실즈는 “병리학 실험실, 쓰레기 매립지, 재활용센터, 사형선고, 미수로 끝난 자살의 유언장”과 함께 ‘구원을 향한 돌진으로서 예술’을 믿는다. 물론 그것이 쉽게 될 리는 없다. “문학은 누구의 삶도 구한 적이 없어”라는 친구의 핀잔에, 그가 준비한 대답은 그래도 ‘문학은 내 삶을 구했다’는 것이다. 비록 ‘가까스로’란 말이 덧붙여져야 할지라도.
‘가까스로’란 어떤 의미일까. 실즈가 떠올린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 한 친구가 알래스카 주의 티셔츠 가게에서 일했는데, 유람선을 탄 관광객들이 도착하면 그들을 데리고 택시나 버스로 20킬로미터쯤 떨어진 멘던홀 빙하로 안내를 했다. 이 빙하는 넓이가 100제곱킬로미터나 되고 제일 높은 지점은 호수에서 30미터나 솟아올라 있다. 한번은 어느 관광객이 빙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너무 더러워 보이는군요. 씻거나 그러지 않나요?” 예컨대, 실즈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냥 웃음이 나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언어는 우리를 서로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 그러나 완전히 이어주진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문학은 삶을 구할 수도 있고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이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또 작가가 돼 비평적 회고록을 쓴다면 딱 이런 모양새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게 하는 실즈의 책을 덮으면서 그의 마지막 문장에 공감하는 독자가 더 많았으면 싶다. “나는 문학이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길 바라지만, 그 무엇도 인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없다. 문학은 이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바로 그 때문에 문학은 필요하다.” 그런 문학이 없다면, 우리는 더 외로울 것이다.
15.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