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세 보이는데, 두 권의 책 제목이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로베르 뮈샹블레의 <쾌락의 역사>(지만지, 2008)와 호주의 정치학자이자 동성애 인권 운동가 데니스 알트먼의 <글로벌 섹스>(이소출판사, 2003). '사라진 책들'로 분류한 것은 <글로벌 섹스>가 절판된 지 오래 됐기 때문이다(국내 독자들은 '섹스'란 제목이 들어간 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사드 전집까지 예고돼 있어서 같은 카테고리의 책들을 검색하다가 장바구니에 넣었다(<쾌락의 역사>는 구면인 책인데, 구매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관심도서였지만 구입은 보류했던 것인지, 착오인지 알 수 없다).



뮈샹블레의 책으론 <악마 천년의 역사>(박영률출판사, 2006)와 <잔혹한 열정>(북프렌즈, 2007)까지 세 권이 번역됐는데, <잔혹한 열정>은 절판된 상태. 남은 두 권은 모두 관심도서로 분류할 만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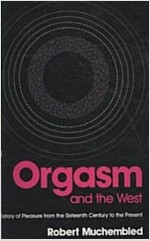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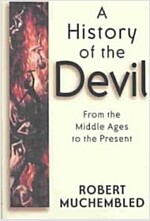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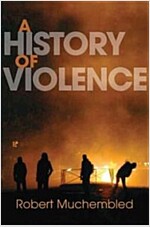
<쾌락의 역사>의 원제는 <오르가슴>이다(<악마의 역사>와 함께 영어본이 나와 있다. <폭력의 역사>도 눈길을 끄는 타이틀). 어떤 책인가.
저자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성적 충동의 승화가 유럽의 특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좀 더 폭넓은 해석을 제안한다. 저자는 연구의 범위를 성(性)에 국한시키며,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의 주제는 성적(性的)인 쾌락의 역사, 즉 학술적인 이론과 구체적인 인식을 통해 나타난 육체에 대한 질문과, 성적인 쾌락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금기와 경멸의 시대였던 16∼17세기부터 나르시시즘이 승리한 현재까지의 인간 주체에 대한 질문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책들이 없진 않지만 나름대로 의의가 인정되는 책인 듯하다. 일독해봄직한 것. <악마의 역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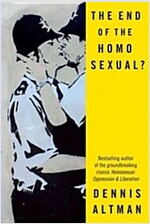
생각보다 오래 전에 나온 <글로벌 섹스>는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섹스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와 가장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임을 증명하는 책"이라는 소개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 몸의 쾌락이 어떻게 구성되고 상업화.상품화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불분명해졌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조명한다. 이 책은 또한 사이버 섹스의 급속한 확산을 둘러싼 여타의 사실에서 성의 상품화가 사회적 최약자들(섹스 비즈니스 포섭된 가난한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억압적 금욕주의가 경제 세계화의 결과 또는 그것에 대한 반동이라는 주장이 구체적 조사와 분석에 의해 뒷받침된다.
초판이 2001년에 나왔으니 '업뎃'이 필요해보이지만, 여하튼 이 분야의 책으론 기본서인 듯싶다. 동성애 문제 전문가로 보이는 저자의 신간으론 <동성애는 끝났는가?)(2013)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사드 전집'은 <사드 전집1: 사제와 죽어가는 자의 대화>(워크룸프레스, 2014)을 염두에 둔 것이다. 책은 예판으로만 떠 있어서 예정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관심을 끄는 시리즈인 것만은 틀림없다(사실 사드의 책들도 국내에서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다수가 절판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와 함께 박홍순의 <욕망할 자유>(사우, 2014)도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만한 책. 욕망을 죄악시하는 세상에 도전했던 네 사람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고 있는데, 디오니소스, 보카치오, 사드, 그리고 푸코가 그 네 명이다. 법학자 김두식 교수의 <욕망해도 괜찮아>(창비, 2012)와 짝이 될 만하다...
14.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