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배송받은 책 가운데 하나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제이북스, 2014)이다. 정암학당 플라톤 전집의 하나로, 드디어 나온 것인데, 번역은 <향연>을 옮긴 강철웅 교수가 맡았다. 뒷표지를 보니 현재 이 전집은 18권이 출간됐으니 종수로는 2/3를 훌쩍 넘겼지만 대작 <국가>와 <법률>이 미간이어서 분량으로는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 특히 <국가> 번역은, 만약 나온다면 원전 번역으로는 세번째 번역판이 될 텐데 사뭇 기대가 된다(공역으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뜸을 들이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변명>이란 제목이다. 일반 독자들에겐 더 친숙한 제목이지만 박종현 교수나 천병희 교수의 원전 번역판에서 <변론>이라고 옮기면서 대략 <변론>으로 굳어져 가는 모양새였다. 그런데 정암학당 전집판에서 다시 <변명>이라고 옮김으로써 '도루묵'이 돼 버렸다. 상당수 고전학 전공자들이 포진해 있는 정암학당 쪽에서 <변명>의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한 간략한 해명은 이렇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고발된 혐의 내용에 반박을 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이 함축하는 바 자기 삶 전체를 향한 물음과 도전에 대해 '항변'한다. 소크라테스로 대변되는 삶의 방식, 그러니끼 철학과 철학적 삶 자체에 대한 '변명'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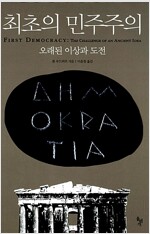
<변명> 대신에 <변론>으로 옮긴 번역판들이 나오면서 관련 인문서들도 <변론>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다시 <변명>이 더 나은 제목이라고 하니(구관이 명관?) 좀 멋쩍어졌다. 당장 가장 최근에 나온 <이럴 때 소크라테스라면>(원더박스, 2014)에서도 <변론>이라고 옮기고 있는 터이다. 그렇다고 <변론>이라고 나온 번역판들도 무시할 수 없으니 <젊은 베르터의 고뇌>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경우처럼 상당 기간은 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변명>의 사례를 참고하자면 우리는 언제 다시 <고뇌>를 떨치고 <슬픔>으로 되돌아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무려나 <변명>은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가장 읽기 쉬우면서도 흥미로운 대화편에 속한다.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히는 대화편 가운데 하나다(솔직히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국가>를 읽은 독자가 많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역자도 추천하고 있지만 배터니 휴즈의 <아테네의 변명>(옥당, 2012), 폴 우드러프의 <최초의 민주주의>(돌베개, 2012)와 같이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읽을 수 있다. 사실 상세한 주석을 자랑하는 전집판 <변명> 자체가 전공자나 '깊이 읽기'를 원하는 독자를 배려한 판본이다...
14.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