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회학자 김호기 교수의 <예술로 만난 사회>(돌베개, 2014)를 들춰보다가 만나게 된 책은 풀란드 시인 아담 자가예프스키의 <타인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문학의숲, 2012)다. 자가예프스키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체스와프 미워시,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에 이어 오늘날 폴란드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돼 있다. 김호기 교수는 책에서 '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이란 시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는데, 시의 첫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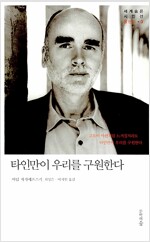

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
위안이 있다, 타인의
음악에서만, 타인의 시에서만.
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시의 전문이 궁금해서 아침에 책을 주문했고 귀가길에 경비실 앞에 놓여 있는 택배를 들고 왔다. 그리고 펼쳐보았다. 나머지 대목은 이렇다.
고독이 아편처럼 달콤하다 해도,
타인들은 지옥이 아니다,
꿈으로 깨끗이 씻긴 아침
그들의 이마를 바라보면.
나는 왜 어떤 단어를 쓸지 고민하는 것일까,
너라고 할지, 그라고 할지,
모든 그는 어떤 너의 배신자일 뿐인데, 그러나 그 대신
서늘한 대화가 충실히 기디라고 있는 건
타인의 시에서뿐이다.



이 정도 시라면 평이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서 읽어볼 만하다 싶다. 찾아보니 영역된 시집과 에세이들이 눈에 띄는데,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목록으로 올려놓았다(물론 따로 줄 사람도 없으니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시에 대해 김호기 교수는 이렇게 논평을 덧붙였다.
자가예프스키의 삶은 전후 폴란드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권위적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서유럽으로의 망명, 폴란드의 민주화에 따른 귀향이라는 개인적 삶의 궤적이 그의 시들에 오롯이 담겨 있다. 그는 폴란드인이지만, 동시에 국경과 이념을 넘어서 인간적 가치를 옹호하는 세계시민이다. '타인의 아름다움에서만'은 폴란드인과 세계시민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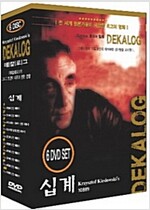


폴란드라고 하니까, 바르샤바 생각이 나고(아직 가보지 못했다), 키에슬로프스키의 영화들도 떠오른다(내가 본 바르샤바는 그의 영화들 속 바르샤바다, 잿빛 아파트단지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바르샤바). 날씨도 많이 쌀쌀해진 김에 강의도 줄어드는 12월엔 그의 <데칼로그>(십계)나 한편씩 다시 보고 싶다. 그래, 올 겨울맞이는 그걸로 대신해야겠다...

1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