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발견'으로 교양과학 분야의 책을 한 권 고른다. 휴 앨더시 윌리엄스의 <메스를 든 인문학>(알에치코리아, 2014). 제목에 '인문학'이 들어 있어서 '교양 인문학'으로도 분류되는 책이다. '과학과 인문, 예술을 넘나드는 우리 몸 이야기'니까 몇 다리 걸치는 책이긴 하다. 저자는 <원소의 세계사>(알에이치코리아, 2013)로 먼저 소개됐던 과학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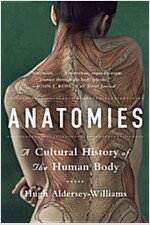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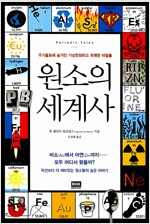
덕분에 기억이 났는데, 작년에 <원소의 세계사>를 소개하면서 "찾아보니 저자의 신작은 <해부학: 인체의 문화사>다. 이 또한 번역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적은 바 있다. <메스를 든 인문학>이라고 제목이 바뀌어서 못 알아봤는데, 그 <해부학>이 번역된 것. 당연히 원서와 함께 장바구니에 넣었다. 의학 교재로서 <해부학>에까지 손길이 가는 건 아니지만(의사인 동생에게 빌려볼 수는 있겠다) '인체의 문화사'라고 하면 관심도서로 부족함이 없다.



해부학 책에 어떤 게 있나 잠시 검색해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작가와 작품은 페데리코 안다아시의 <해부학자>(문학동네, 2011)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책장에 꽂혀 있는데도 주목해보지 못했다. 저자는 1963년생 아르헨티나 작가로 국내엔 <해부학자>만 소개된 듯싶다.
기발한 상상력과 실험정신으로 무장한 아르헨티나 작가 페데리코 안다아시의 첫 장편소설이자 대표작으로, 실존 인물인 16세기 최고의 해부학자 마테오 콜롬보의 독특하면서도 위험한 ‘발견’을 그린 소설이다. 여성의 사랑과 쾌락을 지배하는 작은 신체기관인 클리토리스를 발견하게 된 과정과, 악마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견을 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 회부된 해부학자의 이야기가 긴박감 있게 펼쳐진다.
30여 개 언어로 번역된 세계적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구미가 당긴다. 남미 작가들을 강의차 읽는 김에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책은 연필이 아니라 메스를 들고 읽어야 할까?..
14.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