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고전'으로 에른스트 윙거의 <강철 폭풍 속에서>(뿌리와이파리, 2014)를 고른다. <대리석 절벽 위에서>(문학과지성사, 2013)가 작년말에 나왔을 때 적은 페이퍼에서 <강철 폭풍>(1920)을 먼저 읽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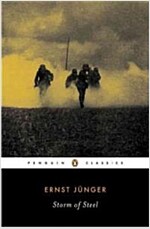

책에 대해선 아직 소개글이 올라와 있지 않다. 대신 앙드레 지드의 평에 따르면, "“이 책은 의문의 여지 없이 전쟁에 관한 최고의 책이다. 정직하고 참되고 믿음직하다.” 논란이 된 작가의 이력과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이전에 설명을 다시 참고할 수밖에 없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중산층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7세에 김나지움 학생의 신분으로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했다가 아버지의 반대로 6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곧이어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종군하여 철십자 훈장과 푸르르메리트 훈장을 받았다. 독일의 패전 뒤에도 군에 머물며 전쟁의 경험을 담은 <강철 폭풍><내적 체험으로서의 전투>를 발표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제대한 뒤에는 하노버 대학 · 라이프치히 대학 · 나폴리 대학에서 동물학과 철학을 수학했다. 그는 일생 동안 곤충에 심취했고 약 3만 마리의 곤충을 수집했는데, 곤충 가운데 여러 종에 그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다.

윙거는 언제나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그의 작품은 전쟁을 미학적으로 정당화하기도 하고 나치즘에 접근하는 등 보수 혁명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나치당원이었던 적도 없고 나치 체제 인사나 반체제 인사를 가리지 않고 교류했다. 또한 그의 대표작 <대리석 절벽 위에서>는 나치의 정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중적인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윙거의 작품들은 전쟁 말기에는 나치에 의해, 종전 직후에는 영국 점령군에 의해 잠시 판매가 금지되었다.
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아 이렇다할 책이 나오지 않는다 싶었는데, <강철 폭풍 속에서>는 책 가뭄을 얼마간 해갈시켜줄 수 있을 듯싶다. 펭귄판의 영어본도 바로 주문해야겠다...
14. 08.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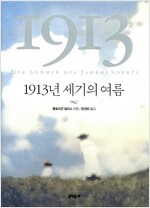


P.S. 한편, '폭풍'이란 말은 '1차 세계대전'에 대한 흔한 비유인 것 같기도 하다. 플로리안 일리스의 <1913년 세기의 여름>(문학동네, 2013)의 영어판 부제는 '폭풍 바로 전 해'이기 때문. 1차 대전 발발까지의 과정을 다룬 책으로 화제작은 크리스토퍼 클라크의 <몽유병자들>(2014)이다. 부제는 '유럽은 어떻게 1914년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나'이다. 번역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개됨직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