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이런저런 원고에 매달려 있는데, 저녁을 먹기 전 막간에 '이주의 고전'을 골라놓도록 한다(그러고 보니 '이달의 읽을 만한 책'도 아직 고를 여유가 없다. 주말의 일거리로 넘겨야겠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친숙한 괴테의 작품이 한번 더 번역돼 나왔다. <젊은 베르터의 고뇌>(시공사, 2014). 주인공의 이름을 '베르테르'가 아닌 (독어 발음에 더 가깝다는) '베르터'로 표기한 번역으로는 세번째이고, '슬픔'을 '고뇌'로 옮긴 걸로는 두번째다.



'베르테르'란 이름은 대중가요의 노랫말에도 들어가 있을 만큼 우리에겐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새삼스레 '베르터'로 정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표기 문제는 '대세'의 문제이기도 해서 주요 번역본들이 바뀐 제목을 채택한다면, 그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독자보다 <젊은 베르터>의 독자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의 인상도 자연스레 바뀌게 될 거라고 본다(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호손의 <주홍글씨>가 <주홍글자>로 바뀐 것이다). '슬픔'이냐 고통'이냐는 문제도 마찬가지. 을유문화사판과 창비판에서도 제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시공사판도 이런 설명을 곁들였다.
이 작품의 독일어 제목은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로,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진 제목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그러나 이 우리말 제목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어왔는데, 우선 ‘베르테르’는 ‘Werther’의 일본식 표기로 독일어 원음에 가까운 표현은 ‘베르터’이다. 연세대학교 독문과 김용민 교수의 새로운 번역으로 선보이는 시공사 판본에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굳은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자 익숙한 표현인 ‘베르테르’를 버리고 ‘베르터’를 선택했다. 또한 ‘슬픔’으로 번역된 독일어 ‘Leiden’은 ‘슬픔, 고통, 고뇌, 괴로움, 번민’을 뜻하는 ‘das Leid’의 복수형으로, 이는 베르터가 느끼는 사랑의 슬픔과 괴로움, 사회와의 갈등에서 오는 고통, 자아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번민, 죽음을 결심하기까지의 고뇌, 죽을 만큼 괴로운 상황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다. 여러 상황이 함축된 이 단어를 한정적인 의미의 ‘슬픔’으로 옮기기에는 작품 전반을 관통해 드러나는 베르터의 날카로운 비판 정신과 반항, 좌절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기에 역시 익숙한 제목인 ‘슬픔’ 대신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고뇌’를 택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전달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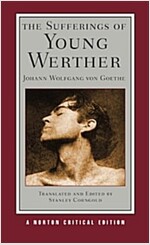
동일한 사정을 고려해서인지, 영어본도 두 종류가 있다. 곧 슬픔(sorrows)파와 고통(sufferings)파로 나뉜다(펭귄판과 옥스포드판은 슬픔파로, 노튼판은 고통파로 분류된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데, 내가 받은 인상으론 로테와의 실연이 베르터의 주된 고통으로 보는 경우 '슬픔'이라고 옮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보는 경우 '고뇌/고통'이라 옮기는 듯싶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다른 주요 세계문학전집판의 제목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데, 역자들이 다 독문학 전공자들이고 원전 번역이다. '베르테르'가 일본식 관행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데, '베르테르'라고 음역한다고 해서 독어를 모르고 옮기거나 일어를 중역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곧 시초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이건 '일본식 관행'이 아니라 '독문학계의 관행'이었다. 그렇게 굳어진 일본식 관행을 문제삼자면 나는 토마스 만의 <마의 산>도 <마법의 산>으로 개명하는 게 낫고, (영문학쪽으로 보자면) 밀턴의 <실낙원>도 <잃어버린 낙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렇게 주장해온 분들도 적지 않다).
독문학 쪽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보다 많이 번역된 작품으론 헤세의 <데미안> 정도이지 않을까 싶을 만큼 다수의 번역본이 나와 있는 상황인지라 새로 또 다른 번역본을 얹는 게 멋쩍을 수 있다. 제목을 달리 다는 건 그런 사정도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어느 경우이든 더 중요한 건 번역 자체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만 하더라도 영역본까지 포함해 10종 가까운 번역본을 갖고 있는지라 이들이 어떤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은 생각도 든다. 일반 독자가 보기엔 '난립'에 가까운 형세인지라 어떤 차이점들이 있고, 어떤 번역본을 추천할 만한지 전공자가 일러주면 더 좋겠고. 모두가 학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역자들인지라 허황된 번역본은 없을 듯싶지만, 그래도 각자의 개성은 다를 수 있을 터이기에. 주말엔 나 혼자라도 뒤적거려봐야겠다...
14.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