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만 나오는 뉴스들을 듣다가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졌다. 독서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서 책상 정리를 한바탕 하고 페이퍼를 적는다. '이주의 저자'를 고른다. 국외 저자로만 골랐는데, 에릭 오르세나를 제외하면 단골로 다루게 되는 저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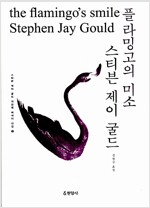

먼저 스티븐 제이 굴드. '자연학 에세이' 시리즈의 3권이 출간됐다. <힘내라 브론토사우루스>(현암사, 2014). "이 책에 실린 에세이들은 굴드의 끝없는 지식욕의 다채로움을 보여준다. 그는 홈그라운드인 과학과 과학사의 경계를 넘어 철학, 신학, 종교, 야구, 미술, 소설, 광고, 영화, 학생들의 은어, 심지어 자신의 병까지 온갖 이야깃거리를 동원해 지적 곡예를 벌인다. 그가 인용한 마크 트웨인의 “내 부고는 대단히 과장된 것이다”(689쪽)라는 농담처럼 굴드의 희대의 낙천적 지식은 독자에게 독서의 묘미와 기쁨을 전한다."



<여덟 마리 새끼 돼지>부터 <플라밍고의 미소>, <힘내라 브론토사우루스>까지 꽤 보기 좋은 '컬렉션'이다. 몇 권 더 남은 굴드의 책이 마저 소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산뜻한 지적 포만감을 제공한다. 하던 대로 이번에도 원서를 주문해야겠다(한국어판의 표지가 더 낫군).



그리고 두번째는 직함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헷갈리는 프랑스의 지성 에릭 오르세나. 소설과 논픽션을 오고 가는데, 이번에 나온 건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종이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를 심도 있게 추적한 일생일대의 역작'으로 소개되는 <종이가 만든 길>(작은씨앗, 2014)이다. 소개는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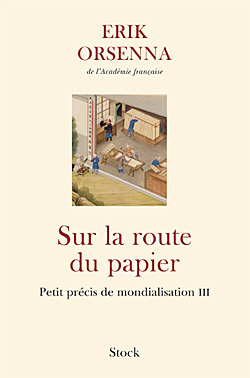
에릭 오르세나의 종이 이야기. 종이를 맨 처음 발명한 '사람들'에서 시작해 오랜 세월 동안 중국대륙 안에 머물러 있던 종이가 어떻게 아랍을 거쳐 유럽대륙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는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AD 8세기에 아랍에 전파된 종이가 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보다 무려 500여 년이나 뒤쳐진 AD 13세기나 되어서야 비로소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그 놀랄 만한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맥락을 놓치지 않고 명확히 짚고 넘어간다. 그 밖에도 인간의 영원한 적인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종이 속에 영원히 고정시키는 기술, 전자출판에 관한 고찰, 종이를 위한 위생이나 온도와 관련된 최신 기술과 같은 특별하고도 유용한 지식을 담아 전수한다. 또한 마르셀 프루스트와 루이 파스퇴르 등의 세계적인 문학가 및 과학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던 그들의 '원고'를 둘러싼 재미있는 이야기들, 괴도 루팡이나 셜록 홈스 시리즈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프랑스 '위조지폐 제조왕' 보자르스키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책이 아닌 종이의 역사를 더듬어간다고 할까. <물의 미래>나 <코튼로드>와 같은 계열의 책으로 읽을 수 있겠다(<코튼로드>는 절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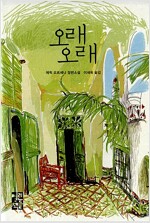


말이 나온 김에 오르세나의 소설들에 대해서도. 책들을 모아두기만 하고 아직 펼쳐보진 못했는데, 재작년에 나온 <오래오래>(열린책들, 2012)를 비롯해서 <문법은 아름다운 노래>(미디어2.0, 2006), <두 해 여름>(열린책들, 2004) 등이 소개돼 있다. <두 해 여름>은 번역과 번역가에 관한 소설로도 흥미를 끄는데, "한 번역가가 외딴 섬에서 나보코프가 만년에 쓴 소설 <에이다 또는 아더 Ada or Ardor>를 번역하면서 겪는 소소한 사건들을 그린 이 책은 작가가 젊은 시절 체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감정사회학자 에바 일루즈. 첫번째 책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이학사, 2014)에 연이어 최신간 <사랑은 왜 불안한가>(돌베개, 2014)도 번역돼 나왔다. '하드 코어 로맨스와 에로티시즘의 사회학'이 부제. 전작 "<사랑은 왜 아픈가>로 한 번쯤 사랑의 고통에 몸살을 앓아본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저자는 이번에는 '사랑의 심리학'을 넘어서는 '사랑의 사회학' 연구를 이어나간다. 이번에 일루즈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분야는 ‘하드코어 로맨스’, 그중에서도 사도마조히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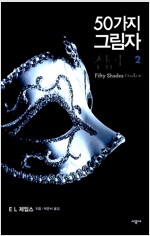


'하드코어 로맨스'라고 하면 뭔가 싶겠지만, 영국 등지에서 '주부를 위한 포르노'로 화제를 모았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시리즈를 가리킨다(박스세트로 전6권이군). 일루즈는 이렇게 말한다. "‘그레이 시리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오늘날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를 특징짓는 숱한 난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냈으며, 주인공들의 사도마조히즘적 관계가 이 난제의 상징적 해결책인 동시에 극복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것이, 내가 펼치는 주장의 골자다. 그러나 다시금 좀 더 정확히 물어보자. 소설이 그 시대의 신경줄을 건드리려면 과연 어떤 요구조건을 채워줘야 할까?" 책에 대한 서동진 교수의 추천사가 명쾌하다.
에바 일루즈가 다시 돌아왔다. 감정사회학의 달인답게 그녀는 E. L. 제임스의 메가 베스트셀러이자 19금 사도마조히즘 로맨스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솜씨 좋게 요리한다. 사도마조히즘적인 관계 그리고 진정한 사랑. 두 항은 절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자율성과 평등이라는 요구가 불러일으키는 현기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일루즈는 이 난관을 넘어설 해법으로 사도마조히즘적인 섹스가 자리잡는 과정을 추적한다. 후기 근대적인 세계에서의 사랑, 그것의 역설을 그녀보다 더 명쾌하게 풀이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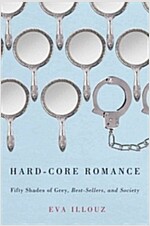


원서의 표지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점잖아 보이는데, 거울과 수갑이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시리즈의 독자나 감정사회학에 관심 있는 사회학도들은 필독해봐야겠다...
14. 04. 19.